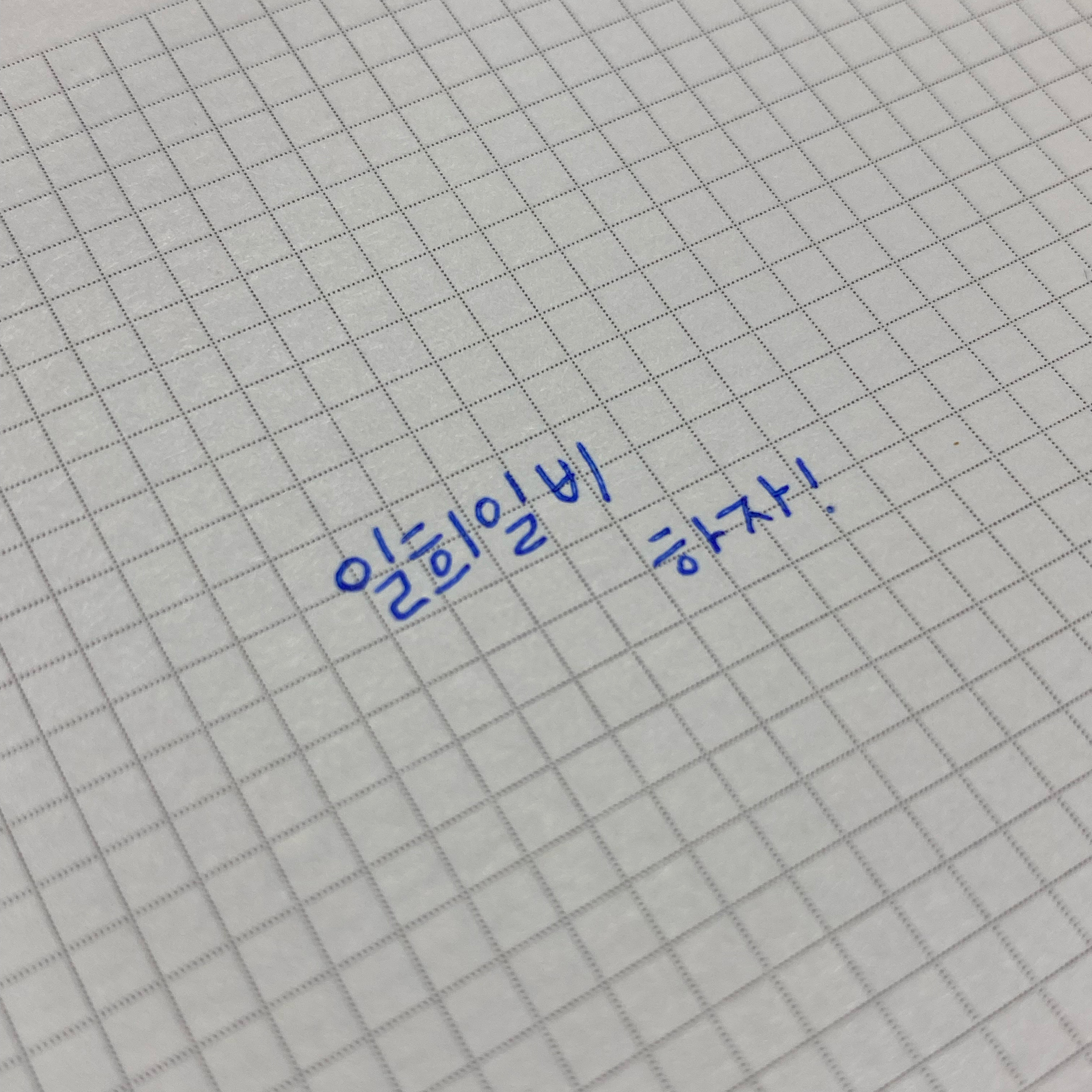
며칠 전 선배와 점심식사를 하다가 대학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늘 성실하고 단단하지만 어쩐지 꿈이란 단어와는 일찍이 이별한 듯 보였던 선배의 입에선, 예상 외로 대학시절 영화동아리 이야기가 나왔다. 그 시절의 선배의 꿈은 자신만의 영화를 만드는 것. 동아리 사람들과 돈을 모아서 나무 세트를 짓기도 하고, 수도꼭지가 달린 강의실 한 켠을 감옥으로 꾸며 '감옥에 갇힌 채 사랑을 찾은 동성애자'라는 클리셰 덩어리 단편영화를 찍기도 했었다는 선배의 눈에선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반짝임이 어렸다. 멀고 먼 시간 전에 반짝였던 것들이, 십수년이 지난 이제야 그의 삶이란 밤하늘에 별빛처럼 처음 피어오르는 듯이.
점심식사 내내 잊혔던 '꿈'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며, 선배는 마치 사탕을 문 아이처럼 마음껏 기뻐했다. 그리고 그 반짝이던 눈빛 덕분에 선배와 나 사이엔 직급이란 벽 대신 '한때 꿈을 꾸었던 실향민의 연대감' 같은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꿈이란 건 참 힘이 센 모양이다. 누구나 한 번쯤 품었던 그 뜨거운 무언가는,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 누군가 그 흔적을 가만히 쓰다듬을 때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릿해지는 건지도.
빛나던 별의 시간을 추억하는 점심의 밤이 끝나고 현실에 불시착해야 할 즈음, 함께한 다른 선배가 이런 말을 꺼냈다. 지금이라도 혼자 시나리오를 써 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나 이제는 그 꿈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멋쩍게 웃는 선배의 얼굴엔, 더는 무언가를 갈망할 수 없는 자의 쌉쌀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꿈이 들어찼던 자리에 이제 널찌기 자리한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현실의 삶은, 결국 밤하늘처럼 언젠가 꿈이 빛났던 순간의 예쁜 배경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긴 하루가 끝나고 퇴근하는 길,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를 지나며 나는 선배처럼 반짝이던 나의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언젠가는 라디오PD가 되고 싶기도 했고,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유학길에 오르고 싶기도 했다. 선배처럼 반짝거릴 추억은 못되더라도, 희미한 가로등 빛 정도는 되었던 내 지난 날의 꿈들. 나는 애써 그 꿈들을 삼키며, 또한 내 꿈의 배경이 되어준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남들처럼 돈이나 집, 결혼 같은 꿈이라도 꾼다면 서른 중반의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조금 더 빛났던 때로 기억될까? 어쩐지 영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일 수 없어서, 어쩌면 나는 그렇게 은은한 가로등빛 꿈들을 영영 지닌 채 살아가야 할 운명인가보다, 홀로 결론을 내릴 즈음 집에 도착했다.
생각해보니 지금의 나는 별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찬란한 직업도, 돈과 명예 그 무엇과도 밤길을 거닐며 웃고 떠드는 일상산책자로서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 어쩌면 처음부턴 나는 선배처럼 뜨겁게 절실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선배의 빛나던 꿈 앞에서 함께 느꼈던 그 동질감은, 그저 그 뜨거움이 식어왔을 우리의 시차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원대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품었던 작은 꿈빛들이 미래의 내 삶을 비춰준다는 것. 그래서 실로 오랜만에, 작은 꿈이라도 가슴에 심어보아야겠다는 (소녀스러운) 다짐을 해보게 됐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은 그 꿈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미 희미해진 빛 속 어둠의 삶에 최적화되어 꿈보단 배경 속의 하루들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빈 종이를 앞에 두고 거창한 꿈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텅 빈 대답 앞에서 나는 잠시 길을 잃는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잡고, 텅 빈 꿈 대신 조금 더 채워진 이 화면을 마주 앉아 매일 이렇게 누군가와 글로 만나는 삶을 꿈꿔보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때, 어쩌면 이 작은 글조각들이 북두칠성처럼 내게 삶의 방위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나는 오늘도, 주절주절 의미없어 보이는 이 글을 쓴다. 쓰고 기록하고 또 되새기다 보면 희미하게 알게 될 어둠 속 나만의 한줄기 빛을 기다리면서.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