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능이나 대학 진학이 아니었다. 축구였다. 당시의 내게 누가 물었다면 공부라고 둘러댔겠지만 그때 난 분명 축구에 미쳐있었다. 쉬는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틈만 나면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축구공을 한 번 뻥 차는 것 만으로도 흙먼지를 뒤집어쓸 가치가 있었다. 정말 정말 공부에 힘을 쏟아야할 고3 때도 시합이 있는 날이면 머릿 속에는 경기 생각 뿐이었다. 날 믿어준 어른들께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린 내가 축구에 그만큼 미치게 된 건 몸담았던 팀 때문이었다. 내가 다닌 학교에는 학년 당 2팀씩 총 6팀이 있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다들 우리 학교에 그렇게 6팀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팀 간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날 점심 시간의 운동장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경기를 위해 비워놨고 밥을 다 먹고 나온 학생들은 하나 둘 씩 스탠드에 앉아 경기를 관람했다.
우리 팀의 이름은 포르투갈이었다. 2만 원씩 모아 맞춘 유니폼이 포르투갈 국가대표의 유니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우리는 언더독이었다. 언더독이라고 하니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더 정확한 느낌으로 말해보자면 그냥 못하는 팀이었다. 그리고, 포르투갈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찌질한 애들이 모인 팀이었다.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애들, 멋있는 만큼 축구도 잘하는 친구들이 만든 팀은 따로 있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 팀에 끼지 못 한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모여 만든 팀이 포르투갈이었다.
우리는 은은하지만 분명한 무시를 마주했다. 십대의 세계에서 몰려다니며 유니폼을 맞추고 팀 이름을 정하고 연습을 하는 건 눈에 띄는 일이었다. 그런 일은 잘 나가는 애들에게 어울리는 거였다. 그렇지 못한 우리가 팀을 만드는 건 유난이었다. ‘니들도 팀 만들게?’라는 눈초리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포르투갈에 끼는 걸 망설였다. 나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지만.
십대에겐 버거웠을 눈초리를 결국엔 이겨내고 팀을 만들 만큼 포르투갈의 멤버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랄까 애정이랄까 할 만한 것이 있었다. 각자 그렸던 모습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무시를 극복하고 경기에서 이겨내는 순간을 꿈꾸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열정만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녔다. 모두의 예상을 전혀 뒤엎지 못하고 우린 계속 졌다. 같은 팀끼리 호흡이 안 맞아 우스꽝스럽게 패하기도 했다. 좀 예민한 편이었던 나는 사람들의 웃음 소리를 남들보다 잘 들었다. 우리는 기가 죽었고 상대는 기가 살았다. ‘약체'라는 이미지가 포르투갈 팀에 새삼스럽고 더욱 선명하게 씌였다. 나는 좀 패배감에 휩싸여서 우울했다. ‘고등학교 축구 가지고 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우리에겐 그게 세상의 전부였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우리는 축구를 계속했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질 때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주장이었던 친구는 연구해 온 전술을 모두에게 설명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역할을 쥐어주곤 했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 받은 친구는 이전보다 결의의 찬 눈빛을 보였다. 축구를 하고 싶지만 어딘가 부끄러워 못했던 친구, 잘 나가는 팀에서 받아주지 않은 친구가 포르투갈에 새로 합류하기도 했다. 주말에도 다른 학교 팀과 시합하며 우리는 기억을 쌓았다. 호흡이 맞는 찰나의 순간들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난다. 같은 학년의 ‘잘 나가는 팀’과의 경기였다. 상대 진영에서 얻은 우리의 스로인이었고, 스로인을 받은 내가 한 명을 제끼고 공을 힘껏 찼다. 골문 왼쪽 아래 구석으로 공이 빨려들어갔다… 스탠드에서 관람하던 친구들이 “오오!”하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환호했다. 포르투갈이 이겼다.
‘잘 나가는 팀'은 정말 잘했기 때문에 회자될만한 이변이었다. 들뜨고 기쁜 마음이 며칠을 갔다. 한 번 이기니 점점 이기는 빈도가 늘어났다. 우리보다 높은 학년의 팀과 만나 이기기도 하고 다른 학교 대표 팀을 이기기도 했다. 기세라고 할만한 것이 우리 팀에 생겼다. 그건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단단해진 팀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부도 뒷전으로 둘 정도로 날 축구에 미치게 만든 건 승리의 희열 뿐이 아녔다. 승리할 때까지 무시받고 좌절했던 순간들,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던 순간들, 서로를 북돋으며 화이팅을 외쳤던 순간들, 기적적인 선방의 순간과 득점의 순간들, 마침내 환호를 받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만든 서사였다.
서사의 형태로 들어온 기억은 깊게 박히는 것 같다. 아직도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걸 보면…
깊게 박힌 기억 때문인지 서른 중반의 나는 약팀에게 쉽게 마음을 뺏긴다. 낯선 팀 간의 경기를 봐도 고전하고 있는 팀을 응원하게 된다. 만년 꼴찌인 팀에 이상하게 정이 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진다.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응원과 갈채를 보내고 싶어진다.
돌아보면 고등학생 시절 그 당시에도 포르투갈을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멋도 없고 실력도 별로였던 우리를 왜 굳이 응원해줬는지 알 수 없었다.
나이가 드니 조금 알 것도 같다. 강자가 이기는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가 일을 내는 이변을, 드물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압도적인 승리감을 느끼는 것보다 패배를 애써 극복해내는 애절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늘 기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평등이나 공정을 바란다는 숭고한 뜻은 아니다. 그저 약자가 품고있는 이야기의 가능성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록 세상이 좀 더 재밌고 다채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여름 날 시합을 하러 운동장으로 나가던 순간을 기억한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해가 쨍했다. 햇살이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포르투갈 팀의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비춰 눈이 부셨다. 땀에 젖은 우리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고 맑았다.

정두부입니다. 레터 어떠셨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소감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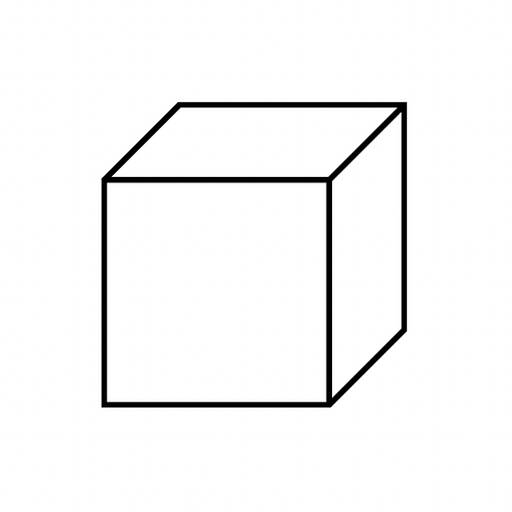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