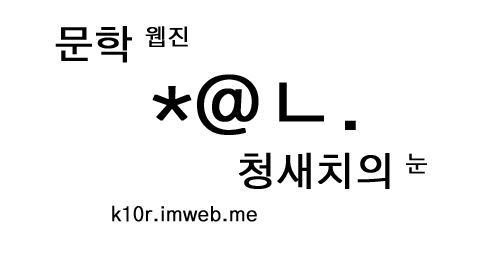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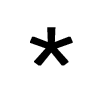
우여곡절이 많았던 <미완결 인연>의 작업이 거의 끝나간다.
거의 끝나간다, 막바지 작업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부터 해왔던 나다. 그때는 정말 몇 문단만 쓰면 소설이 금세 끝날 줄 알았지. 쓰다가 막히고 쓰다가 막히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6월 중순이다.
이 소설은 단편 SF다. 설정은 대강 이러하다.
주인공 신수연이 사는 원룸에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엔'이라 불리는 그 생명체는 수연에게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다. 이엔이 원하는 건 인간이 사랑을 할 때 뿜어져 나오는 (그러나 인간은 제대로 인식하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특정한 에너지. 이엔이 살아가는 행성에서는 그 에너지가 매우 필요한 상태였다. 지난 백 년 동안 지구에 몰래 머무르며 사전 작업에 들어갔던 외계 생명체들은 수연이 원룸에 자취를 시작한 바로 그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이엔은 수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가로 요구사항을 한 가지 들어주기로 한다. 수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둘의 거래는 성사된다.
이 소설을 처음 쓴 건 2023년 가을 즈음이었다. 결혼을 앞둔 7월, 나무 방에서 시작한 메일링 서비스에서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다. 평소 아이디어야 넘쳐나(ㄴ.. 다고 고 굳게 믿)는 나였다. 준비된 소설은 꽤 있었으니 그걸 그때그때 마무리해서 보내면 될 거라 믿었다. 간과했던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습작 생활을 해왔는지.
나도 어디서 들은 말이다. 번뜩인 아이디어를 엄청난 노력으로 갈고닦지 않으면 그냥 뽕 맞은 기분 한 번 느끼고 그만이라고.
나를 이때까지 포기 않도록 만든 게 바로 그 뭐 맞은 기분.
이때까지 지망생 신분으로 남겨둔 건 갈고닦는 실력과 요령의 부족.
그런 엉망인 밸런스 패치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마지막(이길 바라는) 허들을 못 넘은 채였다. 자신 있게 소설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날 공개한 소설의 뒷부분을 쓰느라 허덕였다.
꾸역꾸역 연재를 이어나가던 나는 결국 몇 주 되지 않아 항복한다.
그때 엉망으로 마무리를 지어놨던 소설 중 하나가 <미완결 인연>이다. 먼저 발표하고자 했던 <나디아>가 장기전에 돌입하리라는 걸 다시 한번 직감했을 때, <미완결 인연>이 문득 떠올랐다. 수연이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천, 생, 연, 분'이라고 적힌 키스방 (실은 결혼 정보 회사였다) 간판을 바라보는 장면이. 그 분홍색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엔의 질문에 '방금 뭐라고?'하며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장면이.
이번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바람은 늘 그랬듯 보기 좋게 빗나갔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며 몇 번의 위기를 맞이했다. 초반부에서 중반까지 신나게 달리다가 중간을 지나며 턱 막혔다. 며칠 전에는 정말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오로지 소설 때문에 괴로워서 바닥을 구르며 엉엉 울었다.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웠고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처럼 답답했다. 분량상으론 중후반부에 다다랐으니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당최 다음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고, 떠오른 아이디어는 왜인지 소설과 맞지 않게 이상하고, 미리 마련했던 결말과 어떻게 이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괴로웠다.
소설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언젠가 날 향했던 질문을 내가 허공에다 소리치고 있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거 왜 이런 거냐고.
그리하여 나는 결국 처음부터 읽고 또 읽고. 미리 써 둔 앞부분에서 답을 찾는 쪽을 택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설은 일종의 연금술이다. 뭔가 잘못된 재료가 하나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소설을 새까맣게 만든 게 누구인지 찾는 마음으로 후반부의 설정을 하나하나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갈피가 조금 보였다. 꼴에 소중한 문단이라고. 견고하게 잘 써 놓은 지우는 것부터가 고역이었다. 아무리 봐도 그럴듯하게 잘 쓴 문장 같은데,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러나 결국엔 찾아냈다. 어찌어찌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거창할 것 같던 소설이 아니라 기본만 겨우 해낸 소설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백 보의 시작과 같은 반 보라 생각하니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소설이다. 처음엔 슬프고 희망적인 사랑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었으나 그 방향을 버리고 좀 더 경쾌해졌다.
이번만큼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길.
내일 또다시 새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않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창작 노트를 한 편 보내고 난 뒤에는 메일링 서비스, <非문학 웹진 *@ㄴ.>의 7월 원고를 미리 좀 써두러 간다.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7월은 지금처럼 주 4일을 매달리기 어려울 것 같아 원고를 비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많이 써내는 요즘.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숨 쉴 때마다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떤 행복은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라는 소리 없는 집중으로부터 확인된다는 것을. 지금이 그렇다. 나는 요즘 소설 스트레스에 종일 인상을 쓰며 지내고, 겨우 기른 손톱이 다 잘려나가고, 출산을 앞두고 띵띵 부은 손의 불편에 자주 불평한다. 막달에 다다라 훅 불어난 체중과 거울 속 낯선 모습에 훌쩍이기도 하며, 늦은 밤 느닷없이 몸부림을 쳐대는 뱃속 아기 탓에 넉 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오늘 소설은 이쯤 마무리하고 비청눈 원고 쓰자> <비청눈 끝났으니 이제 소설 쓰자> <영상 편집은 언제 하지> 하고 고민하는 이 일상을... 나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아직 작품 입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휑한 웹진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함만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차마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을 꾹꾹 담아 쓰는 창작 노트다. 이 웹진 망하지 않았소, 나 여기서 허덕이며 소설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가는 중이오, 하는 생존 신고이기도 하다. 부디 소설이 더 늦어져 두 번째 창작 노트를 보내지 않길. 그 전에 <문학*@ㄴ.> 회원분들께 소설이 먼저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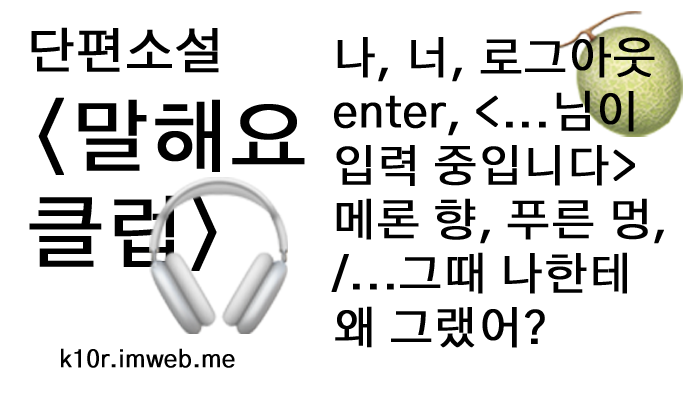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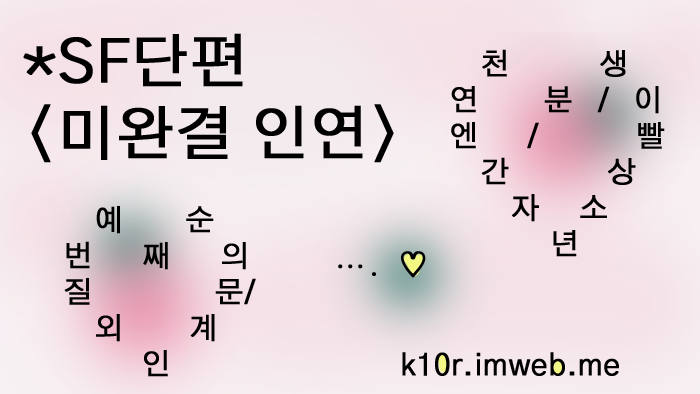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