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두번째 한 권, 첫번째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
두번째로 고른 책은,
미야노 마키코의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
책을 소개하기 전에 약간 성급한 마음으로,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깨달음이었는데, 책의 중간 쯤을 넘기다가 어느덧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독자가 작가에게 가지는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독자가 작가에게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그 내용이 내 마음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대로, 독자가 작가에게 신뢰를 가진다면, 그의 모든 문장들, 사소한 표현 하나까지도 평생 기억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독서 편력, 달리 말하면, 저의 독서 궤적이란, 제가 신뢰하고 싶은 어느 작가들을 따라 나서왔던 여정이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말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정도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표정 하나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단지 그를 신뢰한다는 이유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를 깨달아버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뢰가 전부인 셈입니다.
같은 문장도,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읽어낸 것과,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책의 중반부쯤을 지날 때 저는, 내가 이 작가를, 이 철학자를, 이 인류학자를 무척이나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토씨 하나까지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을 마음 깊이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한 철학자가 한 인류학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서간집'이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카뮈와 그르니에지만, 두 사람의 에세이집이 아닌 서간집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군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서간집이 있다면,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유일한'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철학자의 진심이라는 것, 도저히 저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온 마음을 담아 쓴 편지라는 것으로부터 다른 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자아내는 말들이 공허한 관념이나 철학 개념이 아니라, 당장 느끼고 있는 죽음 그 자체로부터 절실히 건져낸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신뢰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 죽음을 정확히 보고, 경험하고, 적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다시금 확신하는 어떤 삶,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주를 이룹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눈앞에 죽음이란 어둠의 늪이 있고, 그 늪 위에 작은 땅을 매일 만들면서 나아가는 게 삶이라는 걸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땅을 만들어가는 게 관계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
저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죽기 전이라면, 한번쯤 읽어보고 죽어야 할 책, 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또 편지 보내겠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공감하실 분이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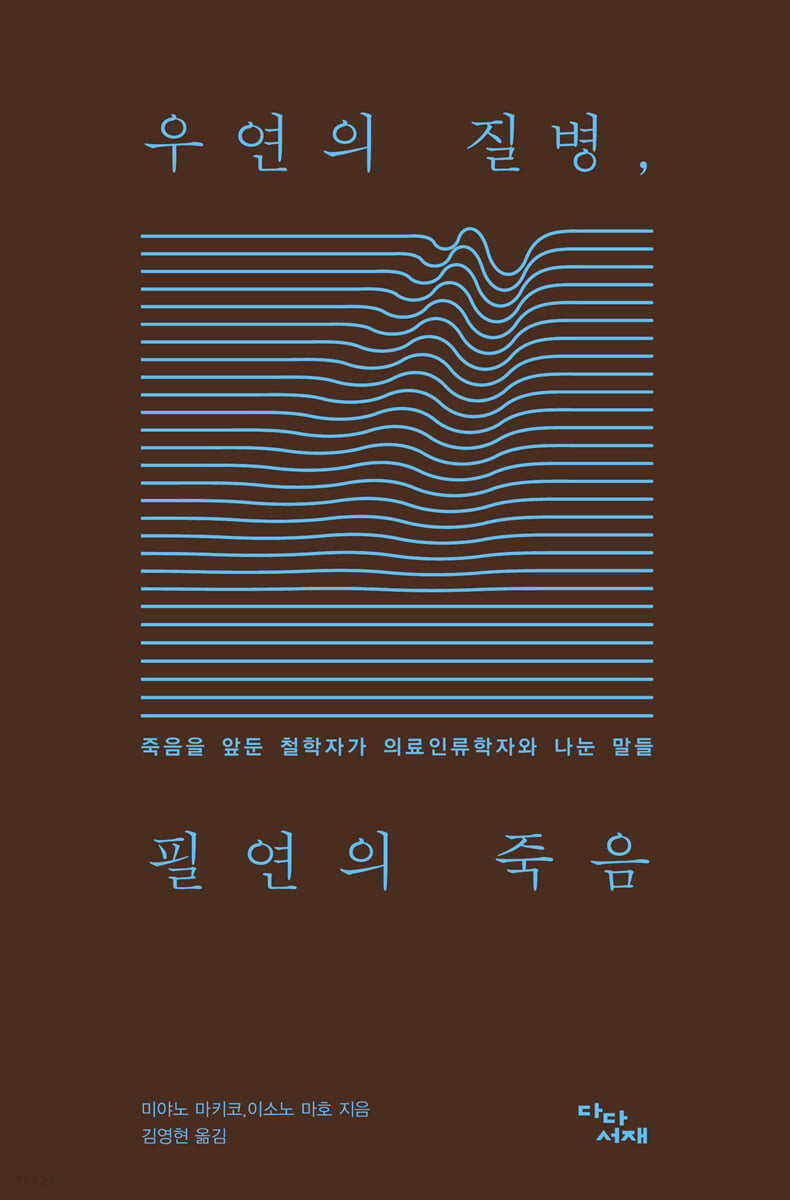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