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영감의 원천이다.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한 이래로 줄곧 그렇게 작용해 왔다.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는데, 내 무의식 저편에 어떤 바다가 있기에 이렇게 매일 밤 꿈으로 흘러 넘치는 것일까. 때로는 현실같고, 때로는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꿈의 근원은, 아마도 유년기 때부터 읽었던 수많은 소설들의 조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바닷가 근처에서 사는 나는 산책로 아무데나 멈추어 서서 물의 형태를 관찰하기를 즐긴다. 덩어리져 물결을 이루었다가도 해안가로 와 산산이 부서져 포말로 흩어지는 그것은, 부르는 이름은 하나지만 시시때때로 모양과 형태를 바꾸는 고로 단순히 ‘물’이라 부르기엔 아깝다.
나에게는 소설이 그러하다. 꿈의 조각을 붙잡고 기어이 써내려간 내 소설들은 주체에서 갈려나온 파생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미진한 소설일지라도 각기 ‘제목’이라는 것을 달고 있다. 분명히 물결이 만들어낸 다양한 모양을 따라갈 수 없는 미완성의 콜라주일 뿐인데도 매번 제목만은 심혈을 기울어 짓는다. 아까워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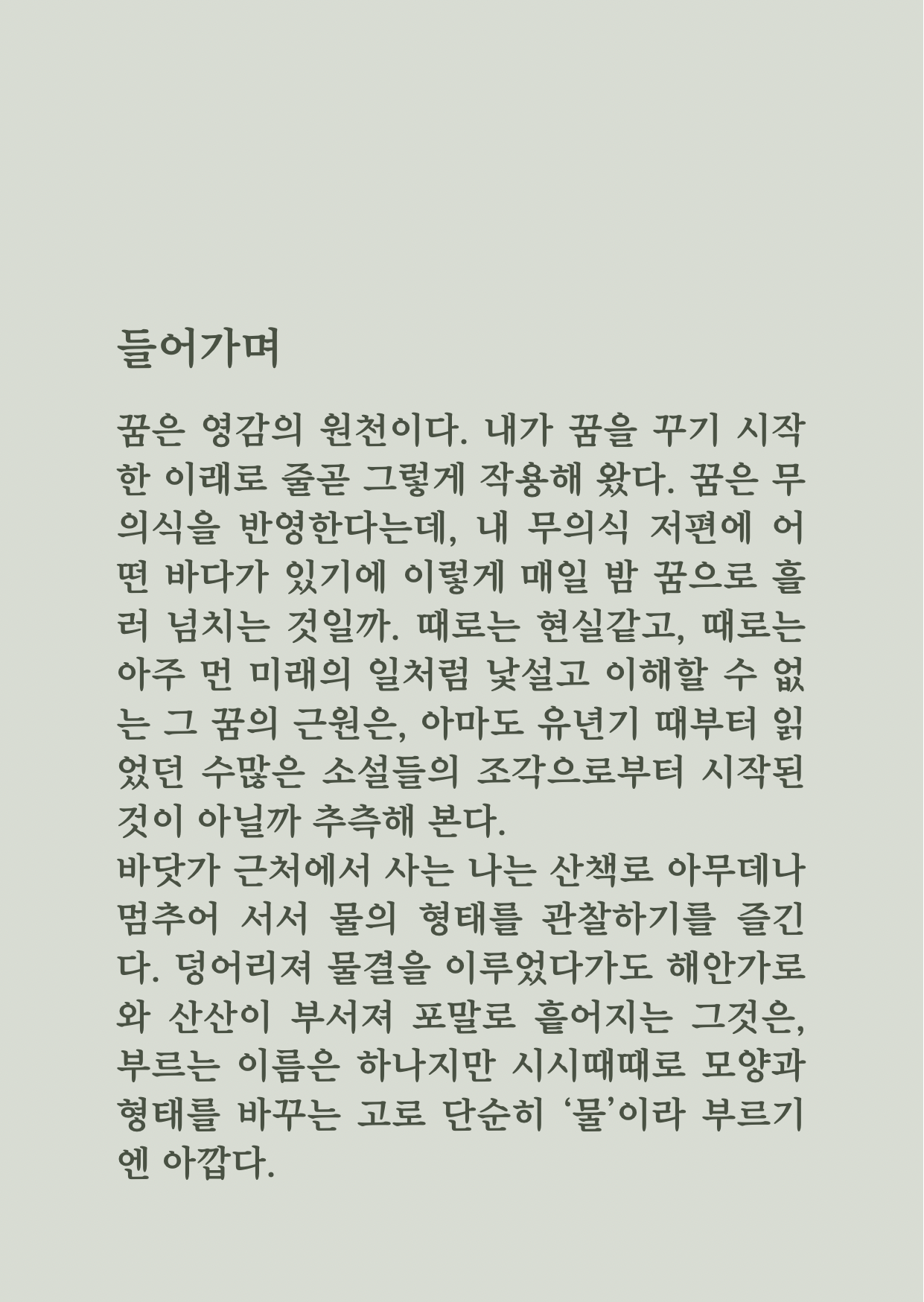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분자가 화려한 파도로 변주를 이루고, 내가 꿈에서 소설을 건져내는 것처럼 원류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달빛이다.
공교롭게도 내 단편소설집의 제목인 몽상과 발음이 비슷한 달빛(Mondschein, 독일어)은 빌딩벽에, 바닷물결 위에, 시골 작은 마을의 담벼락과 지붕에 흘러내려 하루도 같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
바다와 꿈과 달은 모두의 시작점에 함께하면서도, 늙거나 낡지 않고, 항상 생동감으로 넘쳐 흐른다. 월간 몽상 단편소설집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다르지 않다. 태곳적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맞추어 유연히 변화하는 모습에서, 아주 예전에 쓰여진 고전이 현대의 젊은 층에서도 사랑을 받는 모습이 겹쳐 보인다. 요컨대 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다.
<왼손잡이>, <해리>, <메리 고 라운드>, <모과>, <여름>, <우물>, <열대어>,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유령의 집>, <로봇의 증명> 등 총 열 편의 단편소설은 모두 꿈에서 떨어져나온 조각들이다. 장르는 미스테리, 스릴러, SF를 망라한 장르소설과 문장 그 자체로 예술이 되는 순문학까지 다양하다. 제목만 올렸다 함께하지 못한 <연못>, <붉은벽돌집>, <인간원> 또한 근시일내에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천 자 남짓한 머릿말을 쓰면서 보름을 고전했다. 지난 여름, 4개월만에 12만자 장편소설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한 자, 한 줄, 한 문단이 쓰여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한 까닭은 내가 월간 몽상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나야 글을 쓰면서 자아실현을 한다고 치더라도, 독자들이 내 소설에서 얻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부담감도 꽤 컸다. 그래도 이제 첫 삽을 떴으니, 멈출 수 없는 내리막을 향해 발을 구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끝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내 꿈과 사상을 녹여낸 작품을 대중에 공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기까지 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불안함 이전에 내면의 환상과 그로부터 뻗어나온 자취들을 겉으로 내보이고 싶은 마음도 공존하고 있다. 월간 몽상 단편소설집을 구상한 것은 2023년 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년을 묵혔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소설들인 만큼, 미지의 독자 여러분께 감히 어여삐 여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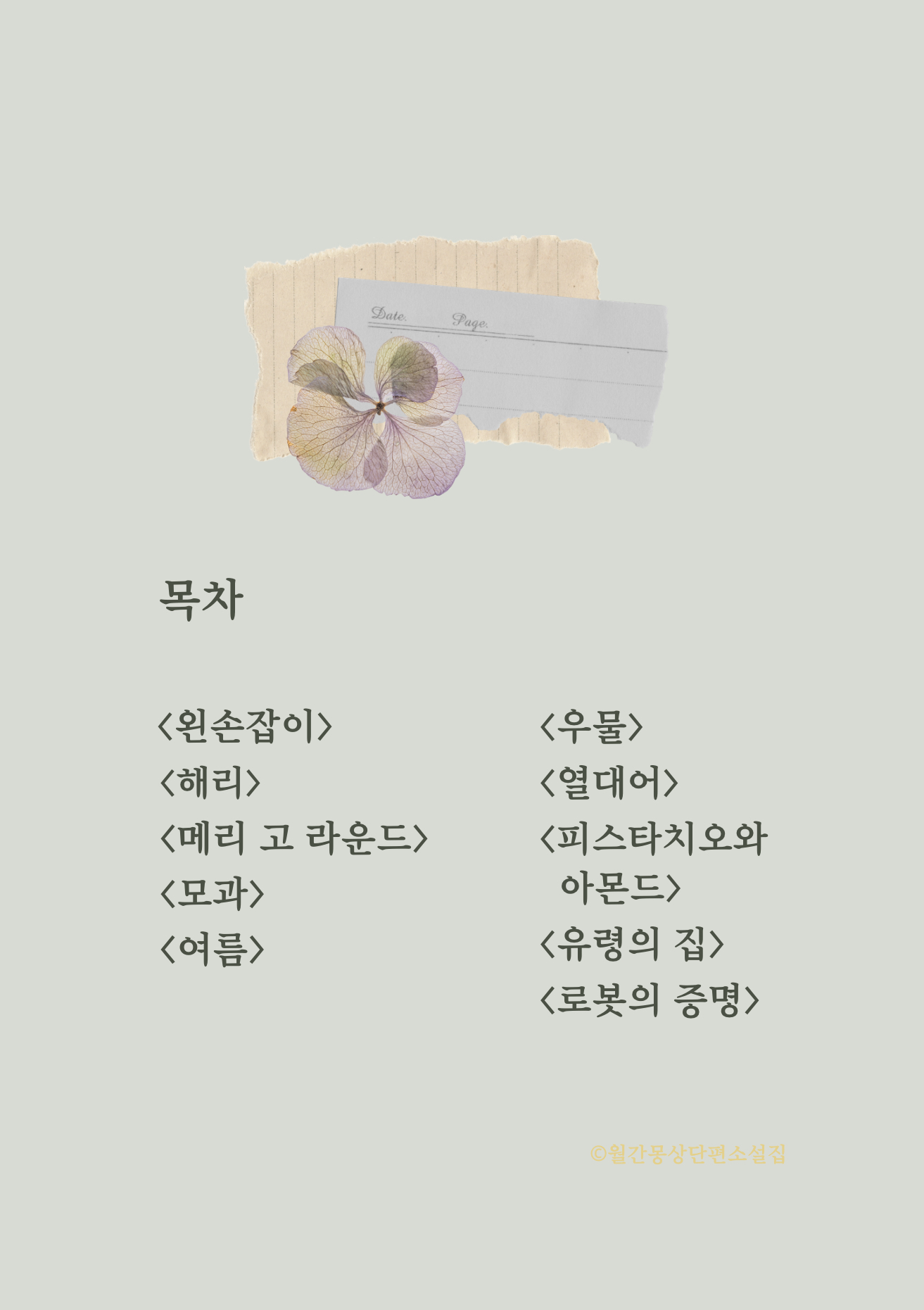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