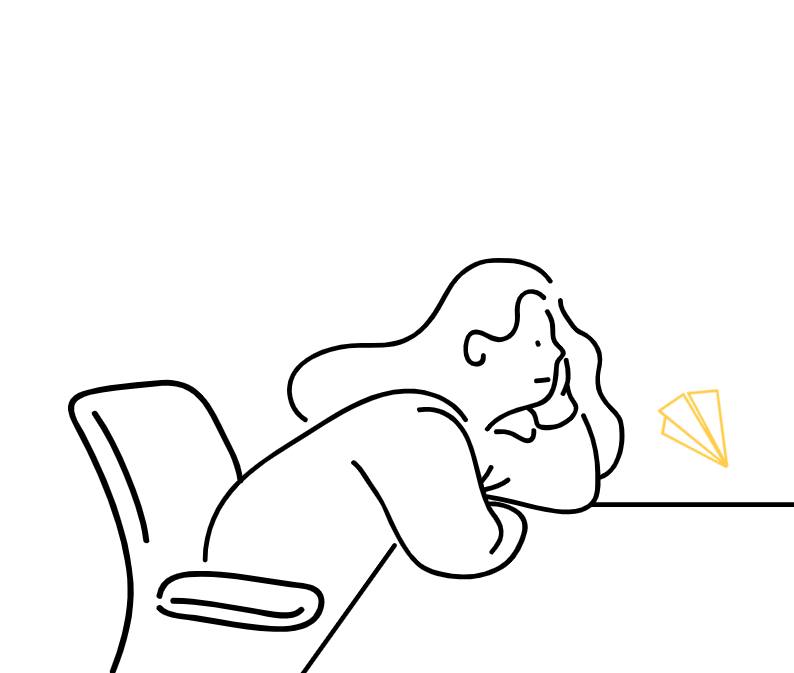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귀찮음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매일 한 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도 하찮아서 블로그에 공개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하찮지만 블로그에 공개하고 싶어집니다. 글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쓰고 싶은 욕망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쓰기 전에는 뭘 써야 할지 걱정되고 쓰고 나서는 글이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에 우울합니다. 하지만 쓰는 도중의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는 여정입니다. 마흔 살 즈음에는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되겠지요.
요즘의 나는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새로운 집단에 갈 때면 항상 긴장하곤 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잘 동화될 수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여고 시절에는 끔찍하게도 어려웠습니다만, 다행히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몇몇 친구들 덕분에 여자 무리에서 잘 지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 것. 만약 욕하고 싶다면 더이상 친하게 지내지 말 것. 그리고 앞에서 할 수 없는 욕은 뒤에서도 하지 말 것. 다시 생각해보면 아주 원시인같은 규율에 따라 나는 여고 생활을 했었네요.
대학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무리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연인 관계 때문에 친구를 잃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연인을 잃기도 했습니다.
무리의 사람들은 흩어졌다가 또 가까워졌고, 필요에 의한 관계가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모임에 속해 있으면서도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건부 연대 라는 말은 없을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우리가 연결되있음을 느끼는 일은, 타인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는 한동안 사람과 연대하는 일을 등한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과 연대하는 일을 뒤로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달릴 때 느껴지는 바람이 좋았습니다. 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가면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이 흩날리고, 발가락 근처에서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지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배낭을 메고 세계로 떠났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벽 이슬을 맡으며 마추픽추를 향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몇백 년 전 사람들의 숨소리와 내가 내는 숨소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계단을 오르다 힘이 드는 순간에는 욕지거리를 했겠지요.
또 저는 진실과 연대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애매모호 합니다. 요즘 진실은 논리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충분히 논리적이라면, 그 주장은 진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와 연대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안에 담겨진 논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 사람의 진의를 보기 위해선 눈치를 보는 것 보다도 논리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논리에 관심이 없어서, 앞뒤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제낀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과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서툴지만 논리에 꼭 들어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끔 멍청하거나, 다혈질이거나, 겉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훌륭한 사람이란 스스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구나, 소크라테스가 맞았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와 장점, 욕망과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길이 길이기 위해서는 주변과 경계선이 분명해야 하던가요.
저는 계속해서 내 안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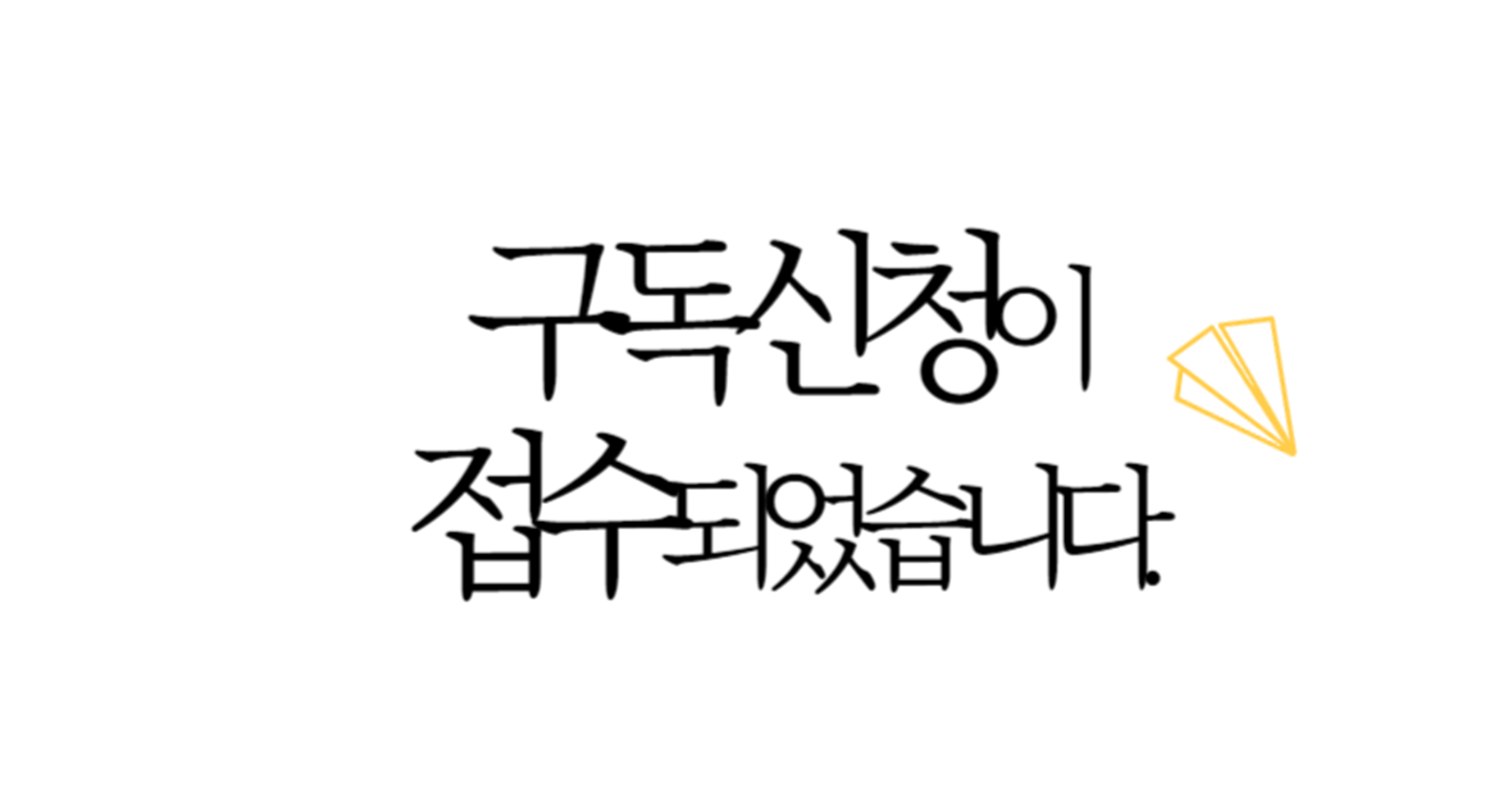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