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안녕하세요?
어제는 온종일 뭐라 운을 떼야 할 지, 많고 많은 말 중 네게 무슨 말부터 건네야할 지 고민하다 하루가 다 갔다.
나는 이제 한 문장도 온전히 쓰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제대로 쓰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근황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
얼마 전 조해진 작가의 겨울을 지나가다를 읽었고, 너무 좋아서 한 동안 멍하니 있었고, 최근 들어 김밥 싸 먹는 재미를 붙였어. 지금도 마침 계란과 김이 전부인 단촐하지만 단백한 김밥 한 줄을 싸 먹고 노트북 앞에 앉은 참이야.
아, 그리고 복숭아도 좋다.
나는 이렇게 심심한 사람이 됐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하고 되도록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기분이 없는 기분이랄까.
뇌 속이 온통 푸석푸석한 빵 한 덩이가 된 느낌.
그럭저럭 싫진 않지만 좋지도 않다.
고백하자면 나 이제껏 꾸덕한 과거의 기억에 파묻혀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고 덕지덕지 과거의 기억에 온 몸이 범벅 된 걸 방치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과거가 좋은 사람도 있지.
과거가 어려워도 좋은 사람이 있지.
과거로 인해 악몽 꾸는 사람도 있지.
악몽을 사랑하는 인간도 있지. 하며 자위 했다.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나 드디어 과거로부터 나를 도려내고 싶어졌다.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금에 대해 좀 더 구상적이기로 했어.
거창할 건 없고 무수히 많은 너와 그 앞에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 간 내가 어색하게 서 있는 장면이 떠오르면 나 고개를 흔들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예전처럼
개처럼
너의 기억을 붙잡고 옷자락을 질질 끌며 온 바닥을 휩쓸며 다니지 않고 사람 죽는 것처럼 울지 않고 기억의 바다에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괴성을 지른다.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 그 소리가, 끓어오름이 진짜 나 아닐까 싶어 부러 천천히 눈을 깜빡거리며 숨을 고른다.
너는 내가 불편한 눈치고 나는 내가 말이 많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감성적이고 예민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한다.
내 어리석음을. 나에 대한 나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
너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떠나려는 거다.
떠나는 데 100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나 있어.
늙는다는 건 한편으로 다행이야. 나는 이제 그저 그런 푸석푸석한 빵이 되어버려서 때론 결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마음 쓰이기도 해.
나는 앞으로 더 푸석푸석해질 거지만 참 지루하고 심심한 일이지만..
내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모든 건 언제가 돼도 지금 필요한 정답은 아니란 거야.
언제나 지금 꾸는 꿈은 아니겠지.
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기함을 토하던 그때가 그때의 정답인 것처럼 지금을 위한 정답은 지금 뿐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바라던 게 정답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나는 한동안 말이 없다.)
하여간 오늘이 내 진짜야. 지금이 내 진심이야.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너를 사랑했던 순간들,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나야.
너를 듣고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너를 상상할 수 있다. 너를 이해하고 오해할 순 없지만 너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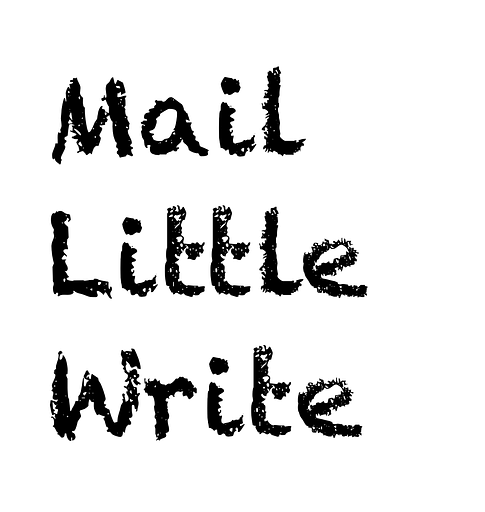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