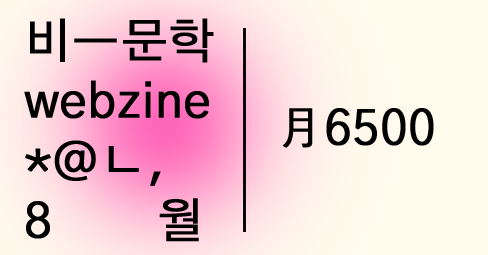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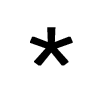
필명과 본명 그리고 질투
당연한 얘기일까? 마음에 쏙 드는 필명을 갖고 난 후에도 본명을 향한 애착은 여전했다. 마음에 드는 필명을 만났다고 내 이름이 시시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본명에도 필명 못지 않은 사연이 있는 만큼 애착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 특별한 사연은 아니고, 부모님이 내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사흘 밤낮을 샜다는 이야기 정도지만.
두 사람이 정말 사흘 밤낮을 샜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오래된 옥편에 그어진 수많은 밑줄로 보아 그 말이 사실에 가깝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다.
오래 이어져 온 이름에 대한 애착은 언젠가부터 엉뚱한 상상력으로 이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름이 같은 사람과는 은밀한 공통점을 공유할 거라고 믿어왔다. 이를테면 팔자가 비슷하다거나, 생김새가 비슷하다거나, 그 이름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거나.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실제로 생김새나 팔자가 닮은 동명이인을 본 적은 없었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낄 만한 기회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뜻밖의 장소(?)에서 비슷한 이름을 발견했다. 알라딘에서 구매한 전자 책의 한 페이지였다. 거기서 나는 우예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나와 성은 같고 이름은 자음 하나만 달랐다. 딱 보기에도 내 것처럼 읽히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필자가 오래전에 글쓰기를 가르쳤던 어린 제자였다. 그는 자신의 제자의 글을 읽고 편지 형식의 피드백을 남겼다.
내 이름에 관해 굳게 믿는 몇 가지 사실 때문이었을까. 편지에 깊게 밴 다정함 때문이었을까. 그 말이 꼭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 역시 그 선생을 만났더라면 한 번쯤 그런 말을 들어볼 것도 같았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예린아, 너의 글을 마구마구 좋아한다고 말해놓고도 부족해서 하마터면 사랑한다고 말할 뻔했어. 너는 가끔씩 축 처진 얼굴과 몸으로 무기력하게 글을 쓰고 무기력하게 낭독을 한 뒤 집에 돌아가지. 꼭 바람 빠진 풍선 같이 말야. 나는 그 헐렁한 뒷모습도 참 좋아하는데, 가끔씩 네가 연필에 힘 빡 주고 글을 쓸 때가 있어. 그 글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많아서야. 네가 달리기에 대해 쓴 글이 특히 좋아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 구르기에 대한 글도 마찬가지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울 때가 많은데 예린아,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 글쓰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질투심이 생각난다고 네가 적었잖아. 하지만 질투하느라 피곤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너는 매번 너만이 쓸 수 있는 고유한 글을 써서 내게 들고 오니까.
열두 살 우예린에게.
스물다섯 살 이슬아가 사랑을 담아. *
처음 읽었을 때는 이름 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 나랑 비슷한 이름이네. 예린. 예쁜 이름이지만 내 이름이 조금 더 낫군. 나와 비슷한 이름을 접할 때마다 늘 그랬듯 그렇게 생각했다.
두 번째 읽고 나서야 내용이 보였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여기 있는 나도 무기력하게 글을 쓰고 노트북을 덮곤 했다. 바람 빠진 키티 풍선처럼. 그러다 키보드 위에서 힘찬 춤을 추듯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쏟아내곤 했다. 달리기에 대해서도 구르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으며, 아무도 나를 자랑스럽다고 말해준 적 없지만 분명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살았다. 그리고 나 역시 글을 쓸 때 질투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질투심이 어찌나 두터운지 몇 년 동안 남의 글을 전혀 못 읽었을 정도였다.
어떻게 나와 이름 비슷한 그 아이가 이렇게나 나 같을까. 신기했다. 그러나 나는 이내 깨달았다. 그 글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 보려 해도 그 다정한 찬사를 빌려올 수는 없다는 걸. 지금까지는 타인의 몫인 말들을 잘도 훔쳐왔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걸. 나보다 한참 어렸을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이 흘러가는 걸 책 너머 다른 세계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는 걸.
글을 세 번쯤 읽으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스물다섯의 이슬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열두 살의 우예린이 부러워 미칠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이슬아 작가님께 디엠을 보내 여기 나도 있다고. 예린 못지 않은 혜린이 있다고. 나도 좀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나는 몇 번이고 그 글을 읽었다. 내 절친에게 갔어야 할 짝남의 고백 편지를 얼결에 먼저 열어보고 가슴 설레는 열두 살 소녀처럼. 꿈에서 깨워주지 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뉴진스 어텐션의 가사처럼. 처음으로 비슷한 이름의 누군가에게 진 순간이었다.
이 패배는 운 좋게 이 나이 먹도록 주인공 병을 못 고친 나에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전락하는 순간은, 정말이지 흔치 않았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이런 기회 앞에서 처절하게 불쌍해진 내가 그 후에 반드시 전복과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었다.
서른셋의 어느 날에 과거 열두 살이던 우예린을 부러워 함.
이 문장으로 내 이름 서사를 끝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긴.
이슬아 작가님에게 닿은 우예린 양의 글만큼 아니더라도, 그 빛나는 재능에 비벼볼 만한 글을 쓰는 수밖에는 없겠다. 달리기에 대해서라도. 앞구르기에 대해서라도. 질투심에 대해서라도. 쓰고 쓰고 고치고 또 고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슬아 작가님께 이런 다정한 피드백, 아니 편지를 받아볼 날도 오겠지. 그러면 그가 예린이 아닌 혜린을 먼저 기억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예쁘다고 생각해 주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데에서 나는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고 졸렬해진다.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 이슬아, 꾸준한 사랑, 문학동네, pp139-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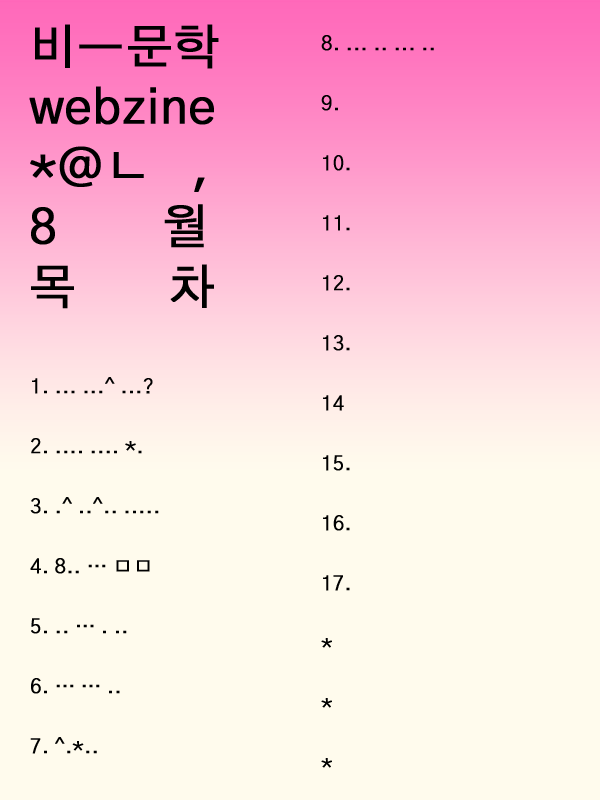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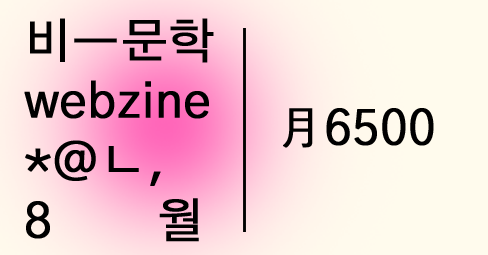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