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 - 2
"제주는 참 신기한 동네에요. 육지에선 마음속으로 묵음 처리 되던 말이 여기에선 술 술 뱉어지잖아요. 무슨 마법같이“

사장님과 한담을 나눌 때에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곤 했다.
며칠 전에는 바람이 너무 불어 결항이 되어
한 자리가 비게 된 게스트하우스에
당일 예약으로 떠나온 한 사람이 있었다.
사장님은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룸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그 남성 분은 갑작스럽게 떠나온 여행의 늦은 저녁을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소주 한 병으로 때울 참이었다.
사장님은 원래는 방이 가득 차있었으나 결항으로 인해서
자리가 생겨 다행이라고,
어떻게 여행을 오게 된거냐고 가볍게 물어보았고.
그 남성분은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의 세금문제가
골치를 썩여서 무작정 떠나온 여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줄곧 흘러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숙소가 제주공항에서 이렇게 먼지도 모르고,
이 동네가 어딘지도 모른 채 예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름도 모르는 이 동네를 오래 전 와봤다고 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연인과의 마지막 여행의 장소였다고.
6년을 사귀던 연인과 3박 4일이던 여행을 늘리고 늘려
이 주 동안 제주를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여행했는데,
그 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않아
그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여러 해를
병실 침대에서 같이 지냈다는 이야기.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사장님한테 하고 있는 자신이 웃기다고 했다.
사장님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털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죠.
원래 제가 여기 자주 있지않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오고싶었나봐요" 라며
그를 속으로 토닥여주었다.
그는 씩씩하게도 아마 그 기억들을 훌훌털어버리라고
이 곳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
그 날 나는 친동생이 제주를 놀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집에서도 딱히 말을 많이 하던 사이는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태도를 보여야할 지
항상 어렵다고 느낀다.
가족이란 너무 가까워서 모든 걸 다 알아서
너무 어려운 법이다.
티격 태격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며
젊은 꼰대같은 말을 늘어놓다가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사랑받지 못했어.
중간에 끼어서 아빠는 막내를 이뻐하기 바빴고,
엄마는 오빠라면 사죽을 못쓰고 챙겼으니말이야.
그래서 난 항상 질투심에 갇혀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동생이 내뱉은 문장 하나에
내 마음 속 어딘가에 있는
댐에 끼어져있던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동생은 긴 기간을 우울의 늪에 허덕였다.
그 시기의 내 책상 속
'책임'이라는 송곳에 찔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바로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에 그렇게도 많이 다퉜잖아. 별 것도 아닌일로. 근데 말이야
나도 항상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 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위해서 사랑을 구걸하고 다녔어. 나도 너와 같진 않아도 상처가 있어"
웃으며 나누지는 못할 시절의 이야기가 오가다
나는 갑작스럽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 때의 너가 고생한 걸 알아. 그 건에 대해선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해서"
동생도 이런 말들이
멋쩍었는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육지에선 서로가 하지도 않았을 이야기들을
훌 훌 털어내며 전 보다는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제주에서 사는게 좋은지, 바다는 매일 봐도 예쁜지,
행복한 건지.
다른 것은 무뎌지더라도 이것만은 무뎌지지가 않는다.
묵음처리가 되던 말들의 입구가 조금씩 열리는 제주의
신비한 힘은 무뎌지지않았다.
제주를 떠도는 여행자들은
뭐든지 빠르고 철저해야하는 삶의 무게에 눌려있던
있던 몸을 풀어주는 힘.
마음 속 열심히 바느질로 꿰메놓았던 실을 조심스럽게
뜯어주는 힘.
그 힘들로 인해 개운함을 느낀다.
'원래 잠을 못자는데 이 곳에선 너무 편히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졌어요.!"
"원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먹고는 좋아졌어요!"
"원래 내 취향은 흐릿하고 난잡한 줄 만 알았는데,
그것 마저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
사람들은 요상한 힘이 흐르는
이 섬에서 내려놓고 싶은 것을 무더기로 내려둔 채
다시 삶을 향해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을 걸어가며
그 강력하고도 넓디 넓은
제주를 하는 수 없이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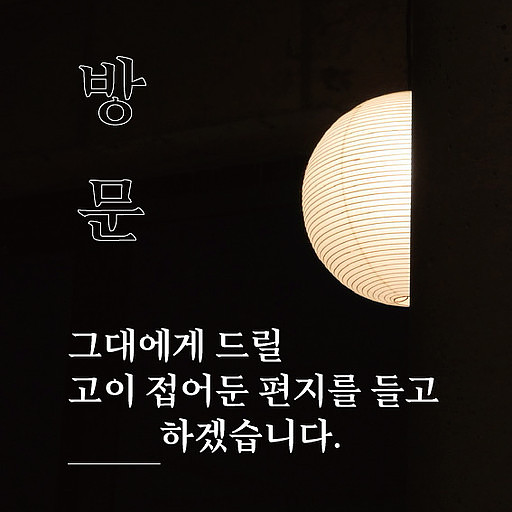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떠영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방문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