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를 들고 나무를 보며 길을 걷는 느낌을 참 좋아합니다. 변함없는 존재에 시선을 고정한 채 팔다리를 움직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낙엽을 이리저리 바삐 굴릴 때, 나무는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나무는 제 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곁을 내어 주기도 하고, 곁을 지나는 이들의 변화를 모른 체해 주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들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수북이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어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는, 나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 삶에도 꼭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제 마음을 글로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기댈 자리 하나 절실히 구하며 사방을 떠돌던 시절에도, 그 소망만은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가까스로 발견한 나무 몸통에 기대어 글을 쓸 때,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독자를 마주하는 일이 늘 처음과 같이 설렜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글로써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꿈입니다. 모든 이들이 글로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보듬는 세상. 그런 세상에 발 내딛기 위해 뉴스레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 삶에도 버젓한 나무 한 그루를 기르고자 합니다.
제가 문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오랜만에 소설을 좀 읽어보려고 여름에 읽다 만 소설을 집어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좋은 문장이 쏟아져 나와서 밑줄을 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치기 시작한 밑줄이 끝나질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경탄해 마지않으며 이럴 바엔 그냥 종이 한 장을 다 삼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삼킬 수 없다면 훔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에 ‘활자-소유욕’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활자 위에 콕, 몽당연필로 점 하나를 찍고 빙글, 연필 끝을 한 바퀴 크게 돌린 다음, 원 안에 들어오는 말들을 다 삼키고 싶다. 씹지도 않고 입 속에 굴리다가 한 번에 삼켜서 뱃속에 꾹꾹 놀러두고 싶다. 말만 먹어도 하루종일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종이를 통째로 집어삼킨 것처럼.'
좋은 글을 읽는 과정은 '땅에서 금을 캐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밤사이 비를 머금어 단단히 뭉쳐진 흙을 손갈퀴로 파헤치듯 힘겹게 문장을 읽어내려가다 일순간 금을 발견하면, 저는 그 글이 좋은 글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캐낸 금을 못 본 척 제자리에 묻어두고, 파헤쳤던 흙을 제자리에 다져서 땅을 평평히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고 다시 땅을 팔 수가 있고, 금을 캐내는 순간의 전율을 돌이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금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본래의 자리에 도로 묻어두는 일, 또 금이 나왔던 자리임을 알면서도 손톱에 흙이 다 끼도록 기꺼이 땅을 파는 일을 저는 사랑합니다.
묻어두었다가 언제든 다시 찾아와 캐내고 싶은 금 같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제 글이 독자 여러분께 젖은 땅에서 금을 캐는 재미를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아, 꼬박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에 고이 담아 두었던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직접 쓴 에세이와 소설, 혹은 제 마음을 건드린 작품에 대한 글을 연재하겠습니다. 그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한 편의 글로 찾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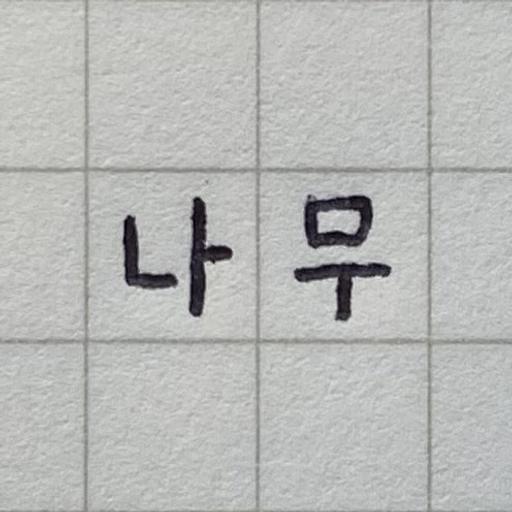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