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MINI, "More & More"
허회경, "Baby, 나를"
나의 사춘기에게, "볼빨간사춘기"
다섯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 YouTube Music App 환경에서 지원합니다 )
‘어떻게 쉴까?’가 아닌
‘얼마나 쉴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그때 핸드폰의 배터리가
20% 남았다는 알림이 왔다.
잘 쉬는 것도
동나버린 기운을 긁어모아야
가능한 거니까.
습관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맥주가 가득 채워진 냉장고 앞에 서서
하루 중 가장 나를 위한 고민을 한다.
오늘은 어떤 맥주가 좋을까?
평소에는 마시지만, 유난히 끌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부터 차례대로 소거해나간다.
문득 직원의 눈치가 보여 마음이 급해진다.

침대를 보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싶지만
그랬다간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매일 반복되는 밤이지만
매번 아깝도록 소중하다.
따뜻한 물로 씻고 나니
아까 샀던 맥주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배부른 느낌 없이
가볍게 마시고 싶은데.
맥주는 두고
조니워커 잔을 찾아
블랙 라벨을 따른다.
발에 닿을 때까지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신사가 위스키 위를 걷는 듯 보여서 좋다.

휴식의 출발선에 선 듯한 순간에
유튜브에서 재밌어 보이는 영상을 재생하고 한 모금 마신다.
쉼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영상은 보지 않는다.
멍하게 식탁의 빈자리 중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질 뿐이다.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지
반년이 지났다.
매일 아침 바다로 가 일출에 부서지는 윤슬을 보며
오늘의 나를 꿈꾸던 고향의 나.
그때의 내게는 미안한 일이다.
바라던 행복은 만났으나 만족하지는 못했다.
때때로 행복해할 일이었나 의심되기도 하고
남들보다 고작인 꿈에 목을 맸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다.
목표란 것은 점이 아니라 선 같아서
끝없이 이어지고 쉼 없이 달려야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데
모래를 밟고 윤슬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방법 같은 건 없으니까.
때로는 선 위에서 점이 되기도 한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편하도록 내게 다정하게 군다.
오늘이 그런 밤이지만 이번에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다.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않는 유튜브를 보고
재미를 채우려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겨우 잠드는 밤.
이대로 괜찮을까.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한 살을 더 먹어서도
이런 밤으로 괜찮을까.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공부하거나
더 할 기운은 없다.
생산적인 일은 상상만으로도 부담스럽다.
맥주같이.
위스키 같은 게 필요했다.
부담스럽지 않지만 진한 것.
신사의 발에 닿도록 따르는 규칙처럼 취향 같은 것.
공허하지 않은 밤으로 기억되도록
손에 무언가를 남기고 오늘과 헤어질 수 있는 것.
나의 두 번째 사춘기엔 그런 것이 필요했다.
우리들의 삶에서 사춘기는 어쩌면 한 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수없이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하며
나와 대화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라도 부여하고 싶다.
나의 이런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미래고 현재고 과거일 것이다.
건강한 걱정이고 고민이다.
나의 삶을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게 될 징조 같은 거니까.
혼자 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배가 고프면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해서 배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맛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뒷정리도 해주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손이 커서 음식을 만들면 혼자서 다 먹지 못한다.
그래서 종종 친구를 초대해 함께 먹는다.
함께 채워지는 행복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춘기를 겪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공책을 폈다.
식탁의 빈자리 어딘가를 바라보던 흐린 시점이 선명해지더니 눈에 담기는 일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
아닌가? 처음부터 아름다웠는데
이제야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일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선, 채도를 높이는 음악,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생각.
수요일 밤 9시였다.
조용한 방에서 속으로 소란스레 고민하던 끝에
그것에게 적당한 제목을 지어줄 수 있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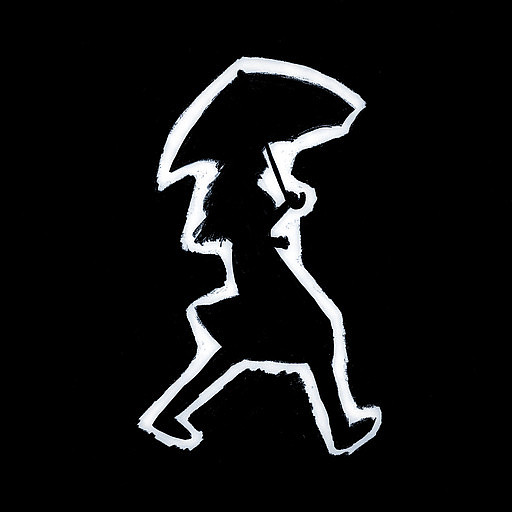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