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시간 전 동두천 역사 안에서 땀에 흠뻑 젖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화엄사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고 바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읽지도 않을 책을 가방에 틀어박았던 까닭에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기보다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언젠가 분노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를 안다는 문장을 적은 기억이 났습니다. 실망과 지칢의 감각만을 아는 저는 아직은 용서하는 법을 모릅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삶의 파편을 밟으며
어제는 막걸리를 몇 순배 마셨습니다. 술잔 앞에 앉으면 항상 한강을 지나며 김광석의 노래를 듣던 작년 겨울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 애가 많이 춥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므로 꽤 추운 날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힌 넘어가는 해가 산산이 조각났고 아주 끔찍한 일이,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안에 자신을 가둬야만 했던 친구는 틀림없이 모든 것이 낱낱이 괴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런 가사, 그리고 윤회를 믿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발 다시 태어나지 마, 그 정도였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저는 소년이었습니다. 제 울음이 타인의 생을 바꿀 수 있다 믿었습니다.
꽃이 수놓아진, 색이 바랜 금색의 커튼을 걷어 묶어 두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찾은 가장 싼 모텔의 창밖으로는 전신주와 한탄강의 지류인 신천이 보입니다. (전신주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주말 밤 할머니 댁 거실에서는 붉은 눈을 끔벅이는 거대한 전신주가 보였습니다. 여덟 살 무렵이었고 제가 겪은 모든 슬픔은 먼 훗날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숨소리는 한 번도 위협인 적 없었고 다만 밤의 귀신을 쫓는 소리였습니다.)
곧 강이 범람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은 넥타이 부대 사이에 서 우스운 생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즈음 서른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자꾸 듭니다, 스스로 생을 등진 사람들이 입이 썩어 말하지 못한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는 초연해진다든가, 무던해진다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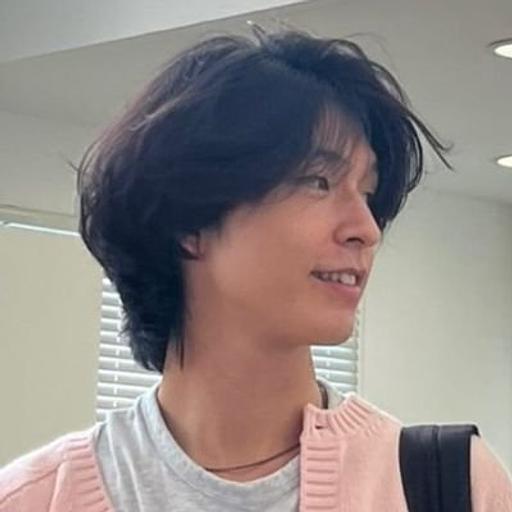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