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막 속에 꼬막 속은 없고/ 조그만 다슬기 하나/ 손톱만한 조가비 하나/ 꼬막 속이 아니었을 것들이/ 꼬막 속으로 들어와/ 꼬막 속을 차지하여/ 꼬막 속이 없어지는 것을/ 실종이라 해야 하나/ 주거침입이라 해야 하나/ 조그만 다슬기 하나/ 조그만 조가비 하나/ 어느 순간 입 벌린 꼬막 속으로/ 흘러들어 왔을 것이다/ 마치 꼬막이 낳은/ 새끼 꼬막이라도 되는 듯이/ 곁방살림을 차렸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떠돌던 삶을/ 곡진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야 하나/ 실은 제 속 채우려 낚아 챈 것일 수도 있을/ 다슬기도, 조가비도 그러나/ 속이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 속 없는 꼬막 속에 빈 것들이/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빈 것들이 내는 소리 듣고 싶다// 잡동사니로 가득차/ 아무런 곁이 없어지고 있는 나/ 뻘만 잔뜩 품고 있는 꼬막/ 가슴 속 도가니/ 불온함이 끓고 있다
조윤희, 「곡진이라 말해도 될까요?」
모처럼 시 생각하려고 밤에 레터 보냅니다. 앞서 놓은 시는 다시서점에서 추천받은 『내 안의 기척』(발견)이라는 조윤희 시인의 시집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도착한 시집을 퇴근 후 펼쳐보다가 바쁘게 굴러가고 있던 월요일에 "곁방살림"을 차릴 만큼 좋은 시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화자가 말하는 "빈 것들이 내는 소리" 저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문득 받아 적었는데요. 어디선가 "빈 것들이 일가를 이루고 있"을 때 화자처럼 "잡동사니로 가득차 아무런 곁이 없어"진다면 막막하지 않을까 싶어요. "뻘만 잔뜩 품고 있는 꼬막"처럼 말이죠.
곁을 둔 채로 살아간다면 그건 건재한 삶일 거예요. 적당히 비어 있는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기 좋은 것처럼. "빈 것들이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서글픈 듯하지만 맑게 울릴 것 같은 그 소리를 잠시 상상해보시면 어떨까요?
"곡진"하다는 건 정성스럽다는 것인데요. 구독자 님은 어떤 정성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그전에 속에 품은 "뻘"을 털어낼 수 있길 희망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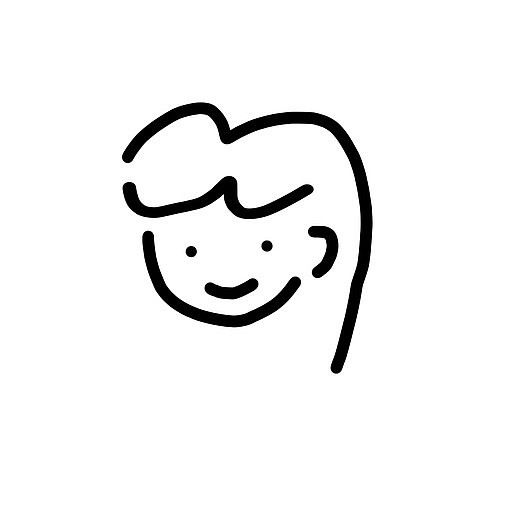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