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그 병 안에 우는 사람이 들어 있었는지 우는 얼굴을 안아주던 손이 붉은 저녁을 따른다 지난 여름을 촘촘히 짜내던 빛은 이제 여름의 무늬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올해 가을의 무늬가 정해질 때까지 빛은 오래 고민스러웠다 그때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너를 조금씩 잃어버렸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순간 너를 절망스러운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했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계는 뒤돌아섰다// 만지면 만질수록 부풀어 오르는 검푸른 짐승의 울음 같았던 여름의 무늬들이 풀어져서 저 술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무늬의 시간이 올 때면.// 너는 아주 돌아올 듯 망설이며 우는 자의 등을 방문한다 낡은 외투를 그의 등에 슬쩍 올려준다 그는 네가 다녀간 걸 눈치챘을까?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저렇게 툭툭, 털고 다시 가네// 오므린 손금처럼 어스름한 갸냘픈 길. 그 길이 부셔서 마침내 사월 때까지 보고 있어야겠다 이제 취한 물은 내 손금 안에서 속으로 울음을 오그린 자줏빛으로 흐르겠다 그것이 이 가을의 무늬겠다
허수경, 「이 가을의 무늬」
몇 년째 가을이면 읽고 또 읽는 시입니다. 올가을이 시작되면 서둘러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 미리 옮겨 두었어요. 허수경 시인의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집은 8년 전 9월 말에 출간됐는데요. 시인의 말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기차를 기다리다가/ 역에서 쓴 시들이 이 시집을 이루고 있다// 영원히 역에 서 있을 것 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기차는 왔고/ 나는 역을 떠났다// 다음 역을 향하여"
2016년 가을에 허수경 시인이 남긴 이 말처럼 여러분도 그런 나날을 보내다 어디론가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역은 어디인가요?
저는 이 시를 다시 읽고 무늬라는 말에 멈춰 서요. 제가 처음 학습한 무늬는 빗살무늬인데요. 빗살무늬토기 여러분도 한 번쯤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밑이 평평하지 않고 뾰족한 빗살무늬토기를 보면서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했는데 이 토기가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모래사장이 있는 강변에 살았다고 해요.
폭삭폭삭 발이 빠지는 곳에 살면서 무언가를 담는 그릇의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 빗살무늬를 내던 옛날 옛적 사람들의 가을은 어땠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에 들어간 울음, 빛, 등을 서로 잘 뭉쳐지진 않지만 스스럼없이 함께 허물어지는 모래처럼 두고 갑니다. 저는 가끔 그 모래알들이 사람들 같기도 해요.
낡은 외투, 넝마 같은 마음을 두르고 이번 가을도 쌀쌀함과 건조함 속에서 정처 없는 그리움과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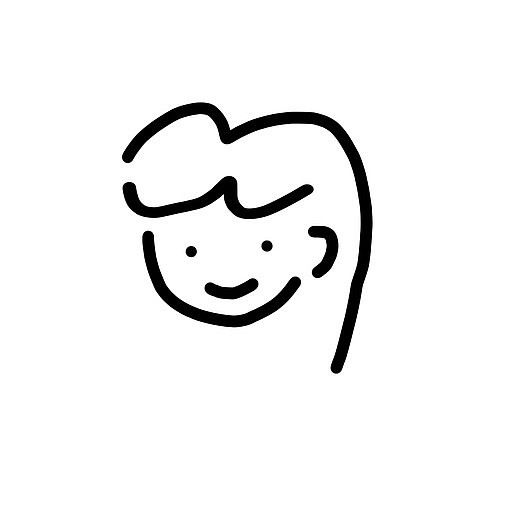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일기가성
올리신 허수경 시인의 시를 보고, 책장에서 그녀의 같은 시집을 찾았습니다. 한번은 읽었을 것 같은데 가을이면 읽으신다는 「이 가을의 무늬」는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가을’이란 말이 아직 생경합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 무더웠던 탓일까요. 마치 가을 없는 나라에서 살 듯, 허 시인의 가을 시를 읽었습니다. 살펴보니 시집에 가을 시편이 조금 보입니다. 거기 가을이란 단어가 나오는 시 한 편 옮겨봅니다. 호두/허수경 숲속에 떨어진 호두 한 알 주워서 반쪽으로 갈랐다 구글맵조차 상상 못한 길이 그 안에 있었다 아, 이 길은 이름도 마음도 없었다 다만 두 심방, 두 귀 반쪽으로 잘린 뇌의 신경선, 다만 그뿐이었다 지도에 있는 지명이 욕망의 표현이 가고 싶다거나 안고 싶다거나 울고 싶다거나, 하는 꿈의 욕망이 영혼을 욕망하는 속삭임이 안쓰러워 내가 그대 영혼 쪽으로 가는 기차를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것만은 울적하다오 욕망하면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익히는 가을은 이 세계에 존재한 적이 없었을 게요 그런데도 그 기차만 생각하면 설레다가 아득해져서 울적했다오 미안하오 호두 속에 난 길을 깨뭅니다. 오랫동안 입안에는 기름의 가을빛이 머뭅니다 내 혀는 가을의 살빛을 모두어 들이면서 말하네, 꼭 그대를 만나려고 호두 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었다고
만물박사 김민지
일기가성 님, 오랜만에 댓글이라 어제 보고 반가웠습니다. 무엇보다 또 한 편의 좋은 시 찾아서 이렇게 공유해주시니 더욱 감사했어요. 호두도 다시 보니 참 좋습니다. 마음 선연한 가을날 보내시고 무더웠던 여름 고생 많으셨어요. 늘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