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밤, 우리 층에서 제일 조용하지만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는 분이 불 끄고 문 단속하는 법을 알려주고 가셨다. 모두가 사옥을 떠난 뒤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다가 선명한 타자 소리가 들려서 오싹했다. 그러나 옅은 비명조차 지를 기운이 없어 그 상태로 조용히 빠져나와 집까지 도착했다.
연휴 시작, 머릿속에서 회사 생각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에서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가을 바람 부는 초저녁 새파란 후드티를 입고 나와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생각했다.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한 번 할일도 두세 번 하게 만드는 그 사람 자리에 푸른 난초 꽃을 두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다가 관뒀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등장하는 그 푸른 난초 꽃처럼 너도 나도 극중 원상아(엄지원 분)이 말하는 아버지 나무와 같은 커다란 권력과 자본에 매달려 사는 시간이라면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며 살 순 없을까.
그 사람과의 묘한 심리적 부침, 그 원인이 나한테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바로잡고 그저께 퇴근길에 팀장님께 면담을 신청했다.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 나아가야 할지, 그 사람과의 업무 노선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상태였기에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일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다.
아마도 나는 나만큼, 어쩌면 나 이상으로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빠르고 야무지기도 한 그 사람의 배려 아닌 배려가 텃세처럼 느껴져서 힘들었던 것 같다. 한 사람을 동료로 받아들인다는 건 나의 일처리 과정만큼 그 사람의 일처리 과정을 신뢰한다는 게 아닐까. 이제 막 들어온 나는 그 사람의 동료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일을 떠넘기는 사람만큼 일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을 겪는 일도 어렵다. 얼마나, 언제까지 더 함께 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닌 못미더움을 어디까지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당분간은 그저 나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배려 아닌 배려를 물리치려 한다.
직책, 직위, 직급과 상관없이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만 잘난 사람들이랑은 어떤 일을 해도 보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입사 한 달 차를 막 넘겼는데 너무 빨리 적응하려고 애쓴 것일 수도 있다. 나도 나에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후에는 누구보다도 합이 잘 맞는 동료로 거듭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조금의 여지를 두고 조금 더 일을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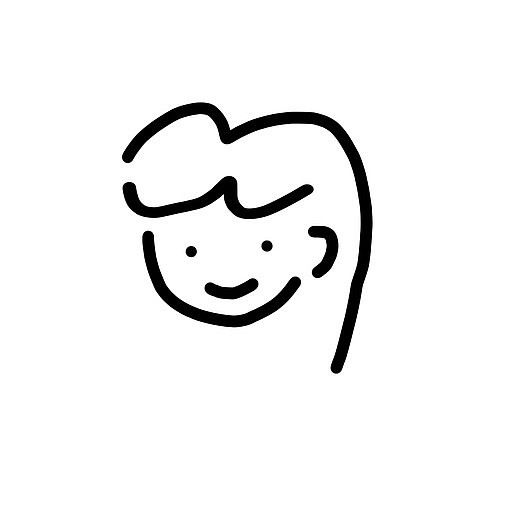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초록이아닌연두
시인님의 편지를 조금 늦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를 스쳐간 동료들을 떠올려봅니다. 시인님의 끝내 따뜻한 마음을 들여다보다, 저도 다음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어집니다.
만물박사 김민지
그 기다림 기대됩니다 (쾌청한 가을날 보내셔요) 👏🏻💞👏🏻💞👏🏻💞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