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록 네가 힘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환자 침대 아래 쏙 들어가는 길고 평평한 보호자 침대를 기억한다. 낮이면 병문안을 온 사람들의 의자가 됐다가 밤이면 숨소리나 끌차 소리 등이 고이는 저수지의 수상좌대가 되곤 했던 그 침대. 그 침대에 앉거나 눕던 날처럼 아직도 몇몇 날들은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
내게 안정은 종일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병원이나 편의점 냄새와 영영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미지근한 공기 속에서 여러 사람이 둥글려 키운 음식 냄새에 짓눌려 있다 보면 좀처럼 상쾌한 생각을 할 수 없다.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의사도, 대충 띄엄띄엄 넘겨짚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의사도 믿기 싫었던 순간처럼 그 무엇도 믿기 싫은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나는 그 지긋지긋한 병원생활로부터 "삶이 이렇구나" 하는 걸 배웠다. 말도 안 되는 병,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겪는 환자들 주변에 일어나는 대화와 침묵들. 병원에서는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생각해야 했고, 여기까지라는 체념도 해야했고, 돈이 문제지만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아야 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람, 너무 다양한 관계, 너무 다양한 변고가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봤다.
병원에도 못 오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너무 늦어 버린 경우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곳에선 어쨌든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했다. 장고의 병원생활 끝에 짐을 꾸려 그 자리를 나서던 사람들. 얇은 커튼 한 장을 벽처럼 치고 그 안에서 주고받던 엷은 목소리의 밀담들. 앞장의 말들을 투명하게 받아적은 노트의 뒷장처럼 손이나 눈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새로 써도 매일 반성할 일들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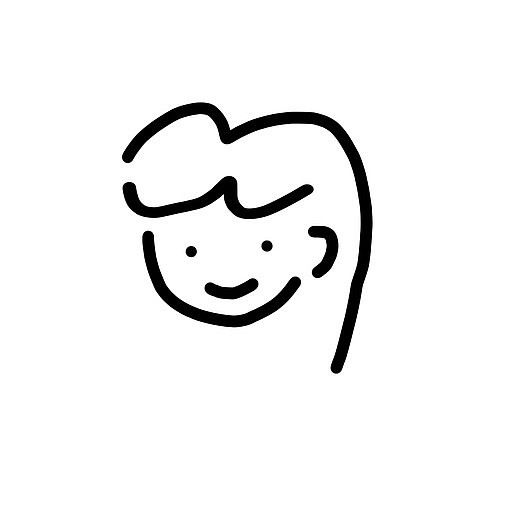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