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변에서 '교사 소진'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10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해왔는데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행복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교실을 지켰지만 앞으로 남은 30년은 잘 버틸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교사 생활 7년차가 되어보니 가르쳤던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년 만나는 아이들이 달라지지만 학급 운영의 노하우가 생겼고, 상담을 할 때에도 어느정도 학생들을 유형화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는 적어도 두 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를 모두 경험한 저도 그런데 동일한 학교 급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노하우들이 쌓였을까요.
노하우는 작업기억의 부담을 덜어주어 더 중요한 일에 뇌를 쓸 수 있게 하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매번 새롭게 느껴지던 일상을 반복되는 지루한 나날로 만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직업의 특성 상 소진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교사의 일은 타자 생산만 있고, 자기 생산은 없는 일인 것일까요?
<교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이라는 논문에서 서경혜 교수는 가르치는 일이 곧 연구이며, 교사의 연구는 학계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교육실천을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숀의 반성적 실천과도 이어집니다. 교사가 이런 연구 자세를 취할 때 교실은 곧 실험실이 됩니다. 반성적 실천이 일상화된 교사에게 가르치는 일은 타자 생산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자기 생산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터뷰 글의 주인공 양철웅 선생님은 에버노트에 개인의 삶과 교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공부가 되기도 하고, 질문이 되기도 하고, 계획이 되기도 하며, 실천 후의 성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들은 다시 앞으로 있을 계획과 실천의 토대가 됩니다. 양철웅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디지털 노트의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격인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도 매력적이지만 제가 더 눈여겨 보고 싶은 것은 양철웅 선생님의 '교사의 기록하는 일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기록하는 일상을 통해 가르치는 일이 곧 연구하는 일이 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이 학생의 삶뿐만 아니라 교사의 삶을 확장하는 일이 되게 하시길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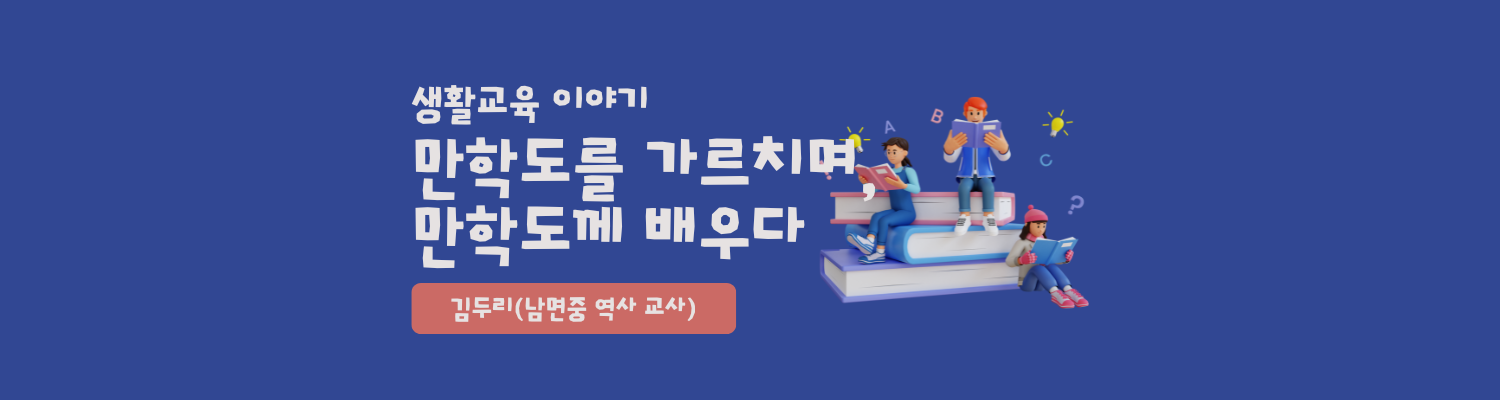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