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종종 생텍쥐페리의 작품 <야간 비행>의 서두 부분이 떠오르곤 한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여기에 그중 일부를 가져왔다.
비행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은가. 그것은 비행이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속성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수많은 생명들 중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진화된 생명체가 아니다. 우리는 날개가 멋진 검독수리도 아니고 바나나 색깔을 한 넓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넓적부리도요도 아니고, 노랑부리백로나 저어새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간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런 새들보다 더 멀리 또 빠르게 하늘을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비행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어떤 표지처럼 보인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비행은 아름답다. 영영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하는 존재가 땅에서 벗어나 아주 먼 곳까지 부유하는 행위. 아름다울 수밖에. 그러나 아마 이러한 비행의 속성 그 자체를 즐기려 비행기 타기를 자처하는 이는 조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비행은 여러 가지 불편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수속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챙길 짐은 많고, 비행기 내부는 시끄럽기 짝이 없고 몸에 맞지 않는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어야 하고, 좀처럼 먹고 싶지 않은 식사를 뱃속에 밀어넣고 원하지도 않는 잠을 강제로 청해야만 한다.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순간이동장치라도 발명된다면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은 금세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언젠가 포르투갈의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 포르투로 떠난 비행을 기억한다. 당시 난 마드리드 근교에 머물고 있었는데 잠시 짬을 내어 가까운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스페인은 조용하고 시끄럽고 재밌지만 어쩐지 지루한 곳이다. 나는 지루했고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다. 마드리드에서 이른 아침 출발한 비행기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포르투갈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포르투 근교에 접어든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 거대한 대서양을 오른편에 둔 채 포르투 공항(정식 명칭은 프란시스쿠 드 사 카르네이루 공항이다.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땄을 뿐인데 어쩐지 거창해 보인다.)을 향해 고도를 낮추며 남하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 비행기 오른편 창가에 앉아있었고, 창밖으론 오전 10시쯤의 햇빛이 비행기의 그림자를 검푸른 대서양 바다 위로 드리우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다른 비행보다 유독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착륙했던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수면 위 그림자는 착륙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져 갔다. 나는 조금은 따가운 포르투갈의 햇살 아래 앉아, 커다란 여객기의 그림자가 짙고 어두운 대서양 표면 위로 천천히 흔들리는 광경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비행은 이 땅 위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아야만 할 것 같았던 인간의 위대한 도약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이고 고독한 감각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기 보단 우리가 비행기에서 강제로 보는 영화 따위를 떠올리면 된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 애초에 볼 계획이 없던 영화들을 보게 된다. 그리스로 떠나는 아테네행 비행기에선 마동석 주연의 <챔피언>과 콘스턴트 우 주연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봤다. 물론 평소 전혀 볼 계획이 없던 영화들이었다. <챔피언>을 본 이유는 한국 영화였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본 이유는 한국어 자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따금 영어 자막만 존재하는 아랍 영화나 인도 영화를 보는 일도 있었다. 외항사 여객기를 이용하다보면 경로에 따라서 한국 영화나 한국어 자막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도무지 한국에서 개봉하거나 OTT로도 보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몇 영화들을 영어 자막을 켜고 본 적이 있는데 결국 별로 머릿속에 남질 않았다.
또 비행은 그 어떤 행위 혹은 이동행위 보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우리는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가기위해 기꺼이 일정 시간 하늘 위에 유폐되길 자처한다. 우리는 어딘가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비행기에 탄 순간 세상과 격리되어 시속 800km의 속도로 목표장소까지 쏘아져 나간다. 여러분은 여객기 좌석에 설치된 여객기 개인 스크린에 표시되는 현재 위치를 유심히 보시는 편이신지. 나는 이따금씩 비행기의 경로를 확인하며 현재 어느 나라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곤 한다. 여객기 기종에 따라 어떤 것들은 현재 날고 있는 비행기 외부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주는 경우도 있다.
비행시간 동안 나는 이곳에 있고 그 외의 모든 세계는 이곳에서 먼 바깥에 존재한다. 세계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게서 멀어지는 동시에 그와 같은 속도로 가까워진다. 나는 내가 떠나기로 결정한 세계와 격렬하게 이별하는 동시에 내가 발 딛기로 결정한 장소를 향해 맹렬히 나아간다. 그런 사실과 별개로 비행의 모습은 대개 여유로워 보이고 느긋하며 또한 평화롭다. 잠을 자고, 뜻하지 않은 영화를 보고,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 원치 않는 식사를 하고(대개의 식사는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침인지 분간이 어렵다.) 책을 읽거나 혹은 손가락만을 놀려 비행경로를 확인하곤 그 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행위. 오늘날엔 이런 행위를 비행이라고 부른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나의 바깥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런 비행기를 집으로 개조해서 사는 남자를 소개해볼까 한다. 그의 이름은 Bruce Campbell. 한 번쯤 어딘가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독자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엔지니어인 그는 1999년 퇴역한 보잉 727-284 여객기를 사들여 멋진 집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Cambell은 이 비행기를 Portland, Oregon 지역의 숲 속에 콘크리트 기둥으로 고정시킨 뒤 내부를 집처럼 개조했다. 좌석을 모두 뜯어내고 내부는 소파와 부엌, 세탁기 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개의 집기와 가구들을 집어넣었다. 또한 배관시스템도 추가하여 욕실과 화장실 또한 갖추었다. 일종의 엄청나게 커다란 원룸인 셈이다. 이렇게 퇴연한 보잉 727기가 Cambell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기까지 대략 2만 30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Campbell은 자신의 비행기 집을 지속적으로 수리하면서 살고 있다. 그는 퇴역해 고철덩어리가 될 운명인 비행기를 보존하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객기에서 사용되던 음료 카트 또한 개조해 식료품 선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객기 바닥 역시 그대로 보존하거나 용도에 따라 투명한 플레시글라스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도 매일 대략 10-20여명의 방문객이 집을 방문하고 한 달에 소수의 인원들이 그의 집에서 숙박을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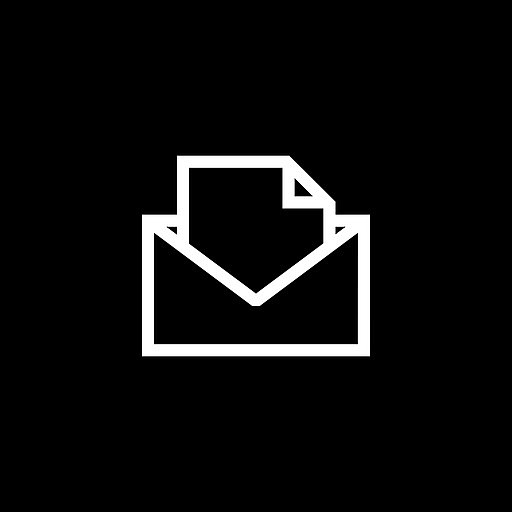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 가현의 시 같은 나날, 내 플레이리스트에선 동요가 흘러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210/taste4friday/1665123587109975.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