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에 앞서 시를 한 편 소개한다. 진은영 시인의 <청혼>이라는 시다.
이 시를 오래 들여다보던 시간이 길었다. 좀처럼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이 시를 읽은 날에는 마음의 어딘가 가려운 것처럼 존재도 알 수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멜로디가 마음속에서 둥둥 울리는 기분이다. 시와 노래가 사실은 한 몸이라는 말을 믿게 한다. 어두운 길 한가운데에서, 문득 이 시를 떠올리고 그 멜로디에 슬퍼하고 슬퍼하다 울음을 꾹 참고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상상을 하곤 한다. 이어서 다른 시를 한 편 더 소개한다.
류시화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다.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 이 시를 읽고 너무 좋아 시집이 닳도록 읽고, 류시화의 모든 것을 구해 읽었음에도 나는 결국 시인이라는 꿈을 꾸지는 않았다. 아마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시를 읽고 시인이 되길 꿈꾸는 사람이 있겠지만 난 그렇게 용기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전까지 혼자 곧잘 시를 썼던 나는 류시화의 시를 읽고 난 뒤로 시인이라는 꿈은 영영 꾸지 않았다. 그래도 이따금씩 시를 썼다. 시인이 아니더라도 시를 쓸 수는 있으니까. 노래라는 주제를 두고 왜 자꾸 시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 이에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보낸다. 결국 노래 이야기를 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스무 살 무렵엔 몇 개의 멜로디를 만들고 거기에 어설픈 가사를 붙이기도 했다. 시인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 난 두 분야에서 모두 어설펐기에, 써놓은 것을 보면 시나 가사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시와 노래가 사실 한 몸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혼자 있으면 종종 노래를 부른다. 샤워할 땐 음정이 아주 낮은 노래를 조용히 읊조리듯 부르곤 한다. 또 아주 가끔은 혼잣말을 한다. 과거엔 더 자주 했었지. 쓸쓸한 단어의 나열. 낮고 무해하고 무용하고 허무한 감탄사와 단어의 나열. 가끔 그렇게 의미 없이 내뱉은 단어들을 적어뒀다가 시나 가사 비슷한 걸 만들기도 했다.
혼자 밤길을 걸으며 노래를 불러본 일이 있으신지. 혹시 자주 하시는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중한 악수를 건넨다. 진심으로 기쁨과 반가움의 인사를 보낸다. 무척 반갑다. 당신을 ‘혼자 밤거리 걷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하고 싶다. 물론 나는 그런 단체는 모르며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앞으로 소속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밤길을 홀로 걸으면 노래를 부르곤 한다. 그럴 땐 역시 패닉의 달팽이를 부른다. 너무 올드 하다고, 구닥다리라고 투덜거려도 소용없다. 밤길을 걸을 땐 패닉의 달팽이가 정답이다. 물론 세상엔 이 노래말고 수많은 그럴듯한 오답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반박은 받지 않는다.

노래는 다른 많은 예술이 그렇듯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노래의 음과 음 사이, 노래하는 이의 숨과 숨 사이에 노래가사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있다. 오늘은 미국의 한 할아버지의 노래에 대한 뉴스를 가져왔다. Dave Totillo가 생일을 맞은 손자 Joseph을 위해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른다. 그의 무릎에 안기듯 앉은 Joseph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노래를 듣는다. Dave는 노래 부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것 뿐이다. 더 이상의 설명도 다른 미사여구도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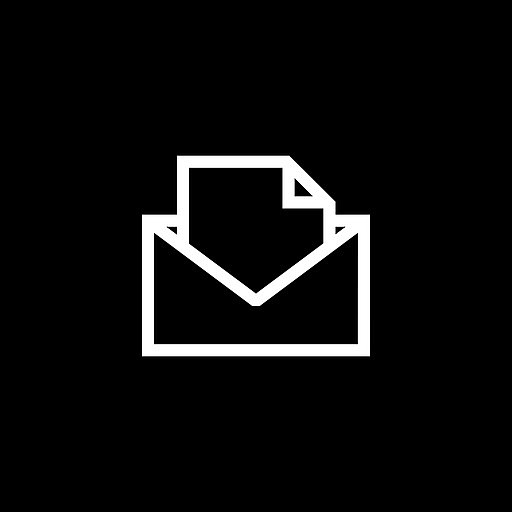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 매정한 취향수집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209/1662732682270043.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