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쓰는 편지다. 글인가? 일종의 푸념일지도.
어쨌거나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글을 시작해본다. 조금은 뻔뻔한 자세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조금은 진지한 우스개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 성탄절에 이런 글을 보내는 것에 대해, 우선 아주 깊은 사죄와 멋쩍은 미소를 보낸다. (뻔뻔하기도 하지)
어쨌든 인생은 흘러간다. 아무튼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간 생은 흘러간 것이고 갑작스럽지만 오늘은 성탄절이며 저녁식사론 피자를 먹었다. 생각해보면 조금 우습지 않은지. 달마다 시시껄렁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지껄이던 이가 미안하단 말도 없이 사라졌었다, 그러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딘가에서 웃고 떠들고 또 때때로 울기도 하면서도 유독 이곳에서만 침묵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든다.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언젠가 밥 한 끼 하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동창과의 공수표 같은 약속처럼, 사실 나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얼마간 이곳을 잊고 있었을지도. 언젠가 하천가에서 놀던 아이처럼, 한참을 강변을 뛰어 놀다 천변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그 아이처럼, 그곳에 작은 물병의 물을 조금씩 흘려버리며 흘러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이처럼. 나에 관한 아주 작고 사소한 사실들부터 어떤 기억들과 감상들과 그보다 더 사소하고 미약한 슬픔 같은 것들을, 이곳에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흘려보내다가, 문득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물병도 까맣게 잊고 달려가 사라져버린 아이처럼 훌쩍 떠나있던 것은 아닌지.
주제도 없이 주제도 모르고 정처 없이 이야기를 적는 것은 오랜만이라 조금은 생경하고 낯선 느낌이 든다. 사실 생각해보면 매회 어떤 주제(주로 해외토픽)를 정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 나에겐 할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쓴 책을 읽고 칼럼을 읽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수많은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겐 어떤 형태가 됐든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영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가?) 이따금씩 쓰던 소설을 연장하여 쓰는 일도 하지 않은지 오래다. 그저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을 뿐. 결국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글쓰기에서 나를 멀어지게 한 것 같다. 할 이야기가 없는 것. 텅 비어버린 내가 쓰는 텅 비어버린 이야기를 고치는 텅 비어버린 나. 모든 것이 문제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답도 없는 고질병. 그러나 어째? 오늘도 그저 살아갈 밖에. (이런 뻔뻔한 나. 제법 마음에 들어요)
조선 후기에 전기수라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저잣거리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당시 유행하던 소설 같은 것들을 낭독해주고 돈을 벌던 이들을 부르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북새통인 시장통에서 돈은 안내고 이야기만 홀랑 듣고 튀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들의 돈 버는 요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일명 요전법(邀錢法)이다. 단어의 뜻을 보면 맞을 요 또는 맞이할 요 자에 돈 전 자를 쓴다. 단순하게 말해서 돈이여 오시오 즉 일종의 돈 내놔 전법이다. 전기수는 정성을 들여 이야기를 클라이막스까지 진행시킨 뒤에 그 이상을 낭독하지 않고 얼른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냉큼 돈을 내라는 것. 당시엔 소설은 유행을 하는데 책값은 여간 비싼 것이 아니고 또 글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기에 이런 장사가 성업이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을 어귀에 나타나 낭독을 해주거나 시장과 양반집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돈 많은 양반집들에선 그들의 집으로 전기수를 초대해 낭독을 시키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양반집의 주요 고객층은 그 집의 여식들이나 마님들이었다. 그래서 드물지만 여성 전기수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으실 테지만,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오래 침묵하고 오래 떠들고 아주 오래 쓸모없고 아주 오랫동안 다시 침묵하고. 그렇게 살 작정이다. 이것을 위해선 아주 엄청난 뻔뻔함이 필요한데, 오늘날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것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되도록 아주 오래 아주 뻔뻔하게 살아남을 작정이다.
조금 덧붙여 말해보자면, 아무리 조선 시대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이야기나 낭독해주고 돈을 벌던 전기수가 얼마나 갔을까 싶으시겠지 만은, 사실 전기수는 그 격랑의 시대 속에서 의외로 꽤나 오래 버텨낸 직업 중의 하나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전기수는 조선 후기부터 무려 1960년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다.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가 집권하고 또 광복이 온 뒤에도 세상엔 TV는커녕 라디오도 흔치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글을 몰랐다.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78%에 육박했고 도서관도 흔치 않은 시절이었다. 책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너무 비쌌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야기에 목말라했다. 적은 푼돈이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기수는 그렇게 아주 오래 살아남았다. 우리도 언젠가 그들처럼 역사 속 몇 글자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먼 미래엔 어쩌면 “옛날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서 메일로 보내줬대. 그런데... 메일이 뭐야?” 같은 대화를 나눌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 아무튼 나는 이 ‘전기수 행위’를 가능하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끊임없이 할 작정이다. 물론 가끔은 말도 없이 또 오래 쉬게 될지도 모르지만, 또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나타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무튼 무작정 떠들 요량이다.
성탄절이다. 종교와 이제는 별로 친하지 않은 나지만, 누군가가 한 말처럼 매주 일요일과 매해 크리스마스 휴일을 보내게 해준 만큼의 감사하는 마음은 꼭 가져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럼 이만 메리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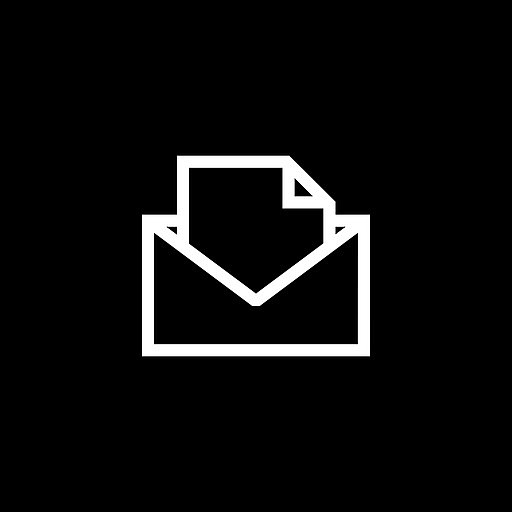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