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과 회고와 < 소리 >
-
🎧 FKJ - Ylang Ylang
촬영을 하러 숲에 왔다. 대기 시간을 틈타 원고를 쓰고 있다. 커튼 밖으로는 새가 지저귀고 있고 건너편 밥차 집 사장님네 강아지 두 마리는 패딩을 이불 삼아 새근새근 자고 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소리가 들린다. 도무지 어떤 사념도 틈입할 수없이 바쁘고 시끄러운 한주였는데, 꽤 경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저 멀리 분주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토독토독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곧 다시 나가봐야 한다.
지칠 땐 숲에 가고 싶다. 나를 쉬게 하는 건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소리. 이른 아침 참새 소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인간은 왜 항상불쾌한 것들을 뿜어낼까. 누군가의 소리가 휴식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소리에 예민해지는 나는 제일 먼저 타인의소리가 평소보다 극히 소음처럼 다가오곤 한다. 쩍쩍 거리며 깍두기 씹는 소리, 다리 떨면서 테이블이 떨리는 소리, 지하철 손잡이가 끼기긱 거리는 소리, 옆 사람이 시청하고 있는 영상의 소리, 튜닝한 자동차의 배기음, 찢어지는 공사장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의 통화 목소리… …
숲에는 걸을 때마다 나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 벌레의 발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동물 소리를 좋아한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놓여야만, 비로소 머리를 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같은 아티스트의 노래가 있다. 필리핀계 미국인 뮤지션 FKJ는 필리핀의 어느 섬 속에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정글로 이루어진 거점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약 6개월가량 사람과의 접촉 없이 그곳에머무르며 이 곡을 썼다고 한다. 언젠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이 노래는 잠들기 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재생되었는데, 마치 외부로부터 더러운 공기와 흙먼지들을 묻히고 들어온 나를 ‘정화’시켜주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소리를 자주 곁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다. ( 실제로 휴일 아침엔 국립산림과학원의 ‘홍릉숲 산책 소리’를 듣는다 이미 출퇴근 시간에 익숙해진 몸의루틴으로 어쩔 수 없이 7시 40분쯤 눈이 떠졌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스르르 다시 잠이 오고 대략 오전 11시 30분쯤 깨 간단히 끼니를때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주말 일과다. https://twitter.com/nifos_news/status/1533964976712323073?s=61&t=KXuaZ_FPnEcMKO4akXBuRg )
내가 죽을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진 않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장례식에서는 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아직까진 변함 없이 ‘메이트-늦은 아침’ (https://youtu.be/ApUV7PQ8b-8) 을 선곡할거다. 나머지 플레이리스트는 찾아와주는 친구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둘테니 내가 죽기 전까지 고심해 주었으면 한다.
인간의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은 청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들에게 마지막까지 꾸준히 사랑을 고해야 한다. 내가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을까. 나는 이불 뒤척이는 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정되는 마찰음. 빗소리도 좋다. 쏟아져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다. 동물들의 고로롱 거리는 소리도 좋겠다. 따끈하고 말랑한 강아지가 새근거리는 소리… 자연 속에서 생을 마무리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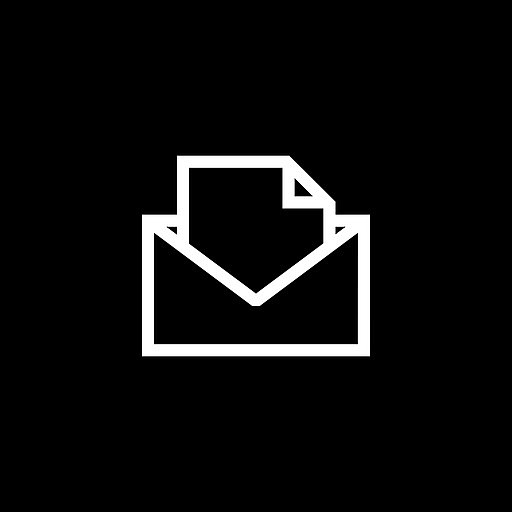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