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다. 분업을 하면 일의 효율이 올라가듯, 둘이서 대화를 하면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옛 기억을 떠올리기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은 모든 것이 스트리밍이 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음악을 들을 때조차 다운 받아서 들었다. 한 달에 30곡만 다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찍듯이 고심해서 다운 받을 노래를 정했다. 영화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려면 (불법이었지만) 다운 받아서 USB에 옮기는 수고스러운 작업을 해야 했다. 지금은 엄지 하나로 가능한 일들이 과거엔 온몸을 움직여야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래도 지나간 불편함에는 낭만이 있는 것 같다.
봉준호 감독이 활동했던 시네필(영화광) 동아리 '노란 문'에 관한 다큐를 본 적 있다.(이마저도 넷플릭스로 봤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문화를 즐기기 열악했던 90년대 초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영화 하나 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찾으러 다녔다. 그리고 그걸 다른 테이프에 복제하고, 예쁘고 정성스럽게 제목을 적었다. 한글로 된 영화 서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각자 파트를 나눠서 영문으로 된 책을 번역해 오기도 했다. 그 불편함을 불편한 줄도 모르고 행했다.
어쩌면 사랑은 '불편함을 얼마나 편히 감내할 수 있느냐'인 것 같기도 하다.
가끔은 불편함을 자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늘 글이 너무 갑자기 끝난 거 같은데요...
억지로 없는 생각을 짜내는 것보단 솔직한 미완성이 나을 것 같아 이대로 보냅니다!
아래는 인상 깊게 봤던 영상 중 이번 글과 내용이 비슷해서 첨부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23.12.22 신동딸이 스타벅스에서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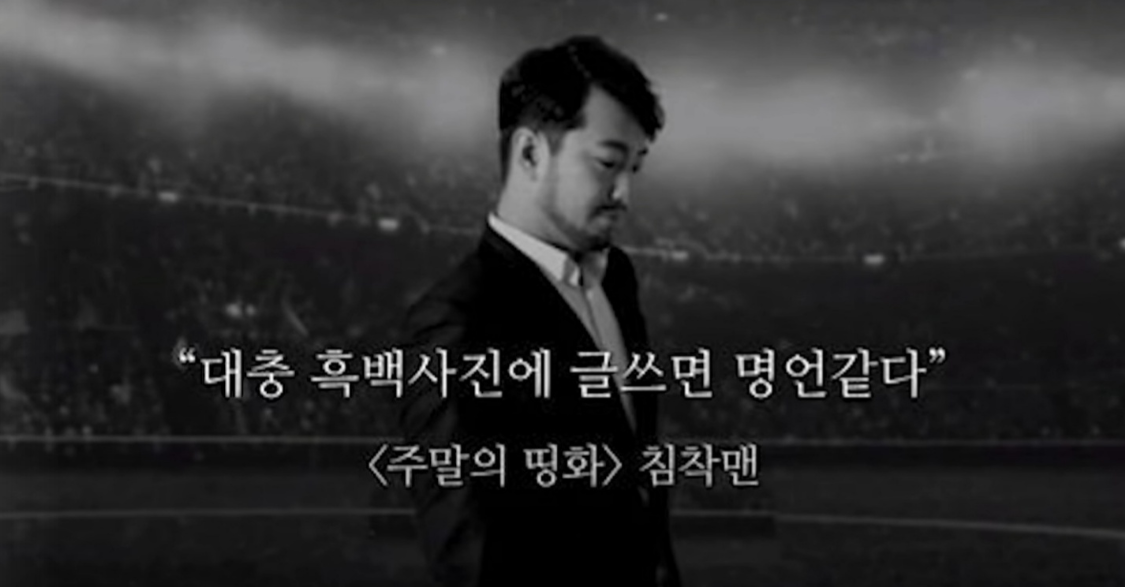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dwq159
고딩 때도 스트리밍 시개 아니렸어유?
nadake letters
지는 충북 촌놈이라서 다른가벼유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