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열두 번째 한 권, 소개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
열두 번째로 고른 책은,
알베르 카뮈의 <결혼>입니다.
*
어느덧 '세상의 모든 서재'에 열두 번째 책을 추천하게 되었네요.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에 왠지 모르게 약간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12라고 하면, 한 해의 끝이나 크리스마스가 생각나고, 저에게는 또 결혼 기념일도 있는 달이어서 꽤나 근사한(?) 기분을 주기도 합니다.
열두 번째 책을 추천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의 책 추천의 역사도 1주년을 맞이했다는 셈이 되고, 그 만큼 더 뜻깊은 책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아마도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카뮈의 에세이 <결혼>이 되었습니다.
*
엄밀히 말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세이가 단 한 권은 아닙니다.
사실, 장 그르니에의 <섬>이라든지,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든지,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라든지 무인도에 들고 가야 한다면 놓칠 수 없는 에세이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는 왠지 그때마다 다르게 대답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도, 문학도, 에세이도 매번 대답하고 싶은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시점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에세이로, 카뮈의 <결혼>을 골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일 년 중 열두 번째 달에 '결혼'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아내를 만난 것도 12월이었고, 아내랑 결혼한 것도 12개월 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
알베르 카뮈의 <결혼>과의 인연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7~8년쯤 전에 팟캐스트에서 이 책을 다루기도 했었죠. (지금도 방송분이 팟캐스트에 남아있긴 한데, 워낙 옛날 방송이라 약간 민망한 데가 있어서 공유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고전에 기대는 시간>이라는 책에서도 다루었고, 덕분에 꽤 여러 곳에서 <결혼>에 대한 강독회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와는 인연이 깊은 문학 작품인 셈이죠.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책은 '인간과 세계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청춘 시절, 저는 이런 개념에 무척 매혹되었습니다.
바다 냄새, 여름의 적란운, 가을 아침 공기의 촉감, 밀려드는 겨울의 고립 같은 것들을 어느 때보다 흠뻑 들이마시면서, 그야말로 세계와 결혼하는 삶을 살았죠.
비오는 여름의 새벽, 홀로 걷는 달밤의 캠퍼스, 봄이 내려앉은 한적한 서울성벽 같은 것을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딘가로 간다면, 바로 그런 '세계'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어째서인지 회색 도시에서 출퇴근하며 살기 바쁜 메마른 직장인 비슷한 것이 되었지만, 청춘 시절의 저는 제가 갈 곳은 이 '현실'이 아닌 저 '세계'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 세계'란, 저에게 꽤나 명확했는데, 카뮈의 <결혼>이나 장 그르니에의 <섬> 속에 담긴 그 어딘가였습니다. 이를테면, 신들이 내려와 산다는 봄철의 '티파사' 같은 곳이었죠(<결혼>의 첫 구절입니다).
*
<고전의 기대는 시간>은 제가 사랑한 열두 고전(그러고보니 이것도 '열둘'이군요)을 담은 책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섬>에 대한 챕터와 <결혼>에 대한 챕터를 좋아합니다. 제가 썼지만 저도 좋아하는 글이 있거든요.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혼신의 마음'을 다해 <고전의 기대는 시간>에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을 덧붙인다는 게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참으로 좋아했던 한 구절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의 향기와 졸음을 몰고 오는 풀벌레들의 연주 속에 파묻혀서 나는 열기로 숨막힐 듯한 저 하늘의 지탱하기 어려운 장엄함에 두 눈과 가슴을 활짝 연다. 본연의 자기가 되는 것, 자신의 심오한 척도를 되찾는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슈누아 언덕의 저 단단한 등줄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의 가슴은 어떤 이상한 확신으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숨쉬는 방법을 배우고 정신을 가다듬어 자신을 완성해가는 것이었다."(카뮈, <결혼>, 책세상 중)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심오한 척도'를 되찾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의 온갖 걱정과 번뇌에 휩싸여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현실 문제'가 끝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 현실을 뒤로하고, 어렵사리 저 '세계'에 들어서면, 우리는 본연의 자기가 되어 '심오한 척도'라는 것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한 확신으로 차분하게 가라앉고, 우리의 정신은 '완성'에 이르러 간다는 것이죠.
*
아마 청춘 시절, 저는 그런 마음의 '완성'이랄 것을 참으로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완성을 갈망하며 그토록 읽고, 쓰고, 여행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 나섰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요즘 같은 시대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하니 돈 벌 궁리나 하지, 청춘을 허비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청춘의 매력이란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집요하게 따라나서는 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년이었던 시절, 청년 카뮈를 만났던 그 시절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여전히 카뮈가 옳았다는, 그 시절 내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따금, 아내와 아이랑 함께 어느 바다나 숲에 갈 적이면, 그런 세계를 다시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웃고 있고, 마치 그밖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눈앞의 나뭇잎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햇빛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다소리 같은 것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역시 저는 카뮈의 '세계'를 떠올립니다.
바다가 생각나는 계절, 카뮈의 <결혼>을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에세이는 <여름>이라는 에세이와 묶여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더 집어볼 만한 책인 셈이죠.
*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번역본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화영 교수의 번역으로 된 책(책세상)을 오랫동안 좋아하긴 했으나, 최근 이 책의 새로운 번역본(녹색광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녹색광선의 책표지에는 저도 처음 보는 카뮈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워낙 매력적인 느낌으로 <결혼, 여름>이 재탄생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모두 훌륭한 번역가들이 번역한 책이니, 취향에 따라 고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두 종류의 번역본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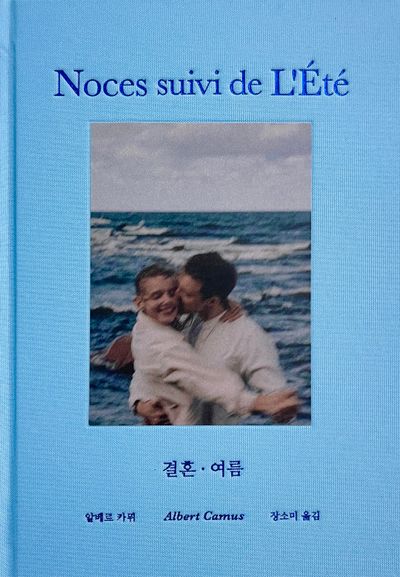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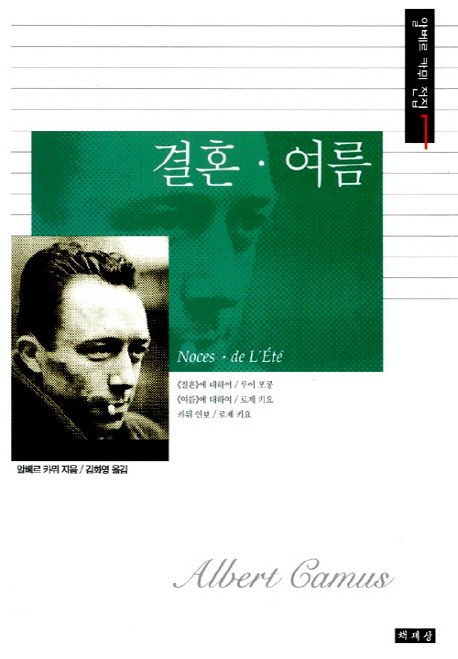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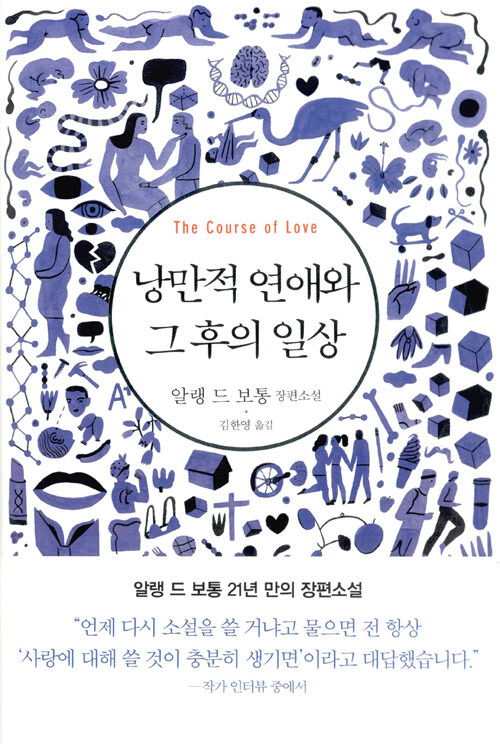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