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열 번째 한 권, 소개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
열 번째로 고른 책은,
J.D. 샐린저의 <아홉 가지 이야기>입니다.
*
이번에도 이 달의 거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간신히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벌려 놓은 일들이 있고, '마감'이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마감이 자유로운 일들이 월말까지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뉴스레터를 처음 시작할 때의 '핵심적인 마음'만이 남은 채 나머지 부차적인 마음들은 스르르 사라지거나 유예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마음이란 '한 달에 딱 한 권만 추천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느덧 그 '핵심'만 지키면 된다, 라고 약간 제멋대로인 마음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 달의 추천은 언제쯤...'하고 기다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다림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빨강 머리 앤>에서 앤은 '기대하는 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설렐 수 있으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한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기다림도 나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역시 제멋대로의 사족을 달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달에 한 권' 원칙은 어떻게라도 지켜서, 언젠가 10년 뒤쯤에는 '10년간 매달 한 권씩을 추천한 뉴스레터를 운영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 일이 우리 나라의 독서 문화에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
이번에 고른 J.D.샐린저의 <아홉 가지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 가장 좋아했던 단편소설집이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언젠가 만들었던 '문학' 추천도서 목록인데, 오랜만에 찾아보니 단편집 목록 제일 첫번째로 <아홉 가지 이야기>가 있기도 하네요.
사실, 샐린저의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호밀밭의 파수꾼>이지만 역시 저는 그의 이 단편집이 더 좋다고 느낍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뭐랄까, 다소 거친 청소년의 마음이랄 게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면, <아홉 가지 이야기>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저마다 겪는 어떤 삶의 공허, 차가움, 또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실린 단편 중에서 '코네티컷의 비칠비칠 아저씨'를 제일 좋아했는데, 뭐랄까, 청년 시절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저에게는 '청춘'을 '메타인지'하는 계기 같은 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춘은 끝나는구나, 전성기도, 우리가 스스로 멋지다고 믿는 시절도 언젠가 끝나는구나, 그런 걸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청춘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영화 중에는 <블루 발렌타인>이나 <우리도 사랑일까> 같은 이야기들이 그랬죠.
<아홉 가지 이야기> 중 몇 개의 이야기 또한 그랬습니다. 제 청춘 시절 내내 마음 속에서 기억났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
물론, <아홉 가지 이야기>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샐린저의 이야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따뜻한 역할을 하곤 하죠.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도 그랬고, 이 단편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몇 편 나옵니다.
문득, '어린 아이'가 나오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몇 개 생각나는데,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라든지 <차가운 벽>(트루먼 카포티)의 '은화 단지'가 생각나네요. 여담이지만 이 두 권의 책도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제 주위에서는 제가 어떤 책, 어떤 이야기가 너무 좋다고 해도 딱히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음 껏 '좋다, 좋다' 할 수 있어서 이 뉴스레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책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런 좋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여정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SNS 같은 곳에서 책 이야기, '이 책 너무 좋다'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에 가깝지 않나 합니다.
이번 책도 누군가에게는 '아, 너무 좋아. 이 좋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라는 감정을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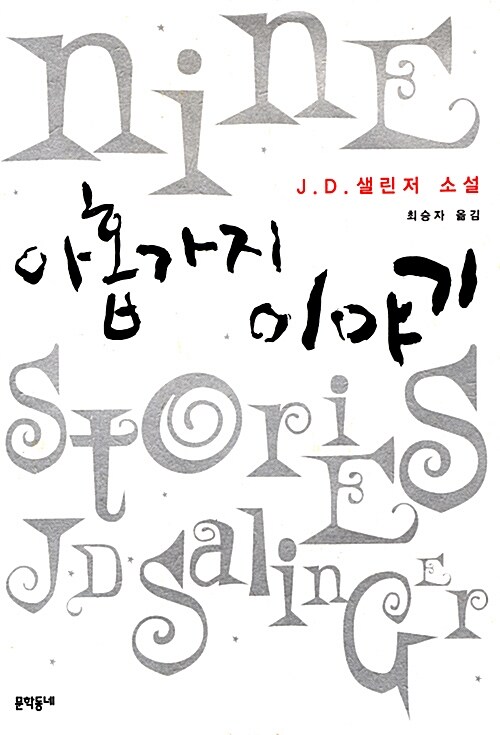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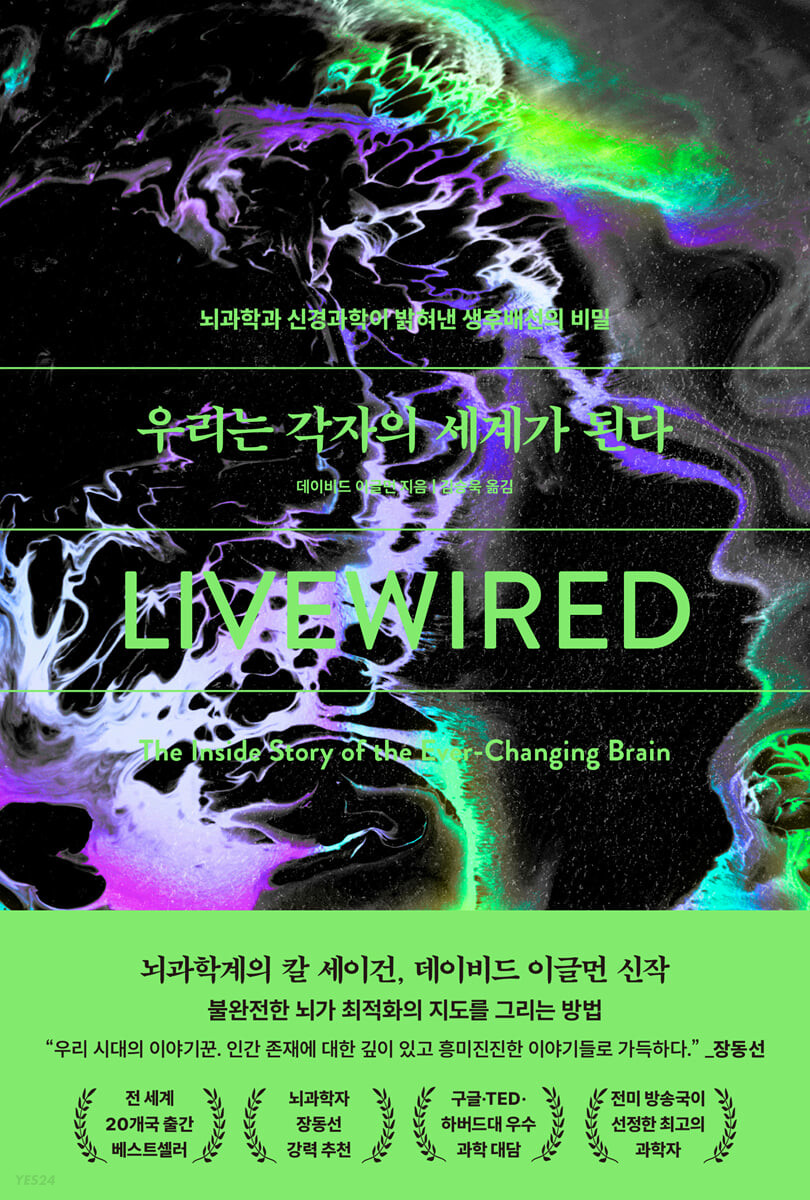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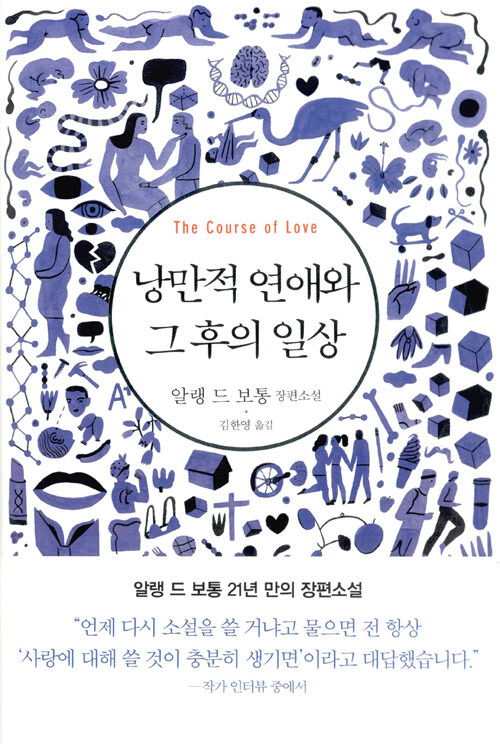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