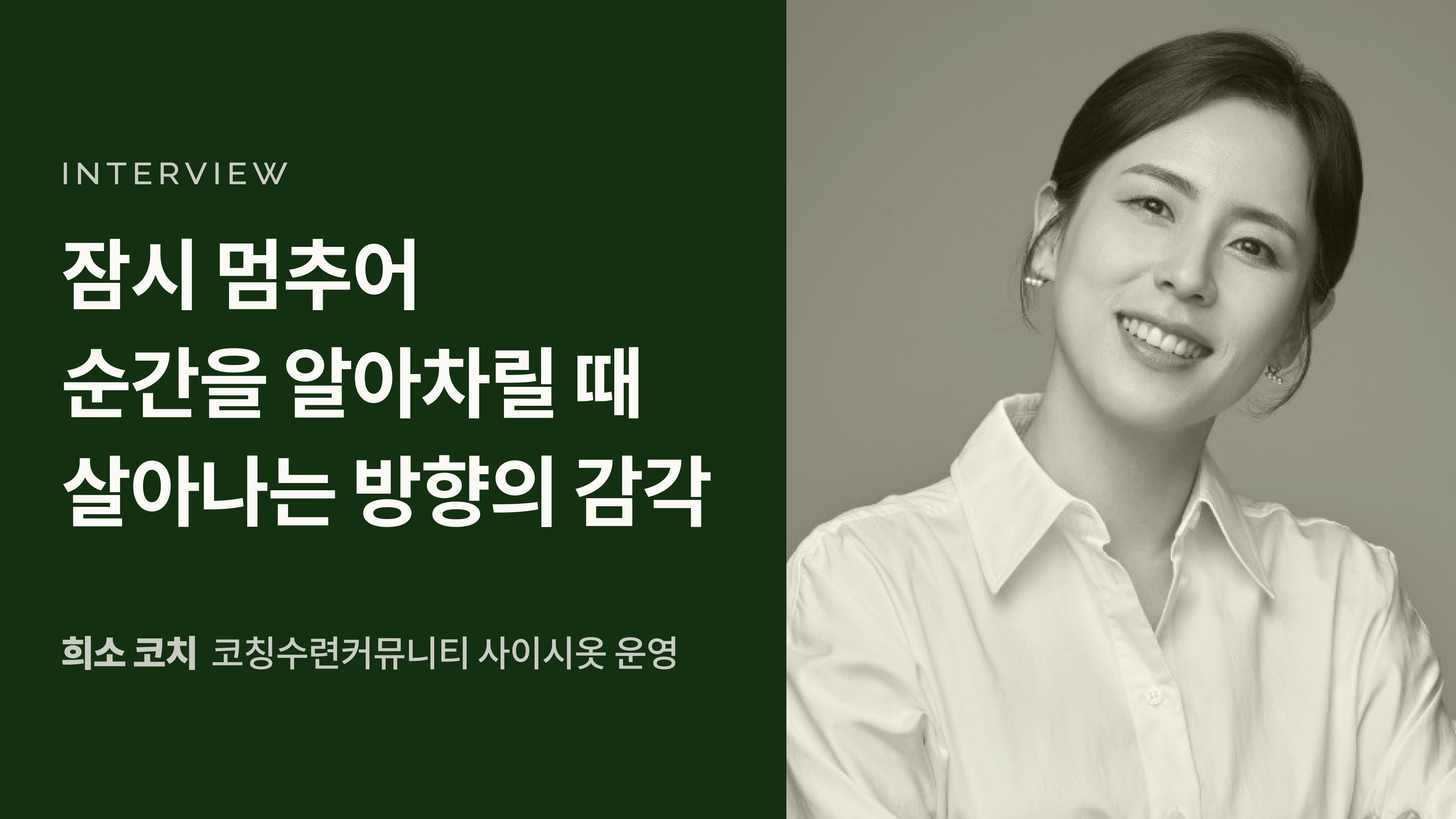
잠시 멈추어 순간을 알아차릴 때 살아나는 방향의 감각
코칭수련커뮤니티 사이시옷 운영, 홍성향(희소) 코치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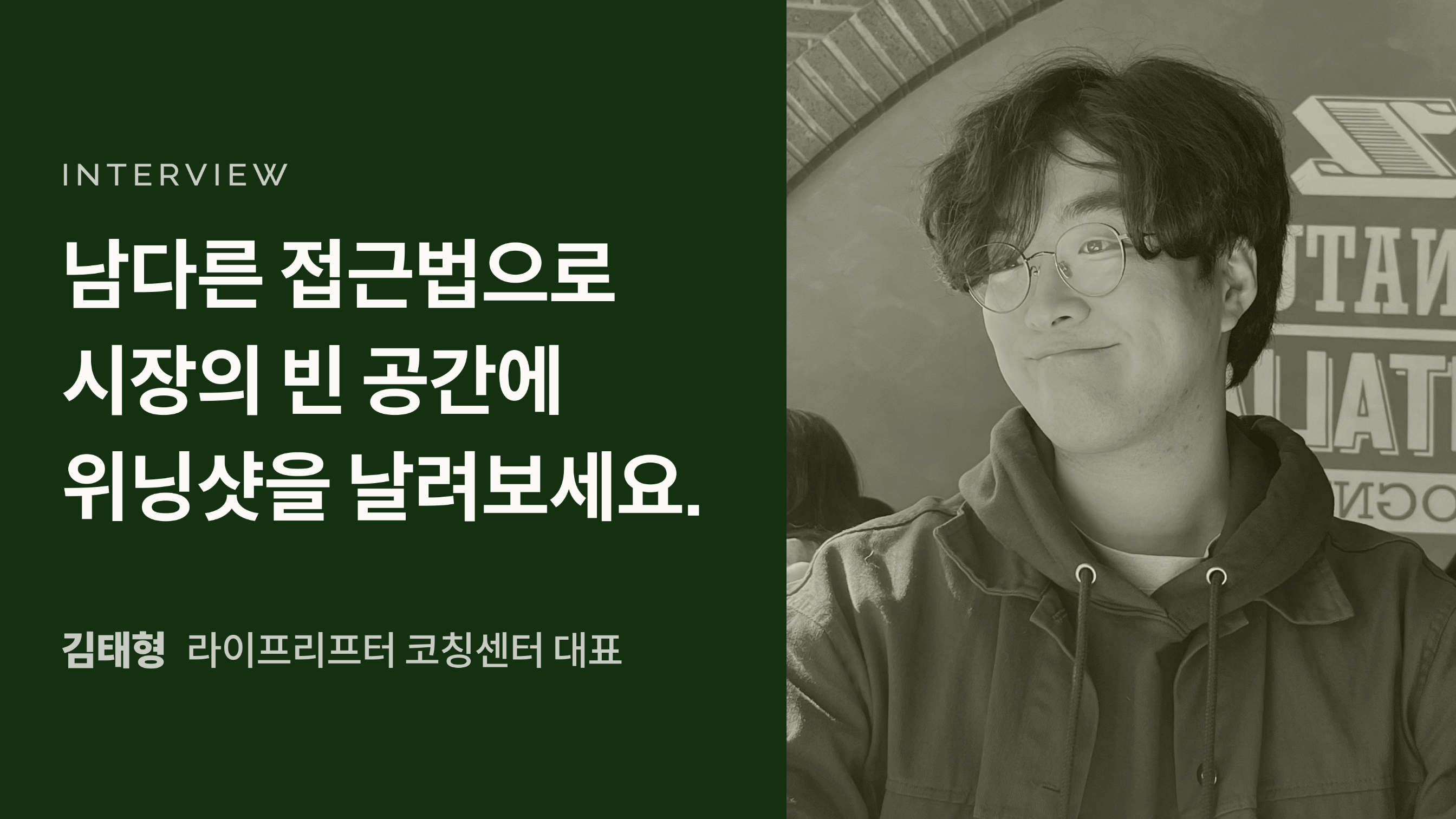
남다른 접근법으로 시장의 빈 공간에 위닝샷을 날려보세요.
김태형 라이프리프터 코칭센터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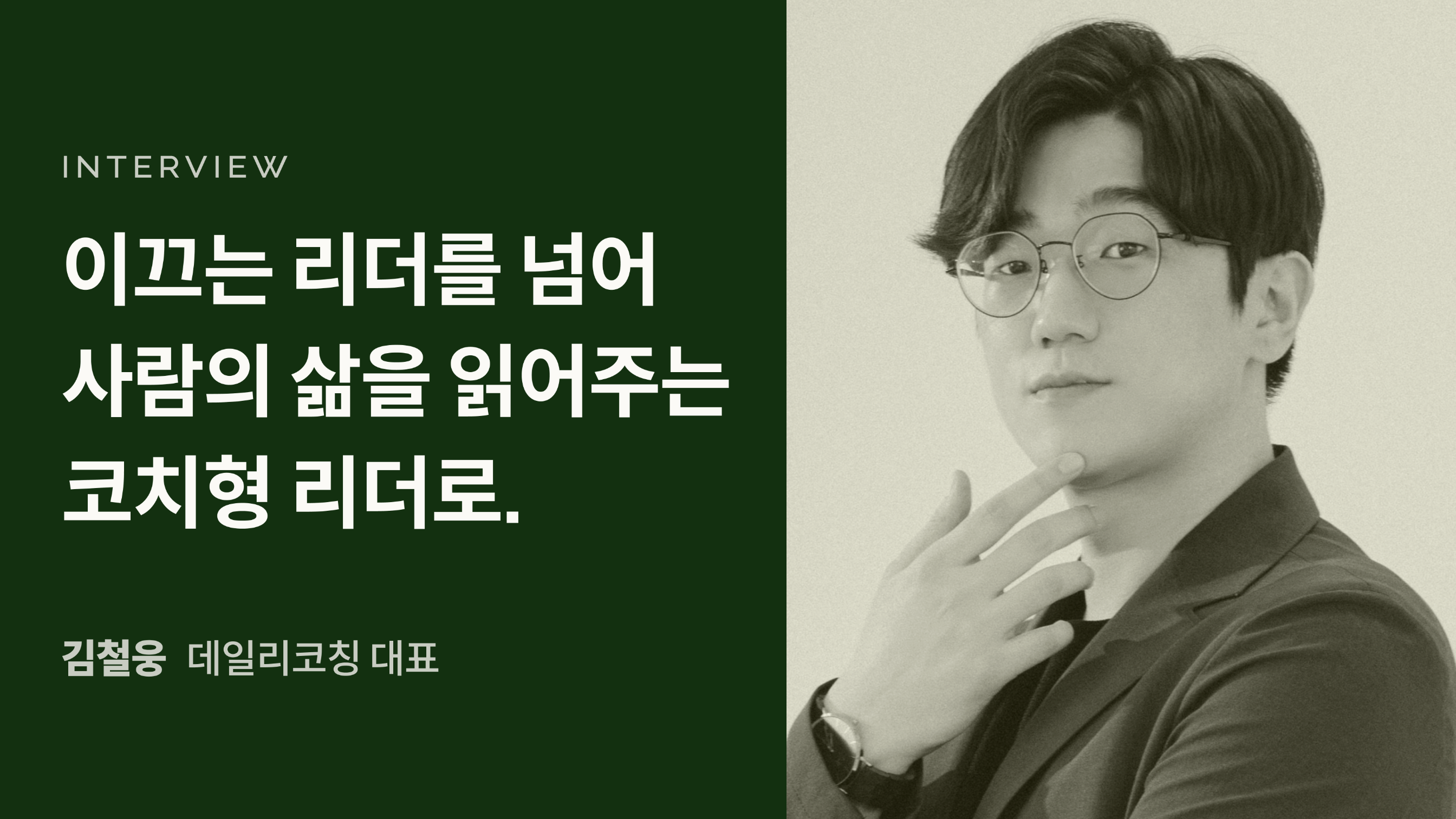
이끄는 리더를 넘어 사람의 삶을 읽어주는 코치형 리더로.
김철웅 데일리코칭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
일상 속 작은 여유가 인생의 큰 여유가 되는 나비효과를 누리세요.
여유코치 신여윤 코칭제타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
코칭이란 마음과 성장을 다루는 일상의 건강한 습관
타마코치 김상호 코칭제타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
개인적 경험보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지속 효과를 누리세요.
김태호 국내 최연소 MCC, 행복공방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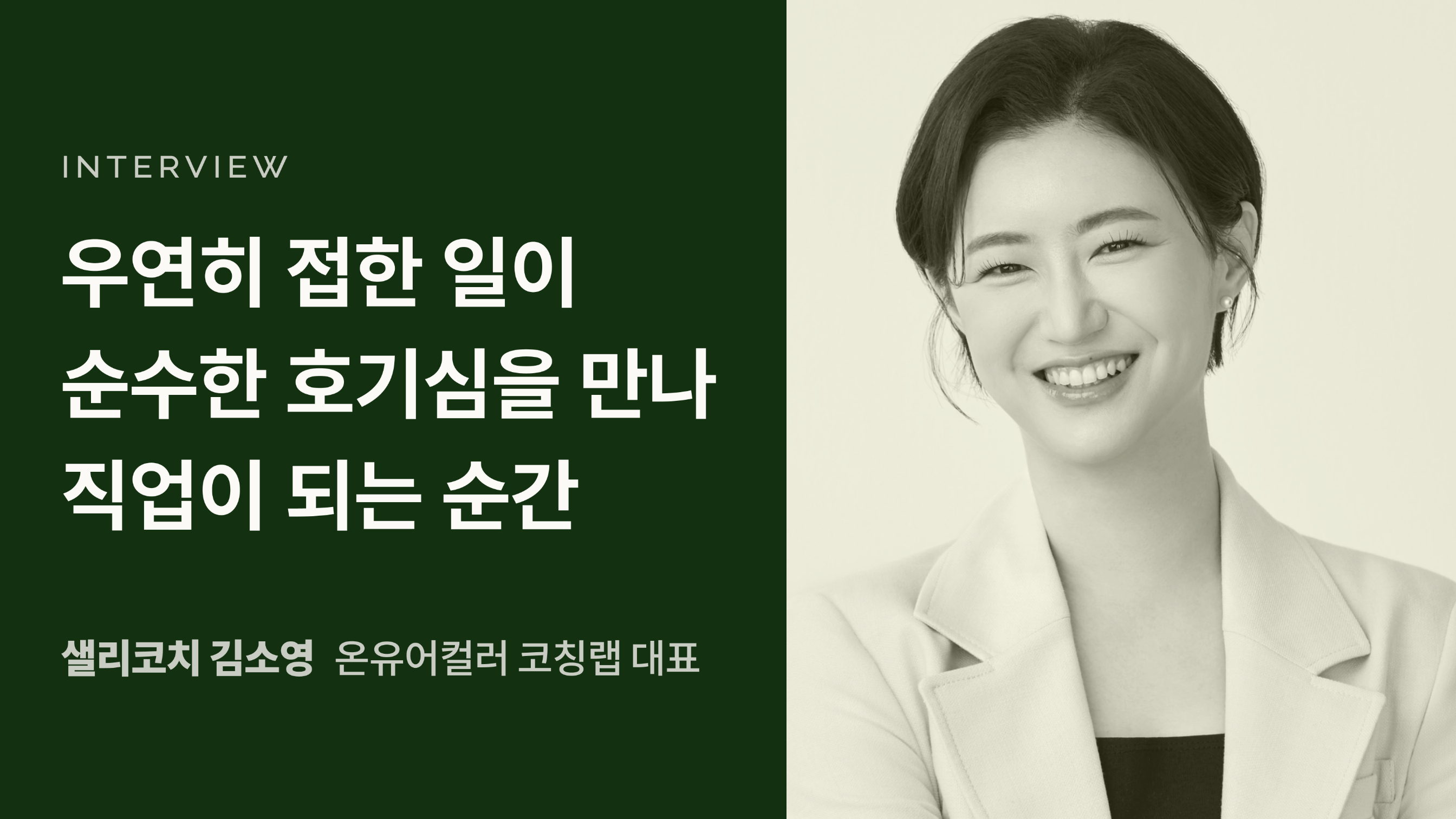
우연히 접한 일이 순수한 호기심을 만나 직업이 되는 순간
샐리코치 김소영, 온유어컬러 코칭랩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여행자의 태도로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비로소 발견하는 것
봄코치 이재경, 코칭 퍼스트클래스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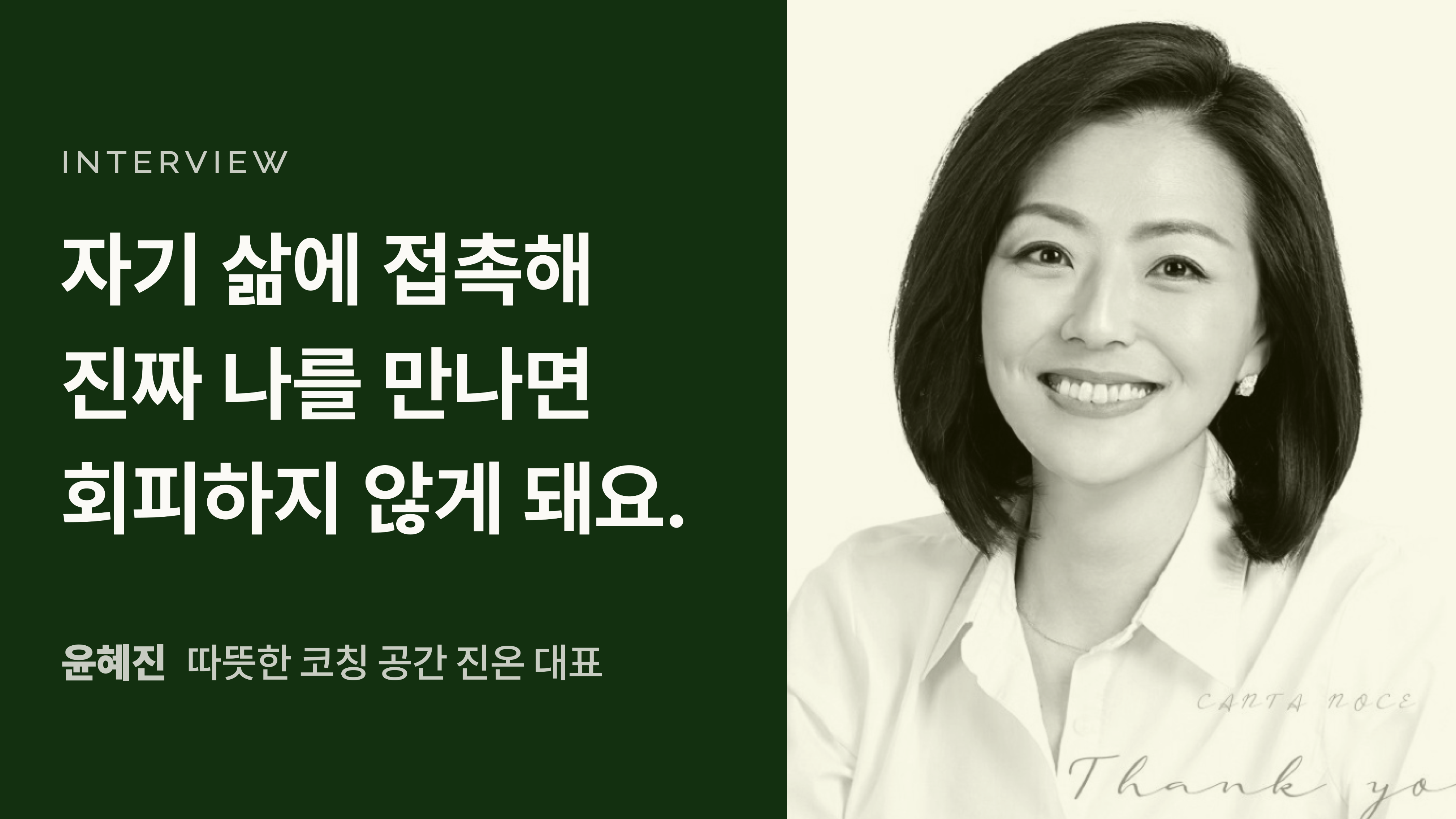
자기 삶에 접촉해 진짜 나를 만나면 회피하지 않게 돼요.
윤혜진 따뜻한 코칭 공간 진온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
강점을 알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날아갈 수 있어요.
나윤숙 알바트로스 성장연구소 대표 인터뷰
코칭 인사이트
| 멤버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