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파빌리온 라다 드수자 교수와 요나스 스탈 작가 [출처: 광주매일신문]](https://cdn.maily.so/202304/publicpublic/1682808642315871.jpg)
모래주머니, 기름통과 철조망 사이로 ‘동무’라는 다국어 글자와 노란색 피켓이 곳곳에 놓여있다. 이 피켓 위에는 동식물 및 곤충이 그려져 있다. 마치 시위장이나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이 곳은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이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전시장이다. 네덜란드 문화·예술기관 프레이머 프레임드(Framer Frmaed)가 개최한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멸종 전쟁>(기획 조주현)이다. 작가 요나스 스탈(Jonas Staal)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군산복합체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멸종시킨 다수의 동식물을 기록하였다. "이 생물들은 500년 전 식민화가 시작된 후 사라진 우리의 선조로서 참석”한 것으로, 제목처럼 "멸종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 멸종생물이 인류의 식민화로 사라진 ‘선조’이자 인간의 ‘동지’인 것이다. 이 흥미로운 발상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전환과 맞닿아있다.
주지하듯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인류가 우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도록 만들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없애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던 ‘불연속성’을 해체했다. 프로이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상 대신에 본능(리비도)의 충동과 억압에 의해 작동하는 존재임을 밝혔다. 매번 인간의 위상이 격하 되는, 다시 말해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부정당하는 순간들을 겪어온 것이다.[2]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철학자 피터 싱어는 저서 《동물 해방》(1975)을 통해 동물권을 촉발시키는 "종 차별주의(speciesism)"를 비판했다. 동식물과 자연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적장애자, 반사회적 정신질환자, 히틀러, 스탈린이 코끼리, 돼지, 또는 침팬지가 가질 수 없는 존엄성이나 가치를 가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인간의 본래적인 존엄성’에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3]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멸종전쟁> 현장 [ 출처: 뉴스펭퀸, 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https://cdn.maily.so/202304/publicpublic/1682808517637568.jpg)
네덜란드 파빌리온 <멸종전쟁>은 피켓에 그려진 생물들을 인류의 동무로서 대하며 종의 차별을 넘어서는 논의를 전개시킨다. 한편, 자본주의로 인한 인류 차원에서의 기후범죄 재판을 삼일간 열었다. 이 모의 재판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법학대학 교수로 있는 라다 드수자(Radha D’Souza)는 국가와 기업들이 저지른 기후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세대 간 기후 범죄법(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을 기반으로 한다. 2021년에는 네덜란드 정부와 유니레버, ING 그룹, 에어버스 등 네덜란드에 등록된 다국적 기업들을 세대 간 환경범죄 행위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광주에서의 재판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정부,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 두산,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포스코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드수자의 ‘기후 재판’은 정부의 엉터리 기후대응정책과 기업의 그린워싱에 맞서는 행동을 촉구한다.[4]
![이끼바위쿠르르(IkkibawiKrrr), <열대이야기>, 2022, 광주비엔날레 본관 전시 [출처: 필자 촬영]](https://cdn.maily.so/202305/publicpublic/1682954335025674.jpg)
정부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종을 식민화하고 생태계 자원을 착취하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에 출품된 이끼바위쿠르르의 2채널 영상 <열대이야기>는 식민주의와 생태학에 대한 더욱 다면적인 관계를 담고있다. 카셀도큐멘타15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본 작품은 미크로네시아 야프 제도에 남아 있는 태평양 전쟁과 식민주의의 잔재를 탐구한 영상이다. 미크로네시아는 16세기에 처음 발견되어 1986년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스파냐), 독일, 일본, UN의 미국 등 많은 열강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 태평양의 작은 섬에는 원주민을 강제로 동원해 건설한 활주로, 진지, 비행장의 흔적이 남아있고, 전쟁으로 인해 생긴 비석과 묘지가 도처에 흩어져 있다. 작업은 2채널 영상으로 자연과 문명, 원주민과 식민지배의 역사가 남긴 흔적들을 흥미로운 사운드와 속도감 있는 화면으로 쫓아가며 기록한다.
영상 속에서 우리는 열대우림기후 속 비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곳곳에서 문명의 흔적을 포착한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때로는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제 모습이 바뀌기도 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면면히 남아있을 뿐이다. 인류는 다른 인종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착취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한차원 바깥에서 바라보자면 인류와 문명은 자연 생태계와 뒤섞이며 분리될 수 없어 보인다. 마치 이 2채널 영상에서 인간이 만든 터널과 자연이 만든 동굴을 구분하기 어렵듯이 말이다.
![올라퍼 엘리아슨, <얼음 시계(Ice Watch)>, 2014년작의 2015년 설치, 팡테옹 광장 [출처: ERIC FEFERBERG / AFP / GETTY]](https://cdn.maily.so/202304/publicpublic/1682808687198620.jpg)
문명과 자연, 인간과 생태계, 인간과 비인간의 뒤섞임을 넘어선 급진적인 사유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얼음 시계(Ice Watch)>를 통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이 작업은 파리의 팡테옹 앞에(2014년에는 코펜하겐 시청 앞에, 2018년에는 런던 테이트모던 앞에) 그린란드의 빙하를 가져다 놓은 프로젝트였다. 당시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에 맞춰 진행된 공공예술 프로젝트였다.[5] 약 80t의 빙하가 컨테이너선을 통해 덴마크로, 또 덴마크에서 트럭으로 운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30t을 배출했다. 이에 관한 비판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것을 도심에서 보고 만지고 듣는 경험은 시사점을 남긴다. 특히 “이 얼음 덩어리에서 만년 전의 공기, 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30% 적었을 때의 공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dezeen, 2018.12.18)
![[사진: Martin Argyroglo 출처: https://olafureliasson.net]](https://cdn.maily.so/202304/publicpublic/1682808742759662.webp)
얼음 속의 공기는 휘발되며 우리의 코를 통해 폐로 침투한다. 과거와 현재의 공기를 나와 분리시킬 수 있을까? 문학평론가이자 생태비평가 티머시 모튼(Timothy Morton)은 지구와 우리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인간과 비인간 객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사고로 부터 벗어나 다원적인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만든 ‘하이퍼오브젝트(hyperobject, ‘초객체’ 혹은 ‘거대사물’로 번역된다)’ 개념에서는 방사능, 탄화수소,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외부에 시공간상 대규모로 분포하며 인간과 관련 맺는 요소들에 주목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처에 존재하는 이 요소들은 결코 우리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마치 지구온난화로 인해 강렬한 햇빛은 피부암이나 화상의 형태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우리에게 달라붙고 우리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인간과 생태적 요소를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올라퍼 엘리아슨의 빙하 덩어리들은 ‘함께 대화를 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진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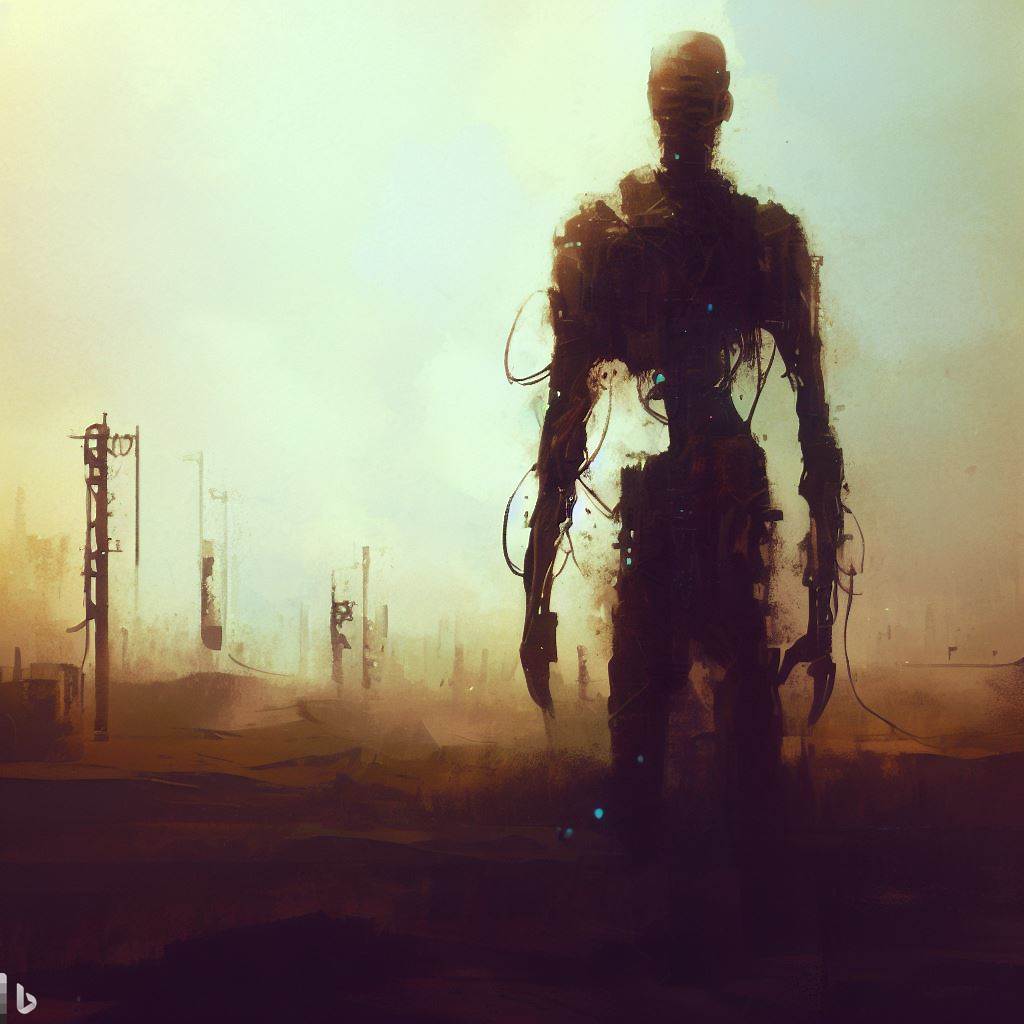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기후재난의 위기에 처해있고,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자 조작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물리-생물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조정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194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인류세(Anthropocene)의 우리는 생태적 사고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물로 통칭되는 비인간 존재들보다 과연 인간이 더 우월한가? 혹은 그들과 정확히 분리될 수 있는가? 휴머니즘의 다음이 무엇인지는 이 질문들에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여러 존재 중의 하나로서 생물권(biosphere)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이다. (<생태적 삶 Being Ecological> 중)[7]
- 티머시 모튼 Timothy Morton
[1] 이수연 기자, ‘누가 '기후'죄인인가’, 뉴스펭귄, 2023.04.10
[2]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AI 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아카넷, 2020, p.17.
[3] 안진국, <불타는 유토피아:‘테크네의 귀환’ 이후 사회와 현대 미술>, 갈무리, 2020, p.403
[4] 라다 드수자는 “사람이라면 질문하고 설득할 수 있지만, 법인에 소속된 개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법인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의 면제 수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유발한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자연환경과 다른 종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만 처벌을 받는 이 상황이 과연 동등한가”라를 묻고 있다. 강한들 기자 ‘라다 더수자 영국 교수 “기업은 책임 면하고 활동가만 처벌…과연 동등한가”’, 경향신문, 2023.04.24
[5] 주지하듯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은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전세계가 합의하는(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만을 제외한 채) 새로운 기후체계를 가져온 중요한 시점이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협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6] 2015년 12월 5일자 뉴요커(The New Yorker)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 our contemporary ecological emergency, there’s a lot of data, but at this point we’re dumping ecological data on ourselves. It’s not helping. We don’t need to be doing that for one more minute. Olafur is putting pieces of ice there and saying, ‘Let’s try to start a conversation.’” 그의 흥미로운 텍스트 ‘We have never been displaced’은 올라퍼 엘리아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lafureliasson.net/read/we-have-never-been-displaced-by-timothy-morton-2015/)
[7] 티머시 모튼(김태한 옮김), 『생태적 삶』, 앨피, 2023, p.82.
이경미 / 독립기획자, PUBLIC PUBLIC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mia.oneredba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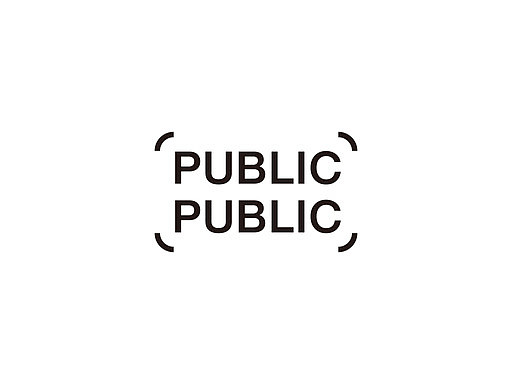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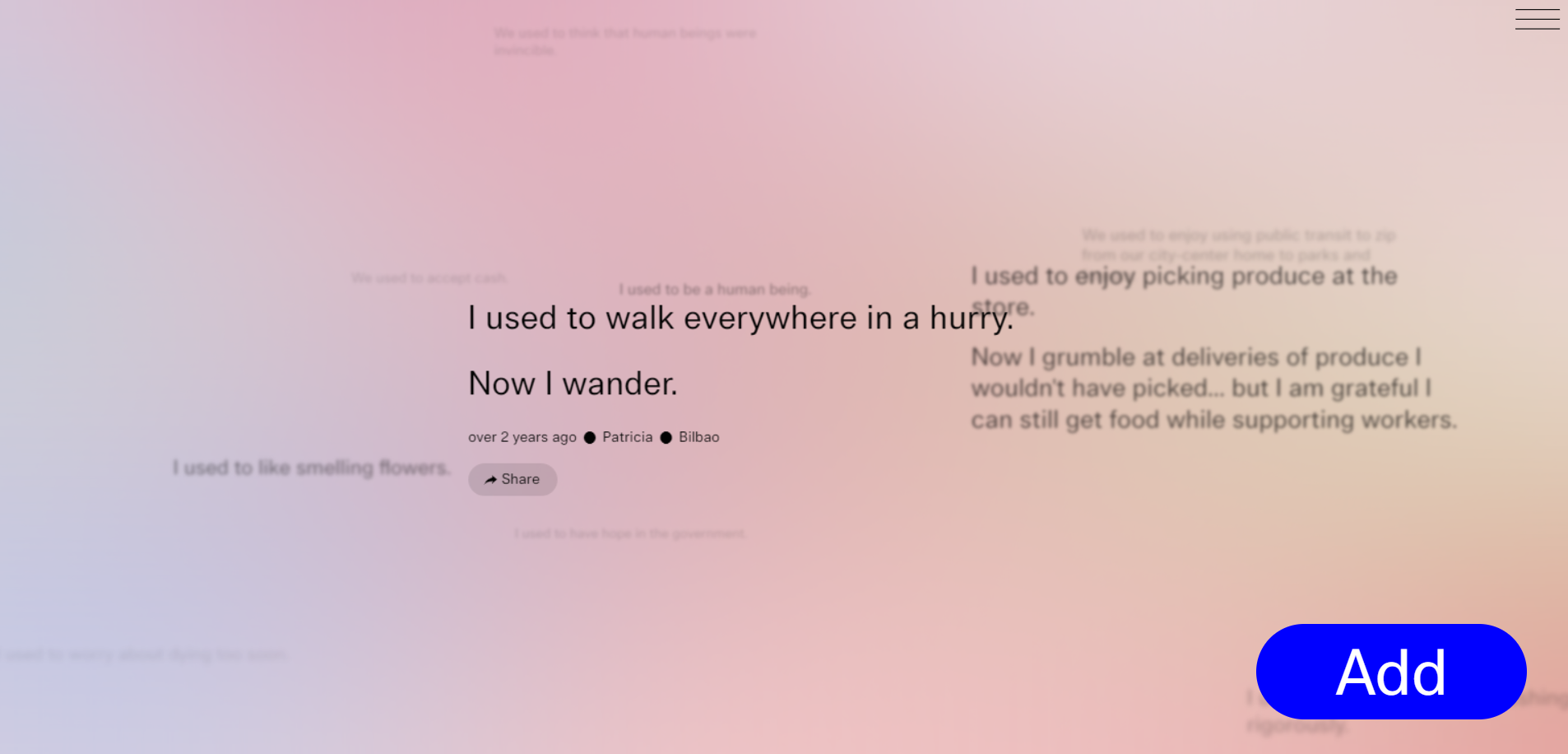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