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싸늘한 날씨에 놀라 잠자고 있던 외투를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정리해 두었다. 그런데 10월 중순의 날씨가 아직도 25도를 웃돌 줄이야 알았겠는가. 올해 여름은 매우 더웠고, 곧 다가올 겨울은 역대급 한파라고 했다. 지나온 여름을 잊어버릴 때쯤 서늘한 날씨가 찾아오더니 다시 미지근한 날씨에 어떤 예측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 년의 날씨가 늘 기대를 엇나가고 예년과 다른 이상 기후임을 실감할 때면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둘러싸인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피부로 느끼지만, 환경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상 속 강령들에는 한없이 작아진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만드는 배달 음식은 가급적 안 먹어야 좋고, 가방이 무거워져도 텀블러를 챙겨야 하지만 매일에 무뎌져 조금 더 편해지고자 하는 선택은 그 결심을 무색하게 만든다.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 인식에만 그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앞에서 합리화를 허용하는 상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을까.

비현실이 현실을 불러올 때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보던 작품 앞에서 다시 불러왔다. 야콥 쿠즈크 스틴센(Jakob Kudsk Steensen)의 작품 <베를-베를(Berl-Berl)>(2024)[1]은 도시 이전의 늪을 바라보고 그 안의 세계를 탐색하게끔 시각적으로 유인하는 작품이다. 대부분의 도시는 습지 위에 혹은 습지와 인접한 곳에서 건설되었지만, 견고한 도시의 면면들은 자연적인 기원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작가는 도시를 태동하고 발전시킨 기반인 습지를 기리면서 그 특유의 축축하고 어두운 늪으로 관람자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유영하듯 움직이는 화면을 따라 늪의 이면으로 들어가고 숨어 있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작품은 우리가 놓치고 말 자연의 세부 풍경을 끈질기게 따라간다. 이 작품의 이중적인 면은 비디오 게임이나 가상현실과도 같은 이질적인 질감으로 자연을 구현한 점이다. 인위적인 장면으로 포착하는 자연은 오히려 양가적인 느낌을 내면서 진실로 마주할 자연의 풍경을 상상하게 한다. 자연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주목하지 않은 자연적 실체를 마주하게 하는 작품도 있다.

사디아 미르자(Saadia Mirza)의 <빙산 충돌(Iceberg Collisions)>(2024)[2]은 세계 최대 빙산인 남극 로스 빙붕의 B15를 연구한 빙하학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B15의 존재론적 이야기를 따라가는 작품이다. 빙산의 진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소리가 생경하고 다채로울 수 있음을 음향 설치 작업으로 전한다. 빙산의 끝이 떨어져 나가는 칼빙, 즉 빙하 붕괴의 묵직한 파열음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작품은 웅장함과 예기치 않은 성찰을 촉구한다. 지구의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게 하는 사디아 미르자의 작품을 통해 오히려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보다 더 경각심을 갖게 한다. 알지만 지켜야 하는 것들 앞에 작아질 때, 현실 앞에서 기후 위기가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느껴질 때 직접적인 주장이나 목소리보다 무언가를 경유한 메시지는 이처럼 더 큰 힘이 있다.
녹색 계급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니콜라이 슐츠(Nikolaj Schultz)와 공저한 책 『녹색 계급의 출현』(2022)에서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무력증의 원인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우리의 망설임과 세계의 견실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연한 기회를 포착하는 우리의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걸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우연한 기회’를 마주하는 순간처럼 말이다.[4] 최근에 일어나는 행성적 변화와 그 흐름에 인간의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해법은 녹색 계급이라는 급진적 ‘되기’에 있다. 녹색 계급은 세계를 양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이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세계임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거주 가능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구의 역사에 대한 더 넓고 복잡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5]
다른 바탕
그러나 이렇게 급진적인 녹색 계급이 지속적으로 또 다른 모색의 바탕을 만들려면 인문학적인 사고에 지속적인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라튀르는 말한다. 넓은 시각을 유지하고 투쟁하는 녹색 계급도 결국 자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단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생태학에서도 예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그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어도 예술은 어떤 것들과 나란히 둘 때 밀려나는 처지인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예술을 공부하고 이 영역에 발붙여 일하고 있는 나는 지속적으로 예술이 왜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예술은 기후변화를 말할 수 있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술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은 안다. 그래도 예술이 새로운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바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 행동의 지평을 넓히는 문제가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역사에 대한 더 넓고 복잡한 시각을 갖추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꺼이 떠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바탕을 향한 시간이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으키고 그 바탕이 행동하게 할 것이다.
[1]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2024. 9. 7.(토) ~ 12. 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4 전시실
[2]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2024. 9. 7.(토) ~ 12. 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5 전시실
[3] 브뤼노 라투르, 니콜라이 슐츠, 『녹색 계급의 출현』, 이규현(역), 서울: 이음, 2022, p. 56.
[4] 같은 책, p. 64.
[5] 같은 책, p. 38.
이희옥 / (재)광주비엔날레 홍보마케팅부 stitch063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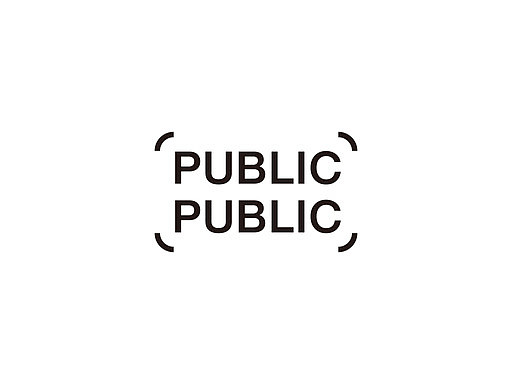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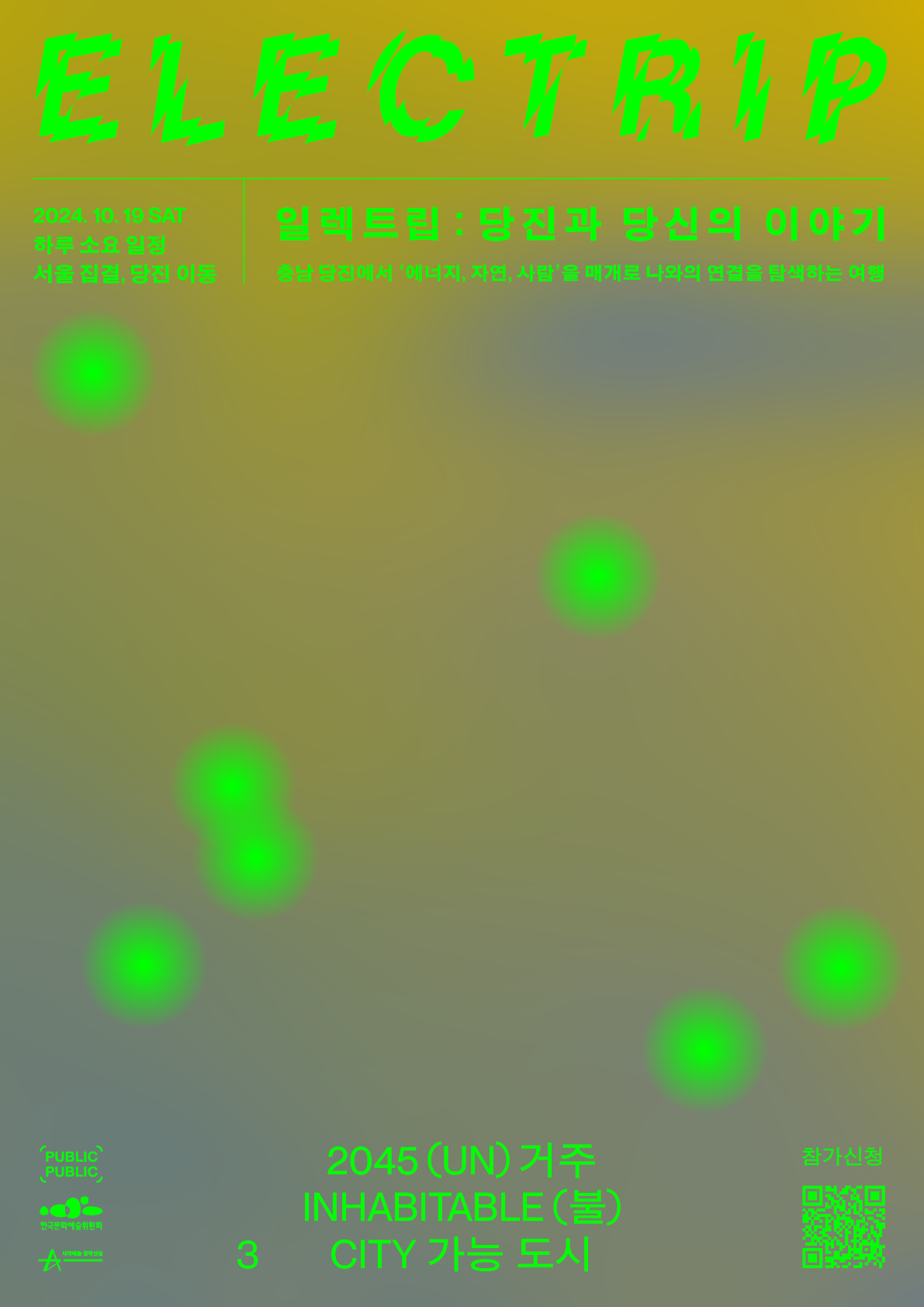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