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술계에 큰 이변이 있었다. 영국의 권위있는 현대미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의 수상자로 ‘어셈블(ASSEMBLE)’이라는 콜렉티브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그들은 시각예술 분야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건축, 디자인, 철학, 역사, 언어 등을 전공한 이들로 구성된 그룹이었고, 작업 방식 역시 매 프로젝트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는 단일한 인물이나 팀이 아닌 느슨한 형태로 활동하는 ‘콜렉티브’라는 용어가 (지금과는 다르게) 국내 미술계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상이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요 작품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의 한 낙후지역을 재생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작가상’에 ‘믹스라이스’가 수상하면서 커뮤니티 아트가 현대미술의 제도권에 흡수되며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끼바위쿠르르’나 ‘카셀 도큐멘타 15’를 다루는 편에서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미지 1] 어셈블 <그랜비 4거리> ‘겨울정원’ ©ASSEMBLE](https://cdn.maily.so/202208/publicpublic/1660471993579964.jpg)
어셈블은 영국 북서부 리버풀의 낙후된 지역인 그랜비(Granby)에 5년간 활동하며, ‘겨울정원(winter garden)’ 등 비어있는 주택을 개조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폐자재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생산품을 만드는 워크숍을 꾸렸다. <그랜비 4거리(Granby four streets)>라고 알려진 이 일련의 활동들은 주민이 공간에 모이고 소통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촉매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술계가 앞다투어 어셈블의 프로젝트를 중요한 작업으로 다룰 때 정작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들의 활동이 “진정성을 갖춘” 예술적 실천으로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면의 맥락들은 지워지거나 과소평가되었다. 과연 예술만으로 지역의 재생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지면에서 그랜비 지역의 재생에 있어서 어셈블의 탁월함을 조명하는 대신에 그들의 예술활동이 발아될 수 있었던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리버풀, 쇠락한 산업도시에서 2008년 유럽 문화 수도로
리버풀은 1840년 최초의 증기선을 출항했고,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건조될 정도의 기반시설을 갖춘 산업도시었다. 그러나 이 곳이 쇠퇴일로를 걷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산업운송 구조가 선박에서 기차로 개편되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폭격지가 되면서 많은 시설이 파괴되면서부터였다. 이후 대규모 실업과 1981년 인종차별 시위 등의 문제를 겪었고, 이미 많은 원주민들이 방치된 지역을 떠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풀시는 '2008 유럽 문화 수도'에 선정되며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리버풀대성당이나 세인트조지홀처럼 오래된 도시의 유산을 정비하고 ‘비틀즈의 고향’이나 영국 하층 노동계급의 생활상을 취재하기 위해 ‘조지 오웰이 두달간 머무른 항구’ 같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얹었다. 그리고 문화 수도 프로젝트가 리버풀을 최고 수준의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문화관광·국제협력·도시개발 등 관련 부서를 통합한 ‘리버풀 컬처 컴퍼니’(현재 ‘컬처 리버풀’로 개명)를 설립해 운영했다.[1]
![[이미지 2] 컬처 리버풀 Culture Liverpool 웹사이트](https://cdn.maily.so/202208/publicpublic/1660472027501114.jpg)
지역사회, 지불가능한 주택 공급부터
시 정부가 도시재생을 위한 밑작업에 여념이 없는 동안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시 재건하는 바람이 활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랜비의 경우는 방치된 건물들로 점차 동네가 우범화되는 것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먼저 나섰다. 우선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거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1993년에 그랜비주민협의회(Granby Residents Association)가 꾸려졌다. 그러나 90년대 내내 파괴는 계속되었고, 주민협의회는 리버풀 시의회를 설득하여 이 '그랜비 4개의 길(Granby Four Streets)'에 있는 집들은 철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또한 2002년 영국 정부가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려고 하자 협의회는 이를 저지하는 교섭을 다시금 시의회가 진행하기도 하였다.[2]그리고 주민들은 2010년부터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시작했다. 지역의 정원을 가꾸고 거리를 청소하며 주말이면 벼룩시장을 열었다. 황폐해진 빈집 벽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1년에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을 재생시키고자 하였다.[3] 이후 독지가에 의해 어셈블이 지역에 초대되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며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었다.
![[이미지 3] 공동체토지신탁(CLT) VS 일반시장 차이](https://cdn.maily.so/202208/publicpublic/1660472077338905.jpg)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사회가 토지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비영리 조직을 만들고 지역공동체가 이를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불가능한 수준으로 주택가격을 컨트롤하여 거주자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모델이다.[4] 다시말해 주거약자를 위하여 국가와 비영리(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여 지불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기반으로 살만한(살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지역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주민들의 의지가 모든 재생사업의 시작이었다.
예술가, 공동체 회복과 자생을 위한 매개
이 즈음에서 다시금 어셈블이 그랜비 지역에서 했던 예술활동을 살펴보자. 2014년, 그랜비 공동체토지신탁이 맡은 집 13채 중 6채는 팔고 5채는 세를 줬다. 나머지 2채는 집으로 되살리기가 힘든 상태여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쓸 공간으로 꾸몄다. 이 곳이 바로 어셈블이 주도적으로 작업한 ‘겨울정원’과 워크숍 공간이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버려진 집에서 그을린 나무를 다듬어 의자와 탁자를 만들었다. 타일에 문양을 넣고 전등갓이나 접시도 구워냈다. 쓰레기로 취급되던 것들이 지역을 상징하는 기념품이자 커뮤니티 아트를 드러내는 굿즈가 되었다. 판매 수익은 다시 워크숍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며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이 밖에도 매달 첫번째 토요일에 ‘거리 시장’을 열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기회 제공 등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지 4] 어셈블 <그랜비 4거리> ‘그랜비 워크숍 생산품’ ©ASSEMBLE](https://cdn.maily.so/202208/publicpublic/1660472138773754.jpg)
이처럼 정체된 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구조와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게 이는 ‘정부(시) 차원의 방향 설정-지역사회의 시스템(정책)-매개적 활동(문화예술적 개입)-주민의 의지(참여)’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매개적 활동’이란 외부에서 유입된 활동가(예술가)들에 의한 문화예술적 활동이 주를 이룬다.
주민이 지역 쇠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재생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다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매개적인 활동이고 가능케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라고 손꼽는 경우 대다수가 <그랜비 4거리>처럼 ‘지역 주민의 의지→시스템 조성→예술활동→적극적 참여’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일궈낸 성과였다.
지역소멸의 시대을 해결할 주체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로 눈길을 돌려보자.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시대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지방도시들은 노령인구만이 남고 텅텅 비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5]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년전부터 지역소멸 위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5]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선정 지역활동 (2021년)](https://cdn.maily.so/202208/publicpublic/1660472173633672.jpg)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시청년의 유입을 위해 거주와 창업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03년부터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기획해 온 ‘공공프리즘(구 공공미술프리즘)’이 2021년 운영했던 사업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이다보니 지역을 일정기간 체류하고 경험하면서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형태를 띄고 있다. 지역 단기체류(‘신안 일주하며 일주살기’), 산업 체험(‘잠깐만 농부’), 창업 지원(‘한달창업 in 청양군’) 등이 그 사례다.[6] 작년에는 인천 강화에서부터 부산 동구에 이르기까지 12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며, 올해에도 12개소에서 사업이 꾸려지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여러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7] 여기서도 사회적 경제 서비스 기반을 만들 지역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매개로 청년활동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역과 산업을 잇는 촉매제로서 지역의 활동가 역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셈블의 사례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러한 사업들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되려면 최소한의 경제·산업적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그리고 이를 예술적인 콘텐츠로서 풀어내는 창조적인 활동들이 교차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연 소멸위기 앞에선 이 지역들의 여러 주체들이 지역 재건을 위해 어떤 소통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 나아가 공공예술 현장에서도 예술을 공급하는 창작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그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 자체의 현안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함을 자성한다.
“우리들 그 누구도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셈블의 창립멤버 루이스 슐츠(louise schultz)의 말은 지역 재생 프로젝트들이 예술작업과 사회운동의 애매한 경계에 위치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적 예술로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확장가능성은 공공예술을 논의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경미 / 독립기획자, PUBLIC PUBLIC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mia.oneredbag@gmail.com
[1] 연선옥 기자, ‘우범지대에서 16조원 버는 도시로…'비틀즈의 도시' 리버풀’ (이코노미조선, 2017.1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2299.html
[2] 윤찬영, ‘쇠락한 대영제국의 도시, 주민 힘으로 되살리다: 영국 리버풀 '그랜비 포 스트리츠'의 도시 재생’ (오마이뉴스, 2018.5.28)
[3] 이정희 (주)이가디자인랩 대표, ‘자발적 변화를 만드는 공간: 프란 에쥘리 어셈블 창립 멤버’ (arte 365, 2018.11.19),
[4] 공동체토지신탁(이하 CLT)은 시장에서 건물의 값과 토지의 값 두 가 지 비용 요소를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지불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시장 영역 바깥으로 옮겨와 CLT에 속하게 함으로써, 상승한 토지가치 중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몫을 일정 규칙을 통하여 CLT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지역공동체와 거주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 전은호(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해외 사회주택 공급사례: 공동체토지신탁 개념과 사례」, 한국주거학회지 (v.10, no.1), 2015년, pp.9 - 11.
[5] 박성우 기자 ‘인구 절반이 수도권 거주, 쏠림 현상 ‘지속’…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 가구’ (조선비즈, 2022.3.24)
[6]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멸지역과 참가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localcity.modoo.at/?link=eahk527x
[7]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였으며 2018년에만 2157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미지 1] 어셈블 <겨울정원>, 2019 ©ASSEMBLE
[이미지 2] 컬처 리버풀 Culture Liverpool 웹사이트 갈무리 https://www.cultureliverpool.co.uk/
[이미지 3] 전은호(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해외 사회주택 공급사례: 공동체토지신탁 개념과 사례」, 한국주거학회지 (v.10, no.1), 2015년, p.10
[이미지 4] 어셈블 <그랜비 워크숍>, 2015 ©ASSEMBLE
[이미지 5] 공공행정안전부 주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웹사이트 갈무리 https://localcity.modo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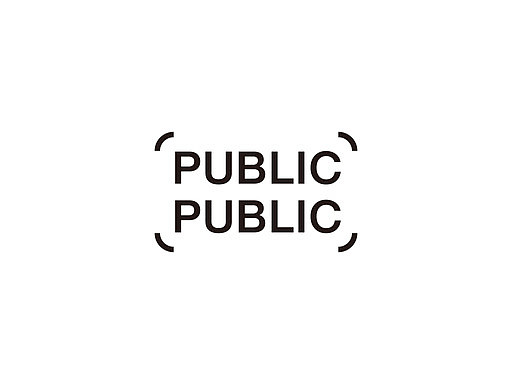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