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로애락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뱉어본 말일 거다. 내 감정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도무지 알기 힘들 때도 있다. ‘애증’이나 ‘경외’같이 언뜻 접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말 같기도 한 두 감정을 하나로 묶은 단어가 생겨난 것도 그래서일 거다.
인간의 감정을 주제로 글을 쓰기로 해놓고선 한참 동안 시작도 못 했다. 인간의 감정을 대체로 아우르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첫 글자 ‘희(喜)’에서부터 시작하리라 마음은 먹었지만, 쉬이 글감이 떠오르지 않았다. 도대체 희로애락의 출발점에 있는 ‘희’는 무엇일까? 희로애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락’은 무엇일까? ‘희’와 ‘락’이 어떻게 다를까? ‘희’와 ‘락’은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감정일까? 그럴듯한 말맛과 완벽한 수미상관을 위해 단어의 처음과 끝에 음이 다를 뿐 뜻이 같은 글자를 넣어둔 걸까? 이런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거칠게 내달릴 뿐 쓸만한 소재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나누고 정의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숟가락과 포크를 나누어 정리하는 일은 너무도 쉽게 들리지만, 식기류 더미에서 숟가락 끝에 포크가 달린 포크 숟가락이 나오면 도대체 어떤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단번에 정할 수가 없다. 책을 종류별로 나누는 일도 쉽지 않다. 자기계발서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샀는데 막상 읽어보니 인문서에 가까운 책도 있고, 에세이라 믿고 샀는데 막상 심오한 철학으로 가득한 책도 있다. 기쁨과 즐거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 보니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숱한 감정을 네 개의 명확한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졌다.
호르몬과 무지개
기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에는 도저히 기쁨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도대체 기쁨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기쁨이고 어디부터는 즐거움인지 그 미묘한 경계를 찾고 싶었다. 설사 그렇게 찾아낸 답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나름의 확신이 서야 첫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하릴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운전할 때는 심리학 유튜브도 들었다. 그러던 중,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쁨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즐거움을 느낀다는 설명에 무릎을 '탁' 쳤다. 크게 보면, 세로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모두 긍정적인 감정과 닿아 있다. 하지만, 똑같이 기분이 좋더라도 평온하고 충족된 듯한 기분과 흥이 오르고 신이 나는 기분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 평온하고 충족된 기분에 좀 더 가까운 것은 기쁨으로, 좀 더 격렬하고 들뜨는 것은 즐거움으로 나누어봐도 괜찮을 듯싶었다.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하는 다소 선명한 선이 생기자, 기뻤다. 그래, 기뻤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무언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기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됐을 때도 기쁨이 밀려온다. 맨 첫 책을 번역하게 됐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면,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이 맞다. 하지만 기쁨이라는 감정 스펙트럼 어딘가에는 설렘, 재미, 만족, 행복, 즐거움, 흥분, 쾌락 같은 또 다른 감정의 흔적들이 배어 있다.
어쩌면,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호르몬보다는 무지개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인간의 감정은 무지개와 비슷하다. 한국에서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일곱이라고 답할 것이다. 장소를 옮겨 미국 사람들한테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개 여섯이라는 답을 내놓을 테다. 하늘에 걸린 똑같은 무지개를, 우리나라 사람은 일곱 색으로, 미국 사람은 여섯 색으로 나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대답은 모두 틀렸다. 무지갯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최대 207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정설이다. 멀리서 보면 예닐곱 개처럼 보이는 색깔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207개로 나뉜다는 뜻이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도 멀리서 보면 대체로 희, 로, 애, 락 정도로 나뉘지만 가까이서 일일이 나누고 쪼개다 보면 200여 개로 나뉠지도 모를 일이다. 거기에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 어느 지점에선가는 서로 맞닿아 교묘하게 겹쳐있을 수밖에 없다.
수많은 처음을 기다리며
기쁨이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애쓸 때는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기쁨을 제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보니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샘솟았다. 오직 기쁘기만 했던 일이 아니어도, 기뻤다가 곧이어 슬프고 화가 났더라도, 기쁨 뒤에 폭풍 같은 희열이 뒤따랐더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기쁨이라는 주제로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마음이 편해졌다.
삶을 돌아보면 기뻤던 순간이 많다. 주홍빛 능소화가 탐스럽게 핀 골목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기뻤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식당이 맛집이었을 때도 기뻤으며, 랜덤 플레이리스트에서 마음에 쏙 드는 노래가 나올 때도 기뻤다. 이렇게 기뻤던 순간을 돌아보니, 무언가 새롭게 시도한 일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을 때, 오감이 충족됐을 때 기쁨이 차오르는 것 같다.
시작이라고 하면 언제나 설렘이라는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설렘의 유효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설렘이 가라앉은 자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으로 채워진다. 내가 생각하는 기쁨은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줄기가 마음의 강을 따라 흐를 때 생겨나는 부드러운 일렁임’이다. 솟아났다 사라지는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강을 따라 길게 흘러가며 일렁일렁 마음의 솔기들을 간지럽히는 그런 감정. 고흐가 조카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에는 고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기쁨’이 담겨 있다. 강렬하게 휘몰아쳤던 자신만의 세계에서 한 걸음 벗어나 차분하고 서정적인 색채로 조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고흐의 ‘기쁨’을 보며, 글쓰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의 나를 응원한다.
* 글쓴이 - 김현정
제법 긴 시간 경제/경영 서적을 번역해 왔다. 책을 좋아해 공부도 내팽개치고 독서에 빠져 살던 학창 시절, 한 여성의 인생 여정을 그린 소설 <조개줍는 아이들>을 읽고 번역가의 꿈을 키웠다.
책이 좋아서 마흔 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고 나니, 이제 내 글도 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긴다.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을 향한 관심을 날실과 씨실처럼 엮어 브런치,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오래오래 글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블로그
브런치
오마이뉴스
링크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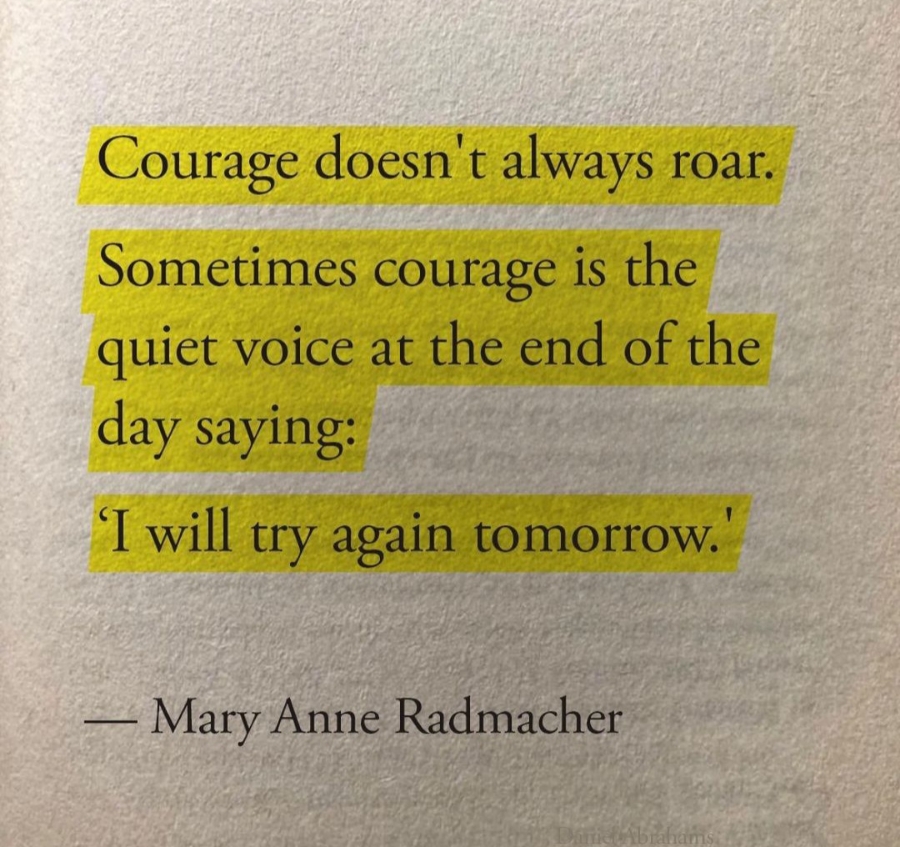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