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 나오는데 왜 콧물이 따라 나오는 걸까. 하나만 하자. 하나만. 코를 힘껏 풀다가 헛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었다. 울 때는 운다는 자각 없이. 웃을 때는 웃는다는 자각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 좋은데.
사람마다 울고 웃는 소리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또 그 소리가 달라진다. 그러고 보면 나는 대체로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울었던 것 같다. 솔직히 그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울 때가 허다하다. 내가 감정을 붙잡을 수 없는 만큼, 나조차도 감정에 붙잡히지 않은 채로. 슬픔에 못 이기든 분에 못 이기든 어떤 감정에 질 것 같을 때면 가장 큰 울음이 포텐처럼 터지곤 했다는 것만 생각난다.
여러 감정을 대할 때는 같은 경기 서로 다른 레인에서 달리는 사이처럼 굴면 좋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나희도(김태리 분)의 울음은 그 자체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뿌엥"의 대명사처럼 울고 짜고 해도 그렇게 싱그러울 수 있다니.
깔끔하게 감정에 져주는 마음으로 울어 버리면 오히려 개운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무언가를 보거나 누군가를 따라서 울다가 알 것 같은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누군가 울다가 웃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울다가 웃는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나눠가질 땐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영 한 가지가 안 되는 감정처럼 영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같아서. 그게 너무 자질구레해서 자신 없어 하다가도 체면 같은 거 모르고 여기저기 묻어나는 감정 같은 게 사랑이라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 사실 가장 좋은 사랑은 그냥 그 자체의 리듬을 타게 한다. 재작년 몇 달 동안 취미로 건반을 배우다가 노련한 연주에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듣게 된 몇 가지 말들은 인생의 격언으로 남았다.
"누구에게나 내재화된 리듬이 있어요. 그걸 그냥 타기만 하면 음악이 돼요."
무언가에 맞추려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리듬으로 만들어진 여러 음악을 들어볼 만한 음악이라 확신하는 것.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에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단한 것 이전에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싶다. 인간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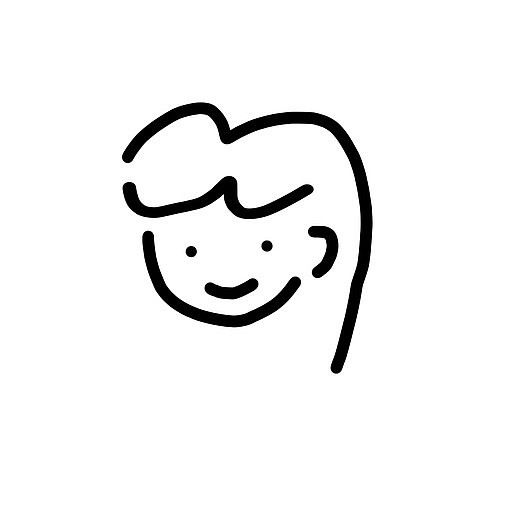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