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 기는 생각들로부터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자. 이를테면 날아가는 새나 기어가는 개미처럼 그것들을 대하기. 그 생각들이 너무 가까이 올 때마다 '새똥을 맞진 않겠지' 혹은 '내 발 아래 몇 마리의 개미가 죽어 나갔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참 자유롭다. 참 열심히다. 그 중간에 서서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 형체가 없는 상상과도 나 자신을 비교해 위축되거나 이 길에 끝은 있는 건지 궁금증이 증폭될 때도 그저 내 식대로 움직여볼 것을 스스로 권고하면서 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앞두고 공항에 놓인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는 사진을 담은 뉴스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완벽히 바이러스가 종식된 시기는 아니지만 정말 예전처럼 움직여도 되는 건인가 의문을 갖는 사이 거리엔 라일락이 한가득 피어 있었다. 아직은 꽃잎을 한아름 붙들고 서 있는 겹벚꽃 나무도 성큼성큼 지나 화창한 날씨에 산발로 자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한결 단정해진 머리 끝을 만지다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담장 너머의 멋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 수많은 잎사귀들. 때로는 꽃이나 열매들. 그렇게 무수한 손끝으로 나무 자신의 멋과 바람이 뜻하는 대로 공중과 지반을 수놓는 일이 참 좋아 보였다. 자리를 잡는다면, 저기 저 나무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던 새들이 그 나무에서 일제히 날아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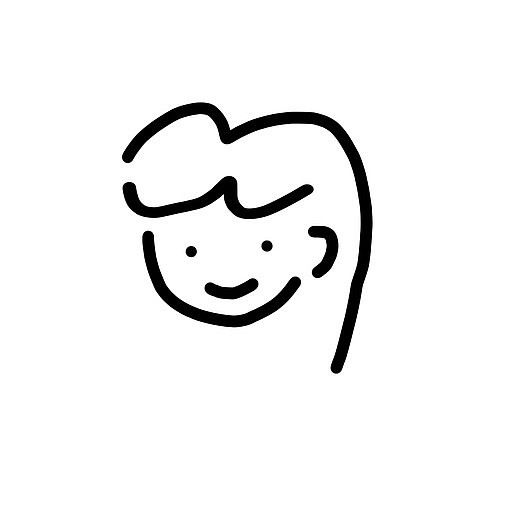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