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끝이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쓸 일인가. 과연 시간과 돈을 들일 만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잠시 거둘 수 있던 시간이었다. 제주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누운 풀들을 많이 봤다. 누군가 큰 손으로 쓰다듬은 듯한 오름에 올라 가르마처럼 잘 갈라진 넓고 좁은 길들을 내려보면서 나는 어떤 기판을 머릿속에 두고 납땜질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손깍지를 낀 듯한 모양의 구름 위로 뜬 붉고 둥근 해를 보았다. 그 해가 구름과 함께 하늘에 주홍빛으로 풀어지는 동안 운전대를 잡은 이와 들을 만한 노래를 골랐다. 그날 오전부터 안개가 짙게 깔린 송악산 둘레길을 걸었던 우리 앞에 다시 짙은 안개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앞을 나서야 앞이 더 보이는, 나와 내 발치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 더 광활한 풍경은 못 봤지만 그나마 덜 덥게 덜 탄 얼굴로 비를 안 맞고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제주에서 이제 다 졌다고 생각한 벚꽃이 조금 더 남아 있었다. 조금 더 세찬 비를 맞으면 제주와 비슷한 속도로 꽃이 질까. "서울에서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서울로 돌아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흘러나오던 대사를 듣고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나직이 대답하며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을 보냈다. 잠시나마 서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마음을 상기해봤다. 그때의 서울은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돌아왔다.
여전히 무엇을 하기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곳인지. 나는 내가 어디에서든 잘 살아갈 존재라고 믿고 있는지. 돌아오자마자 너무 많은 의심을 했는지 젖은 솜처럼 몸과 마음이 도로 무거워졌다. 그렇지만 적당한 햇볕 아래에서 키우고 싶은 씨앗을 올려두고 있으면 언제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오늘도 몇 달 뒤의 약속을 잡으며 살아 있는 게 아닐지. 나도 나를 잘 몰라서 하는 여러 선택들이 어쨌든 뭐라도 해보라고 이곳에 다시 나를 데려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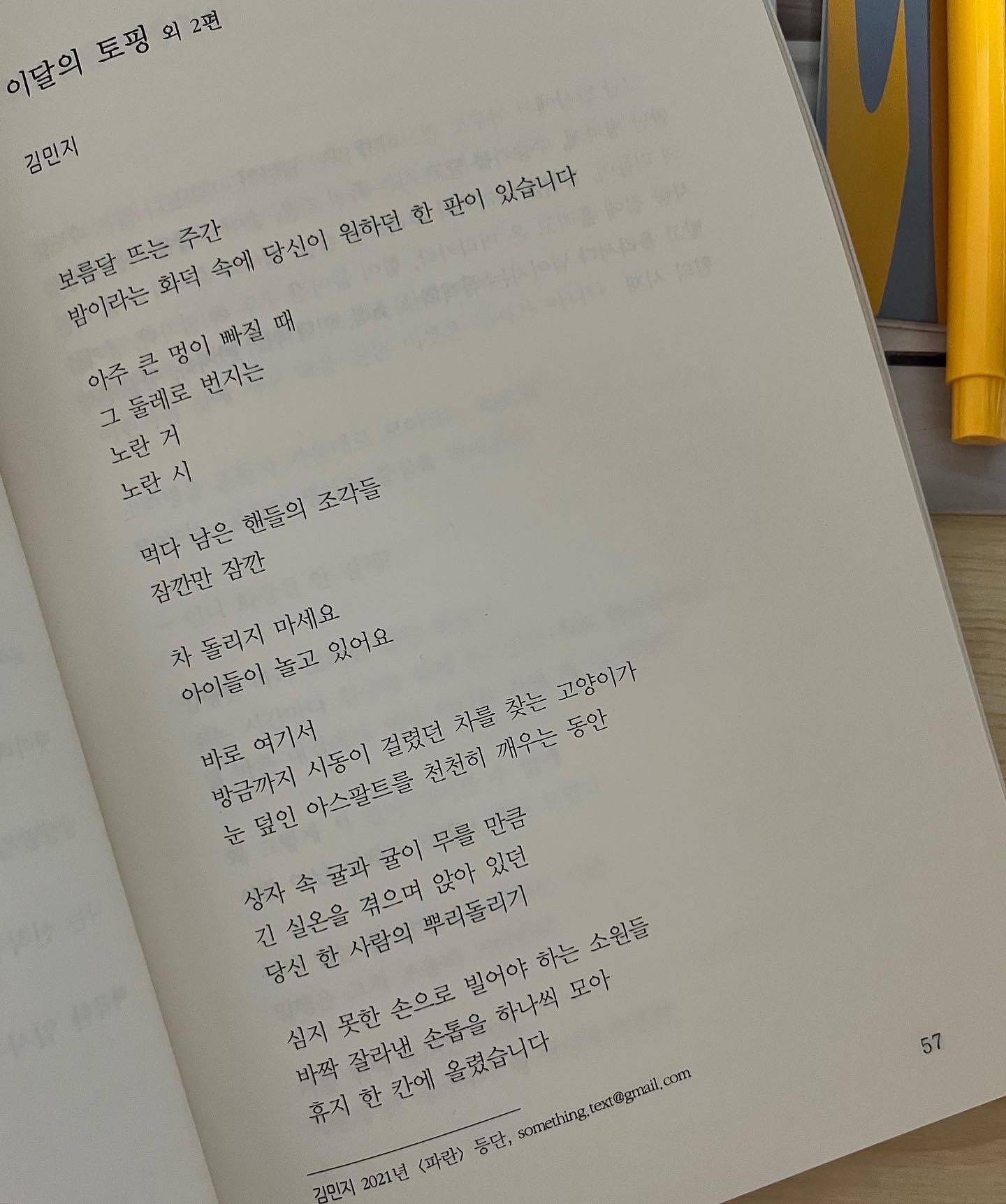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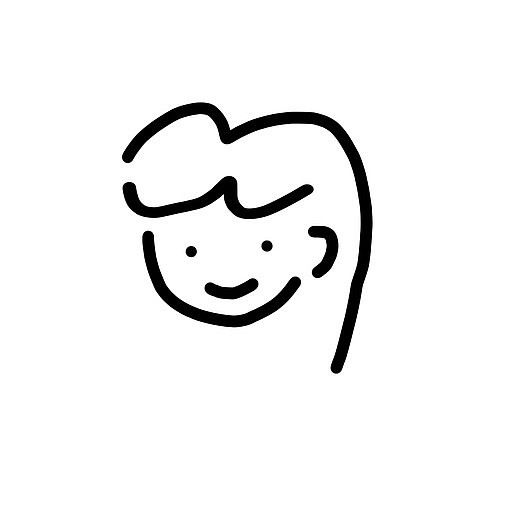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