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 전 퇴근길 지하철에서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업한테 업무일지 매일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야, 그거 뻔해. 다 쪼려고 시키는 거야.”
매일 적당한 분량으로 매일 다른 업무일지를 쓸 수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돈 받고 하는 일들. 대부분의 일이 업종, 직종, 직무에 따라 명확한 명칭이 붙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얇은 실을 뽑는 일. 아주 얇은 실들을 꼬아 다시 하나의 실을 만드는 일. 가닥을 잡는 일. 두르는 일. 매듭을 짓는 일. 리본을 매는 일. 엉키거나 끊어진 데를 살피는 일. 엉킨 것을 풀어내는 일. 끊어진 것을 잇는 일. 적당히 끊어내는 일. 다음을 생각해서 뭉쳐 두는 일. 색을 넣는 일. 패턴을 짜는 일…
원사에서 원단까지.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스펙트럼 안에만 놓고 보면 참 유연하고 촘촘하고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걸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12년 전 읽었던 최진영 첫 소설집 『팽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얼마전 개정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시 꺼내 두었던 초판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 유독 마음에 남는 단편이 있었는데, 그 단편을 다시 읽으니 역시나 좋았습니다. 좋은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속을 훑어낸 듯한 꽉 막힌 전개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직 생각은 없지?
안이 묻는다.
……응, 아직. 근데 이직하기 전에 잘릴지도 몰라.
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더 큰 회사에서도 만들기 시작했거든. 더 싼 값에 대량으로.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얕잡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얕잡아보는 그 일마저 뺏으려 해서.
이직해, 그럼.
………
내 말 들려?
싫어.
왜?
난 지금이 좋아.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큰 데 가도 더 큰 게 잡아먹을 텐데.
그럼 제일 큰 데로 가면 되지.
………
자신 없어?
………
어디든 도착하면 전화해.
내 침묵의 결을 하나하나 세던 안이 갑자기 주눅 든 목소리로 말을 맺더니 전화를 끊었다. 술집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길을 말없이 걷는다. 비틀거리는 사람. 토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꽁꽁 얼어버린 밤공기를 깨부수듯 깔깔깔깔 웃다가 나자빠지는 여자. 그리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지키고 싶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최진영 지음, 『팽이』, 창비, 2013, 74~75쪽
이 책에 실린 「어디쯤」의 나와 나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처지보다도 마음이 비슷해서 신기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같고 지키고 싶은 것이 같은 소설의 인물을 만나도 이렇게 기쁜데 현실에선 오죽할까요.
저는 요즘 일터에서 건물 복도와 화장실 청소를 해주시는 직원분과 안면을 튼 뒤로 가볍게 목인사를 하며 서로 지나는 잠깐의 순간이 참 좋습니다. 두 눈이 멀도록 모니터를 보다가 일어나 조용히 맡은 일을 하시는 건물 구석구석의 어른들 모습에 눈이 닿으면 수선한 마음도 침착해지더라고요.
아침 지각 위기의 순간 올라탄 택시에서도 그런 잠깐이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점잖은 목소리의 기사님께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릴 때가 기억나세요?”
긴밀한 관계에서의 일이나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니 기사님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후회하는 선택의 순간을 얼마 전 새벽 운동을 하며 떠올리셨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이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고요.
그리고는 지금 사신다는 동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언덕과 골목이 심한 옛날 주택이 많은 동네인데 자신한테는 그 동네가 정말로 좋다고요. 재개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운동하고 내려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네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아주머니들께 “무슨 얘기를 이야기를 예쁘게 나누십니까?” 하고 물으니 아주머니가 이제껏 열심히 키운 화분들 돌보기가 어려워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얘기에 공감이 가 어쩐지 눈물이 나셨다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시 한 편을 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덕분에 저 역시 요즘 내가 최근에 쓴 시들은 대체 무엇이고 그게 삶과 긴밀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첫 시집에서도 삶과 긴밀했던 시는 유독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조용하게 닿을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구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와 최진영 첫 소설집 『팽이』의 일부를 마저 옮깁니다.
나는 내가 방을 떠날 날을 헤아려보았다.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날이었다. 아무 균형도 규칙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품을 느끼며, 다시는 깨지 않을 사람처럼 잠을 자고, 잠을 잤다.
*
가끔 팽이를 돌렸다.
팽이는 열심히 돌다가도 멈출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 주저 없이 멈췄다.
최진영 지음, 『팽이』, 창비, 2013, 287쪽
표제작 「팽이」의 팽이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첫 시집 『잠든 사람과의 통화』에 가장 첫 번째로 실린 시가 「헤드룸」이고 마지막으로 실린 시가 「인부의 말」인지. 왜 무의식이 그렇게 배치했는지 모든 실마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연면적」에 등장하는 “흙밭 대신 화분들로 가득 꾸려 놓은 화단 앞”에 서 있는 누군가처럼 저 역시 언젠가 잘 키운 화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테니 지금 좀 어지러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님의 팽이살이도, 곁에 아끼는 화분들도 모두 안녕하시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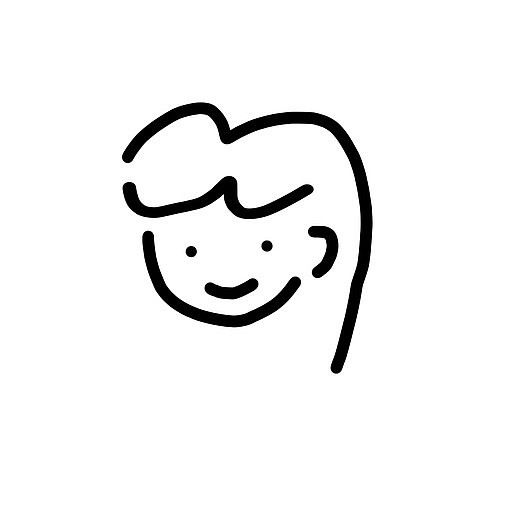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흑형진
오랜만에 뉴스레터에 댓글을 남깁니다. 저도 매일 업무일지를 쓰는 형편인데, 저는 업무일지 쓰는 일이 즐거워요. 짧은 몇줄 글이지만,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지를 계획하고, 그 일을 할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이거든요.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요! 저도 요즘 피곤하다는 핑계로 화분 몇 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요, 그럼 어떨까 싶습니다. 팽이도 멈추면 다시 돌리면 되는 걸요, 저도 이런 간단한 이치를 깨닫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팽이 돌리는 걸 사랑하는 일인 것을요.'
만물박사 김민지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