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나란히 하교하던 같은 반 친구가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평가에 부정적이었던 그 친구는 자주 자신을 뒤로 놓았다. 그 친구가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뭘까. 두려움일까. 겸손함일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두려움도 겸손함도 없는 것 같았다. 두려움도 겸손함도 없는데 대체 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걸까. 이유는 하나로 좁혀졌다. 구겨진 자존심. 그것 때문이다.
빳빳하지도 않고 유연하지 않은 자아는 스스로 풀을 먹이거나 다림질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미 그 자체로 마음의 실루엣과 겉돌기 때문이다. 물에 젖어 자신만의 생각에 갇힌 채 털리는 날이 허다해도 세탁기에 돌리고 늦게 꺼낸 빨래처럼 무겁고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상태. 그거였다.
경제적 여유가 많으면 건조기로, 심리적 여유가 많으면 손을 쓰고 볕이 내리는 곳을 찾아 회복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는 때에는 덜 펴지고 덜 마른 상태로 꿉꿉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외적으로 선망하는 대상이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 대상을 추종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잦아질 때. 그나마 유지해왔던 줄눈 같은 자존감에 분홍색 물때가 낀다는 것을 알았다. 오묘하게 형광빛이 감도는 분홍색 물때는 부러움과 게으름, 그 간격에 발린 치크 같이 빛난다.
오래전 그 말에 발끈했던 건 나도 구겨진 자존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부러움과 게으름을 새하얀 타일 삼아, 그것을 다시 원고지의 한 칸 한 칸으로 삼아, '우리'라는 단어를 써본다면 어떨까. 그 단어의 획은 참 신기하다. 원을 그렸다가 다시 가로세로 각자 갈 길을 가고 구불구불 길을 가다가 직선의 길을 걷는 느낌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오묘한 노선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한다.
세월이 지나도 구겨진 자존심으로 명명하는 우리는 싫다.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허전함으로 무례한 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각별해지라고 말한다. 나에게나 남에게나 '착붙'인 공동의 희망을 매력처럼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 만물박사 김민지의 뉴스레터는 구독자 여러분의 긴장성 두통, 과민성 방광 및 대장 증후군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텍스트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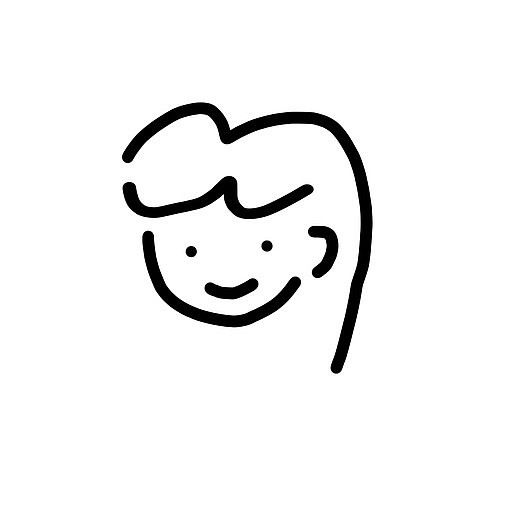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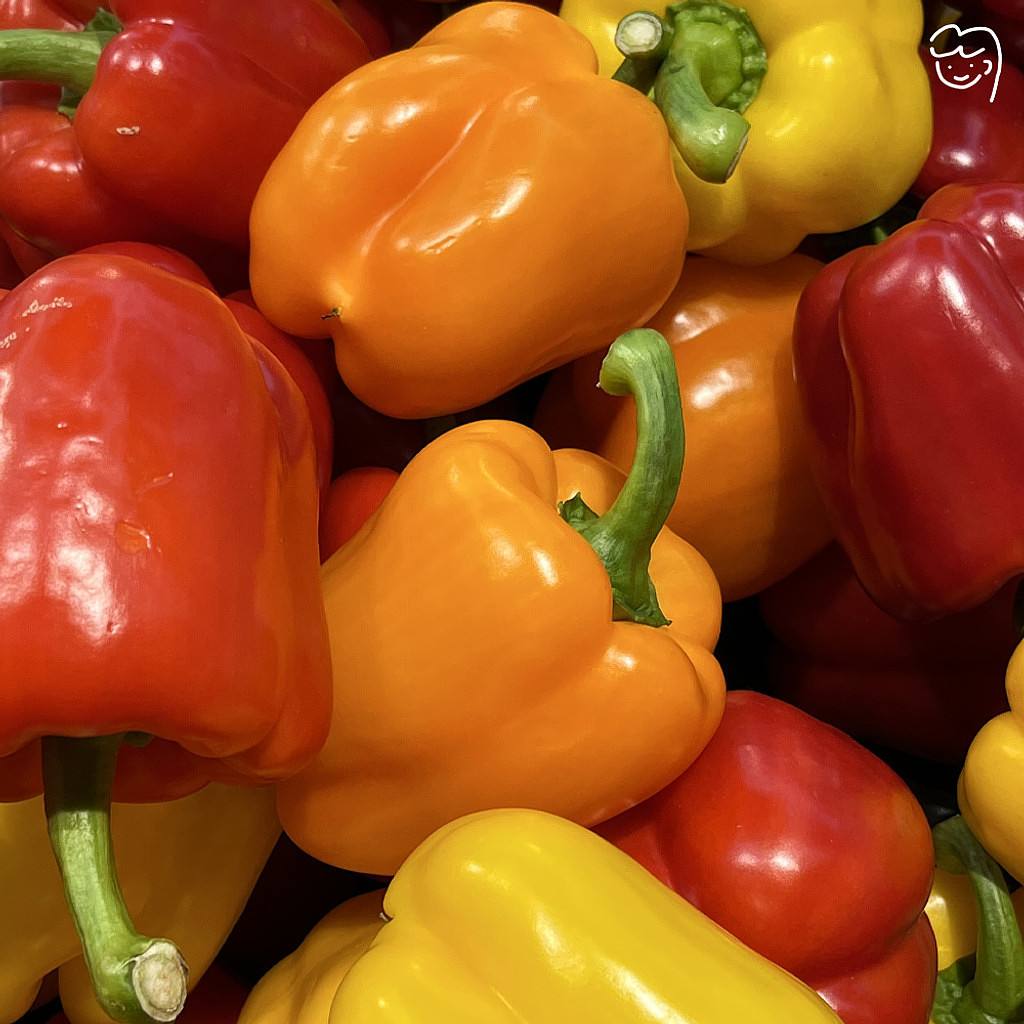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와니
'우리'라는 단어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물박사 김민지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