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는 과학일까. 손맛일까. 나는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다. 주부 9단처럼 요리하는 손끝이 야무진 것도 아니어서 오직 감을 따라 움직이며 숙련 중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기응변으로 수습한다.
여러 요리 가운데 가정식이라 불리는 음식을 완성하는 데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편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를 할 때는 레시피를 찾아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레시피에 언급된 모든 재료를 100% 가지고 있을 리 없다. 대체할 만한 재료를 집에서 구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림꾼의 덕목이기에 대부분 주어진 제약이 있지만 자유롭게, 근사하지 않지만 근사치의 요리를 클리어한다.
파를 썰 때 송송송 소리가 나고 두부가 네모반듯하게 썰리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면 한 대접 정도 데워진 마음을 안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하고 싶은 날도 있다. 설거지로 쌓일 그릇 수에 겁이 날 만큼 많은 음식을 해봤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 그런대로 편리한 일상을 지낸다. 일이 너무 고단한 날엔 편의점에 들러서 대충 끼니 때울 것들을 사서 집에 도착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킨다.
다 아는 맛이지만 왜 직접 요리를 했을 때는 그 든든함이 오래가는 걸까.
모든 과정을 겪어 낸 요리, 있는 힘껏 끌어올렸다가 적당히 휴지해서 얻은 음식의 온도를 사랑한다. 한 꼬집 두 꼬집 세며 넣은 소금처럼 잔잔히 눈이 내리던 밤. 설 연휴 막바지에 남은 식재료를 챙겨서 서울로 돌아왔다.
올해는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먹게 될까. 어떤 요리를 많이 하게 될까. 푹 끓여야 맛이 깊어진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이 있다. 생일날 먹게 되는 미역국같이 녹는 맛이 일품인 음식들. 올해는 그런 음식이 익고 또 익는 과정처럼 지내보려고 한다. 다 아는 맛이지만 품이 많이 드는 일상을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 만물박사 김민지의 뉴스레터는 구독자 여러분의 긴장성 두통, 과민성 방광 및 대장 증후군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텍스트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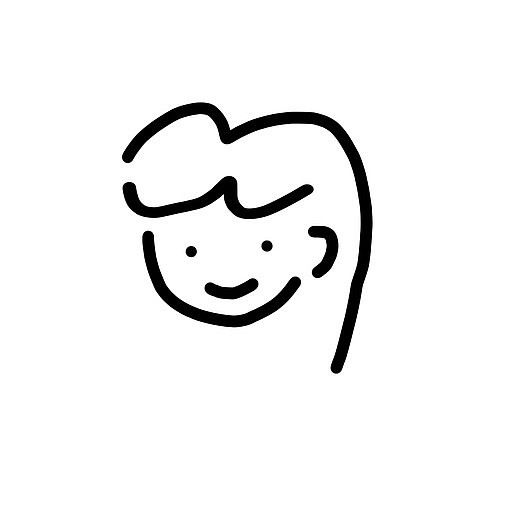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