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지나왔다. 오늘은 농구대 바로 밑에서 드리블을 연습 중인 한 아주머니와 맞은편에 서 있는 내 또래의 여자를 봤다. 낮은 높이로 천천히 반복하며 튀어 오르는 농구공 소리에 저절로 시선이 머물렀다. 이렇게 추운 날. 엄마와 딸인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적당한 길이로 끊은 끈 하나를 들고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적당한 곳에 셔틀콕을 매달던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딸! 배드민턴 치자."
하필이면 이렇게 더운 날.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도리질을 하는 나를 보고는 한 번 더 이야기했다.
"그럼 엄마 치는 것 좀 볼래?"
라켓을 집어 든 엄마는 귀엽고 열정적이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내려가면 엄마는 세 가지 라켓 중 하나를 골라 잡으며 동네 아이처럼 외친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홀로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일어나 산책을 할 때도 있지만, 짝이 있어야 더 재미있는 운동도구들을 사서 집 안에 비치해 두는 사람. 엄마를 따라서 그날도 옥상에 올라갔다.
이쯤 되는 높이라면 아마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겁이 나서 몸부림을 치며 떨어지다가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거야. 확실하게 사는 방법도, 확실하게 죽는 방법도, 알지만, 알아서, 모든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되는 대로 지내보는 것이다.
처음 이 단지에 도착했던 그날에 엄마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 시절 손을 흔드는 아빠의 모습만큼이나 선명하지만 되도록 작게 굴려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게 있었다. 그건 내 것이기도 했지만, 엄마의 것이기도 해서 우리는 서로 그 어떤 오픈런 연극보다도 열심히 일정 대본을 충실하게 외우고 살았던 걸까.
너무 쨍한 하늘. 챙이 넓은 모자를 나눠 쓰고 우리는 옥상에 나란히 서서 저 먼 곳을 바라봤다. 그다지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다지 많고 빠른 발전이 없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각자 자물쇠로 버틸 수 있었다.
이윽고 허공을 힘차게 낚시하듯 라켓을 휘두르기 시작한 엄마. 그런 엄마에게 아빠 이야기를 하지 못한 지 몇 년째인가 속으로 헤아리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그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웃으며 꿋꿋하게 손에 든 라켓에 리듬을 싣는 엄마에게 그날도 아빠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지키고 싶은 사랑이 연약해서, 연약하지만 밖을 겉도는 남은 사랑이 있어서, 자신을 있는 힘껏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 엄마 아빠 동생들 모두가 나처럼 나아질 것 없는 상황에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순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알아서, 모든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되는 대로 나를 지켜보는 생이다.

● 만물박사 김민지의 뉴스레터는 구독자 여러분의 긴장성 두통, 과민성 방광 및 대장 증후군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텍스트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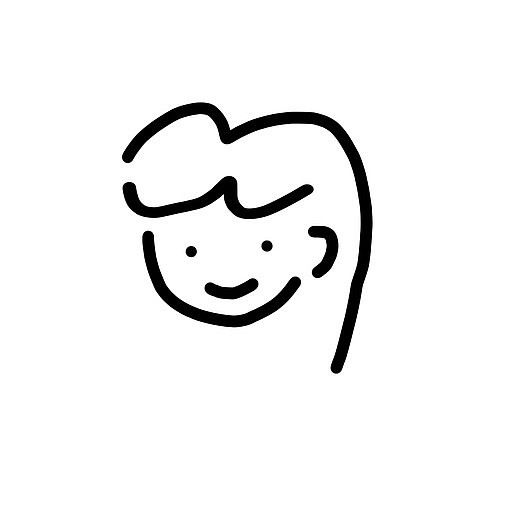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일기가성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만물박사 김민지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