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시 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자유로운 감각에 의지하는 것에 난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텍스트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교과서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읽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처럼 성글면서도 농익은 텍스트를 읽기 위해 필요한 공식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이죠.
시를 좋아하는 저도 시집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모든 시가 단번에 잘 읽힌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래 두고 볼 시집은 펼쳐 읽을 때마다 좋았던 소수의 시편들을 따로 강아지 귀를 접듯 상단 모서리를 세모로 접어 둘 뿐이죠. 읽는 회차를 더할 때마다 강아지 귀가 많아지는 시집. 그렇게 귀엽게 책배의 부피를 키우는 책장 속 시집을 볼 때면 무의식의 통로가 많아진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군요.
좋은 시를 읽으면 개인적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는 뜻모를 감정이나 골치 아픈 사건에 길을 하나 터 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가끔은 오래도록 몇 번이고 돌아와 머물고 싶은 집의 형태처럼 편안하거나 단정한 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잠결에 꾼 꿈 속에서 나 자신이 시공간을 무한정 쓰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을 부추기는 게 시인 듯해요.
시를 읽고 쓰는 데에는 별다른 묘수가 없습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저 '나'라는 현실을 양심껏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내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일과 관계를 풍경처럼 풀어 놓고 보는 연습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풍경 앞에 서서 기념할 만한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있거나 따로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순간순간들을 둘러보는 게 우선이 될 때 그럭저럭 읽히는 시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만남들이 무성하게 영글 때쯤 저도 첫 시집을 엮어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은 작년에 공개된 제 등단작 열 편 가운데 가장 오래 품고 있던 시 한 편을 레터 끝에 두고 갑니다. 읽다 보시면 요즘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우리 곁에 찾아오는 반가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기러기'나 '토마토'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인 '우영우'의 바람처럼. "오롯이 혼자 좌절"할 자유가 있는 상태로 제 인생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꼭 시를 읽고 쓰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풍경, 나와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호흡과 행간, 열거되거나 함축된 의미들을 읽어가는 그런 사람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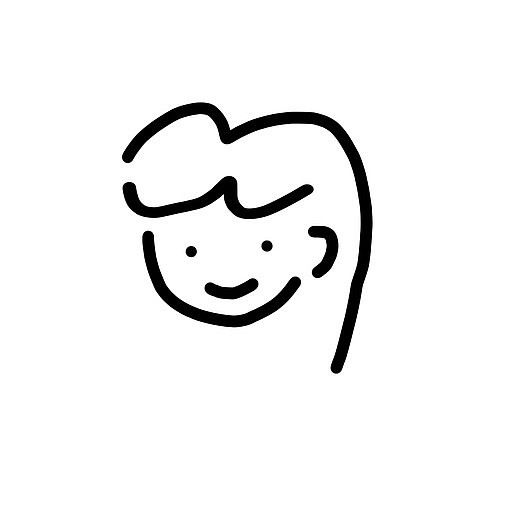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