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로스코의 그림 속 덩이와 덩이의 경계, 찢긴 한지의 테두리처럼 모호하지만 나뉘는 지점들. 그런 번짐들을 좋아한다. 잔뜩 번지는 것의 둘레를 꼼꼼히 다 잰다면 얼마나 긴 선이 나올까. 새롭게 쓰고 있는 시에 그런 번짐을 두고 머뭇거리는 중이다.
자꾸만 번지는 무언가의 둘레를 재는 헛수고를 평생 정성껏 반복하는 것이 시 쓰는 일 아닐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든다.
처음으로 시가 좋아졌던 순간은 우울이 번지던 성장기 때였다. 우울은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는 무력함에 찾아오는 것인데, 우울이 번지던 순간에도 내 몸은 한창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있었다는 게 감정의 커다란 궤가 되어주었다.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제 속에 난무하는 생각들이 어떤 근원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는 건 어쩌면 개인의 인생에서 큰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먹고사는 게 바쁘거나 그 자체로 안락하다는 인상을 주고받게 되는 가짜 휴식에 심취해서. 또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진대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갈피를 못 잡고 어떤 것들을 더 바쁘게 채워 그 시간을 빠져나간다.
그러다 불쑥 세상이 던지는 큰일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나 슬픔 등을 안기고 마는 일들에 걸려 넘어져 넘어진 김에 알게 된다. 최근 러닝타임만 보고 지루할 것 같아 은근히 미뤄 온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봤다. 몇 년 전 대학로에서도 보았던 연극 <바냐 아저씨>가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그렸다. 안톤 체호프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남겼을까.
어떻게 하면 길고 긴 낮과 오랜 밤들을 살아 나갈 수 있을까. 특별한 방도란 없다. 소냐의 말대로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참아내며 지금도, 늙은 후에도 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가 '번짐'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죽음일지 또 다른 분기의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실함을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너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발휘하고 사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밝고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마주할 유일한 대책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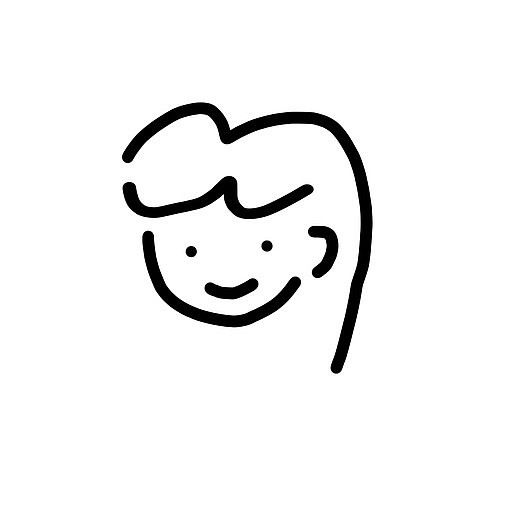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