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다. 매년 새해가 되고 3일쯤 지나면 드는 생각.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다짐한 것들을 이번 1년간 해낼 수 있나. 이런 질문은 다짐 전에 던져야 정석인데 매번 몇 발 늦다. 어쩌면 더 밍기적거리기 위한 묘수일 수도 있다. ‘새해는 설부터지!‘ 이번에는 더욱이 1월 1일이 주말에 놓여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발버둥친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무리한 마감과 그것을 쳐낸 보람에 취해 지냈다. 이곳 에이전시에서의 일도 다를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주정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 하면 저거. 저거 하면 그거. 이 정도 템포만 되어도 좋겠는데. 이거 하는 동시에 저거. 저거 하는 동시에 그거. 늘 이런 식의 속도전이다.
새해가 접어들기 무섭게 일하라고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고객사에서 RFP(제안 요청서)를 보내왔다. 쉴 틈 없이 상반기에 일을 몰아 해내는 일정이다. 1월을 보름 정도 넘긴 시점. 그날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하는 평일을 살고 있다.
내가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을 축약하면 기획. 압축된 말을 풀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온다. 웹, 디지털, 콘텐츠, 기획편집, UX, 카피라이팅, 브랜딩, PM 등등 많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해낸 업무의 결과물을 꺼내 보인다 한들 그건 그냥 고객의 것일 뿐이다.
“아니지, 그건 너의 일이기도 하지”라는 말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업무 환경 속에서 기계적으로 내뱉는 말과 자꾸만 고착화되는 행동양식을 지우는 딴 생각. 그럼에도 상사나 고객에 요청에 의해 떨어지는 자신감을 채워주는 딴 생각. 이런 환경에서도 철학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보기로 했다.
오늘날 구현 가능한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의 특징에 빗대어 나는 어떤 유형의 인재인지 고민해보기.
반응형 웹이란 창을 줄이거나 늘릴 때 알아서 착착 정해진 배열에 따라 그 높이와 폭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적응형 웹이란 그렇게 척척 반응되긴 힘든 것이다. 대신 적응형 웹은 기획자의 역량과 디바이스에 따라 공예를 하듯이 시각적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수가 좀 많이 들긴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적응형에 비해 쉬워 보일 뿐이다. 웹과 모바일로 나누지 않고 링크 하나를 쓰는 반응형 웹은 여러모로 공유도 쉽고, 콘텐츠나 트래픽 관리에도 유리하다. 비교적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중 어떤 유형에 가까운 인재인가.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닌 것 같다. 웹으로 구현되기 이전의 어느 기획자 스토리보드 위를 맴도는 마우스 커서가 나인 것 같다.
어느 일을 할 때나 기획력이 바탕이 되어야 좋다. 그렇지만 기획력이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조와 개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에. 나는 오늘도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구조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형국이라 힘든 게 아닐까.
이 고충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 퇴사가 답일까. 이번만큼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지 않다. 조금씩 달라지는 웹 환경에 맞춰 리뉴얼이 필요한 페이지처럼 이 연재를 통해 인생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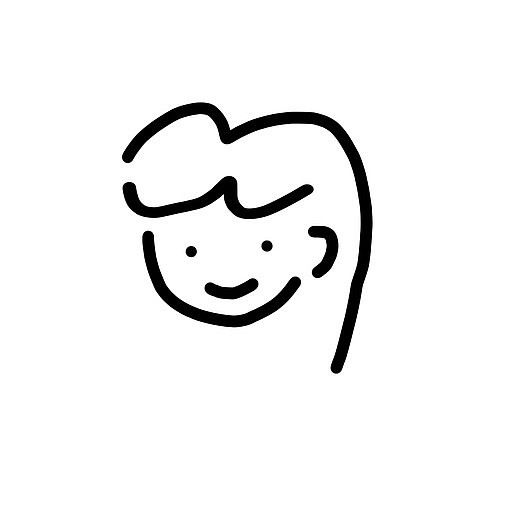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