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여행을 왔다. 서울과 제주. 서울에선 차로 이동하면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은데 제주에선 차로 이동해야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두 다리와 대중교통에 의지한 채로 국내여행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 내려와서 나흘째 버스를 기다리고 걷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가볍게 걷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을 어느 틈에 어디에 보관할 수 있나 고민하는 것도 아주 잠깐의 일상이 됐다. 잃어버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짐을 꾸리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잃어버린 것이 없나 체크하게 된다. 그래도 한껏 잃어버리길 기도했던 마음의 짐은 진공 포장을 하거나 처분한 채로 돌아오려고 애쓴다. 이번 여행에서는 불현듯 손에 힘이 풀려 뭔가를 하나둘 놓치고 있다. 핸드폰을 놓쳐 후면 카메라 렌즈가 박살났으며, 돌계단에서 캐리어를 놓쳐 기스를 한아름 얻게 됐다. 어제는 필름 카메라마저 놓쳐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반쯤 찍은 필름의 일부가 햇빛에 활짝 노출되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신기하게도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그 순간 식은땀이 나기도 했고 정말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했다. 워낙 바람 많이 불기로 소문난 제주라도 머릿속 지루함에 두 다리가 물들어 움직일 땐 그저 덥기만 했다. 전전긍긍하던 모든 것. 마음 깊이 자리하던 강박을 뿌리 뽑듯이 여행지에서 반복된 놓침을 겪어내고 있다. 한 밤 한 밤 잠들기 전 씻고 나와 누워서 아껴 먹는 반찬마냥 몇몇 생각을 건드리다가 쌀밥의 양을 살피는 사람처럼 군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아는 맛. 그러나 씹을수록 달게 느껴지는 빤한 맛의 소중함을 헤아리는 일이 어느덧 모든 여행의 공통 코스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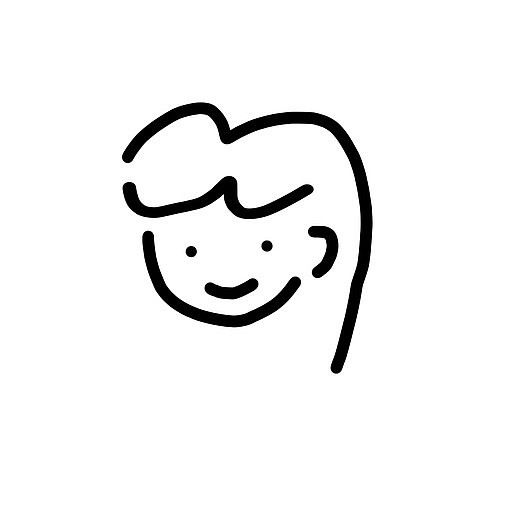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