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과 회고와 < 이름 >

🎧 다린 - 제목 없는 곡
우리가 함께 갔던 카페의 이름을 아직 나는 모른다. 그렇게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 그날 길에서 본 꽃, 벽에 그려진 낙서, 기차 밖으로 지나가던 풍경, 앞서가는 강아지, 언젠가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친구. 그렇게 이름 모르고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이 있다. 사실 이름이란 상대적인 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에 사는 고기를 ‘물고기’라 표하는 것이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땅고기’인 셈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단지 한쪽의 편리함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인간에게는 명명한다는 것이 소중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풍습 같은 걸 테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자식의 이름을 둘째인 나를 위해 처음 지었다. 첫째인 오빠의 이름은 꿈에서 점지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밤을 새워가며 성명학을 공부했고 한자의 획수와 뜻을 고려해 결국 닦을 수(修)에 빛날 빈(斌)이라는 이름을 지어냈다. 그덕에 이름 풀이를 하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아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하곤 했지. 내가 내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이보다 예쁜 이름은 못 만들 거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몇 없는 성씨를 가진 나는 통성명을 할 때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다. “ 이름이 예쁘네요. “, “ 호 씨가 있어요? 저 처음 들어요 ”, ‘유명한 사람 중에 호 씨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름과 성이 붙어 ‘호수’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인지, 내 이름을 곧잘 기억해 주시고 어떤 작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아주 좋아하는 이름이지만, 초등학생 때는 일산의 명소인 ‘호수 공원’ 때문에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고, ‘호호 할머니’, ’호빵’, ‘호수찬’, ‘호수빈라덴’ 등 내 이름은 별명을 만들기에 제격이었다. 버젓한 이름을 두고 놀리기 위한 다른 것으로 불리는 게 그 시절엔 눈물이 날정도로 싫었고 이런 성씨를 준 아빠를 원망했던 적 많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이 내게 준 것 중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수빈’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동명인을 스무 명 아니 서른 명은 만났다. 다른 성의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반에 세 명씩은 꼭 있었고, 중성적인 이름이다 보니 남자고 여자고 흔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까? 구독자님 주변의 또 다른 ‘수빈’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와 비슷한 이름을 떠올리다, 문득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이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 우리 둘의 이름이 비슷해 대답을 동시에 하면서 처음 마주했지. 그 후로 우리는 중학교도 같이 나오고 몇번 더 같은 반이 됐다. 친구는 매일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교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곤 했는데, 책상을 하도 내려쳐서 끼고 다니던 반지가 납작해질 정도였다. 키가 나보다 컸고, 하얬고, 눈물 흘리는 얼굴이 그려지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여렸던 것도 같고. 그림을 곧잘 그리는 왼손잡이였다. 떠오르는 단상들이 무색하게도 이제는 이름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참 이상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기억하는 게 있다. 그러자, 나와 같이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빈’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를 빈이라 부르겠다.
올해로 빈이가 별이 된 지 십 년이 지났다. 이름 모르고 흘려보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저 멀리 먼지 쌓인 네 얼굴이 피어올랐다. 빈이는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궁금해하겠지만, 애써 명명하지않고 남겨 두려 한다. 잠이 안 오는 날이면 네 이름 세 글자를 별에 기대 발음해 보며 오래도록 성황을 이룰 작명소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딸려 오는 네 환한 웃음을 천장에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궁금한 이름을 엎지르겠다.* 그리고 훗날 너를 다시 만나면, 내 이름을 기억하느냐 물어봐야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분명 너는 내 이름을 이쁘다고 하겠지.

*박준, 여름에 부르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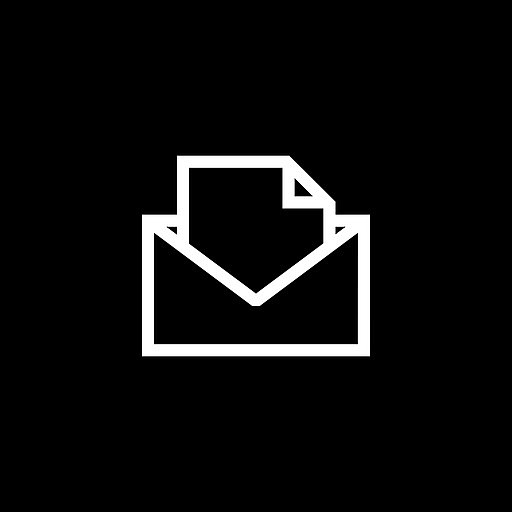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김화랑의 생생 월드 쏙쏙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22f414c55e1e9a0653051d7e825f3b341654265166)
![[금요시음회] 매정한 취향수집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jje5tpsjokorxi6x3efxfhtn5hhs)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