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과 회고와 < 달 >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 환한 달이 떠오르고 /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는 꼭 달을 기념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달이 차고 기우는 속도를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노라고 오래전부터 염원했다. 비단 달이라는 천체에 국한되는 바람은 아니다. 그저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자세가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사실 그게 내가 오직 바라는 전부일 뿐인데, 언제나 그 소원에는 ‘감히’라는 부사가 뒤따른다.
시인은 ‘달의 뒤편으로 사라진 사람을 위로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나에겐 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들을 잊을 힘이 없다. 외려 애도하고 있다. ‘한 줌 재가 된 세계를 추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그걸 잊는다면 나는 여기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평생 달의 뒤편을 보지 못할 테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의 원(願)을 이룬다.
누군가 나에게 ‘달’이 어떤 원(願)이냐 묻는다면 출처 잃은 마음들을 맡겨놓은 전당포라고 하자.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그어야만 하듯이 나는 그러니까 매일 밤 달을 두리번거리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저당잡힌 기억들을 달래줘야 하니까. 때론 그 습관에 사로잡혀 한낮에도 머리 위를 샅샅이 뒤져보고 나서야 제 할일을 다 한 것 같을 때가 있다.
실패한 사랑이 다 뒤편에 있다. 부치고 후회한 말들도 그리 도착해있고,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도 거기 초승달처럼 모로 누워있다. 달이 차는 날에는 오한처럼 어떤 얼굴이 벌벌 생각나기도 한다. 태어나기 전의 비밀도 거기 앉아있고 나를 온통 울게 하는 것들은 죄다 달에 가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슬퍼하란 대로 계속 쪼그려 앉아 우는 일이나 한다. 하루쯤 거른 날이면 그 거대한 시선*에 연신 사과하느라 바쁘다. 달을 목적지 삼은 마음의 무덤을 지켜야만 하므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 불행을 향해서 견딘 날들과 그 밤에 빈 기도들이다.
어쩐지 달빛 아래선 우는 낯도 제법 그럴싸할 수 있다. 비난받는 꿈을 꾸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 삼을 수 있다. 훌쩍이는 소리를 지저귐 삼아 달은 그렇게 나의 모든 상념을 제 뒤에 가져다 둔다. 그리고 자전과 공전주기를 같게 해 죽을 때까지 같은 면만을 드러내주는 것이 참 믿음직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고갤 들어 보라는 달은 단지 그 앞면 뿐이다.
그리하여 내가 달로 오라 함은, 달은 사념은 감추고 정념만 발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과 이 밤의 근사함과 홀로 남은 깨달음도 함께 비추기 때문이다. 그날의 달뜬 광경이 거기 펼쳐지기 때문이다. 달의 관점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제 발아래 우리를 묶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이 뜨면 생각나는 사람 있고 당신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을 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라 한 달을 상상하면서 이 밤이 다 가는 것이다.
친구가 오늘 달이 이쁘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구독자님이 있는 곳에서 보는 달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다. 그리고 당신 가슴속에 환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다. 창문을 열어 크게 올려다보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달을 찾겠다며 이 밤을 몇 보 걷고 와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영영 서로의 뒤편을 모르고서 그저 지금 뜬 달을 기념하는데 흠뻑 빠졌으면 좋겠다.
다시 견디기 힘든 달이 뜬다. 다시 아문 데가 벌어진다. 이렇게 한 계절 더 피 흘려도 좋다.**

* 월인천강, 이장욱
** 새벽에 들은 노래 3, 한강
🎧 설 - 내 옆
나는 밤을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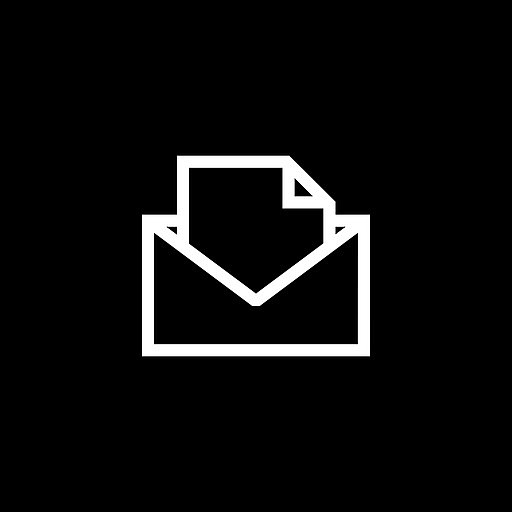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김화랑의 생생 월드 쏙쏙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c70dd47e25cd718750de63a5d20683ad1649426768)
![[금요시음회] 매정한 취향수집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d7c9494f1db2cd1e9db9a3099b7b43c81650031325)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