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좋아한다. 그 탁 트인 광경이 좋다. 바다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의 한 대목이다.
“바다라는 것은 좋은 거군요.”
“그래,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아마 넓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만일 저쪽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저쪽에 세이유 쇼핑센터가 있고, 저쪽에 파친코 가게가 있고, 또 저쪽에 요시카와 전당포 광고판이 있다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건 참 좋은 거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공감한다.
스무 살 무렵 친구와 제주도에 처음 간 적이 있다. 물론 수학여행 때 제주도에 가보긴 했지만 나의 의지로 가본 적은 처음이었다. 처음 제주도 중문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바다에 몸을 던져 넣었다. 말 그대로 바다에 도착하자마자였다. 4월의 제주 바다는 아직 차가웠다. 푸르고 어딘가 조금은 탁한 하늘 아래로 차가운 바다가 온 몸에 느껴졌다. 나는 청바지에 검정색 민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물속을 이리저리 누볐다. 하늘을 바라보며 바닷물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출렁거렸다. 조금이지만 자유롭다고 느꼈다. 그 때 바다는 유난히 더 넓고 아름다워 보였다. 자유의 상징 같기도 했다. 물론 그 이후에 도무지 이뤄지지 않는 사랑에 몸살을 앓으며, 바다 따위 커다란 지구라는 욕조에 갇힌 물에 불과하다고 쓰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니까.
바다를 좋아한다. 여전히 유효한 명제다. 흔히 산과 바다를 비교하는 고사도 있지만 난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좋아한다.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글쎄 역시 바다일까. 근데 산도 좋은데? 대서양을 처음 봤을 때도 잊을 수 없다. 포르투갈의 포르투에 갔을 때다. 대서양의 시작 포르투갈. 조용하고 잠잠했지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커다란 몸집을 흔들며 대륙을 향해 밀어닥쳐오던 바다. 희미하게 보이는 아주 먼 방파제에 부딪친 파도가 새하얀 포말을 하늘 높이까지 날려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주 먼 내 발 밑에 다가오는 파도는 미약하고 너무도 잔잔했다. 다음날 찾아간 해변엔 안개가 가득 껴 있었다. 나는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몇 몇 사람들의 등을 좇아 해변을 오래 걸었다. 해변 끝자락 쯤 카페가 하나 있었고 바다를 찾아온 사람들은 안개를 피해 대부분 거기에 모여 있었다. 나는 맥주를 시키고 서늘한 바닷가에 앉아 안개가 가득 낀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바다 이야기를 하면 역시 호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전에도 서술했듯 내가 살던 곳은 바닷가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나는 별일이 없으면 자주 비치타월을 들고 걸어 나가 바다에 뛰어들곤 했다. 때로는 밤바다에 나가 달빛 아래서 헤엄을 쳤다. 그 해 크리스마스 무렵 집에는 호주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호스트의 먼 곳에 사는 친척들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온 호스트의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와 머물렀기 때문에, 넓다곤 할 수 없는 2층 주택에 거의 스무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호스트의 친척 몇몇은 캠핑카를 가져와 마당에 주차해두고 거기에 생활했고 몇몇은 뒷마당에 텐트를 펴고 잤다. 며칠 같이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며 친해진 우리는 어느 날 밤 다 함께 해변으로 수영을 하러 나갔다. 달빛이 무척 아름다운 밤이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달빛이 찬란하던 바다를 누비며 허리까지 오는 달빛 바닷물을 가르며 우리는 고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 둘 집으로 돌아와 마시던 맥주를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잠에 들었다.
정동진 바다에서 일출을 지켜본 적도 있다. 청량리에서 열시 반 쯤 정동진을 향하는 기차를 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게 일출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르고도 늦은 기차였다. 기차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정동진역에 도착했고 나는 아침까지 일출을 기다리며 바닷가에 앉아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멀리서 보랏빛으로 움트던 하늘을 기억한다. 그 작고 아름다운 바다.
헬싱키에서 출발해 스톡홀름까지 페리를 타고 발트 해를 건너던 기억도 선명하다. 배는 저녁 무렵 헬싱키에서 출발해 에스토니아의 탈린 항구를 거쳐 다음날 아침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내가 예약한 싸구려 침실은 커다란 페리 내에서 한겨울 차가운 발트 해의 수면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차들이 가득 실려 있던 페리의 주차장보다도 아래층에 있었다. 불을 끄고 잠을 청하고 있으면 이따금씩 불길하고 기다란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새벽이 되자마자 방을 빠져나가 갑판으로 나갔다. 누군가 나와 같은 경로로 스웨덴에 가게 된다면 꼭 스톡홀름으로 진입하는 새벽에 갑판에 나가보길 바란다. 스톡홀름은 수백 개의 섬으로 이뤄져있고 배는 별처럼 수없이 많은 그 섬들 가운데를 유유히 통과한다. 그 섬들에 하나 둘 켜져 있는 작은 불빛들, 해안가와 해안 절벽을 따라 늘어서 있는 커다랗고 작은 주택들, 일출과 새벽녘의 고요. 도착하기도 전에 나를 감동시킨 도시는 스톡홀름이 유일하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언젠가 바닷가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막상 살아보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한다. 산도 좋지만 물에서 노는 일을 좋아하니까 역시 바닷가가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시끌벅적한 바닷가보다는 고요한 산이 좋다. 산이든 바다든 나는 언제나 기꺼이 고요를 택할 것이다.

오늘의 월드 뉴스는 멕시코의 한 바닷가에 대한 소식이다. 멕시코 서남부에 위치한 Puerto Marqués의 해변을 플랑크톤이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지 관광청은 플랑크톤 떼로 인한 생물화학적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광경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이다. 충분한 고요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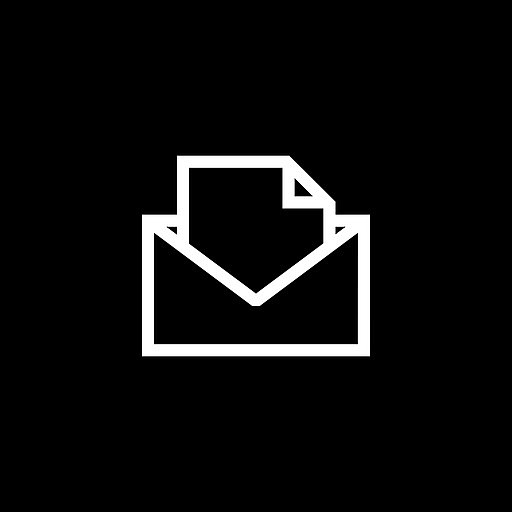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 호의 시와 음악과 회고와 < 바다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209/taste4friday/1662128724420861.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