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어선지 몇 년 전부터 꽃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키울 자신이 없어 집에 모시지는 못하지만 길을 걷다 문득 꽃을 보면 그저 좋고 그렇다. 식물에 대한 지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장미나 개나리 외의 꽃은 봐도 이름도 도통 모르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냥 기분이 좋다. 하기야 요새 꽃 이름 모르겠다고 하면 으레 인터넷에 검색해보란 말이 돌아올 것이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꽃의 학명부터 꽃말까지 줄줄 나오는 시대다. 이름 모를 들꽃 같은 말도 이제는 오래된 말이 되어가고 있다. 들꽃은 물론 모든 사물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있을 뿐.
이름만큼 쉬우면서 어려운 것도 없다. 이름의 존재야 단순하다지만 기억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접한 모든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이름 자체는 아주 쉽고 명료하지만 모든 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엔 수없이 많은 기억되지 못한 이름들이 남는다. 물론 그럼에도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다. 아주 오래전 홍수에 수몰된 마을처럼 세상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푸르고 깊은 기억의 강 아래 영원한 이름이 있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세상은 적막해진다. 몰아치던 바람이 멎고 세상은 돌연 안개로 가득 찬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 세상은 그 이름이 된다. 부르고 싶지 않아도 불러야 하고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한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는 세상 어디에나 있다. 길가의 꽃들도 멀리 날아가는 새들도 모두 그의 이름이 된다. 세상엔 이런 이름도 있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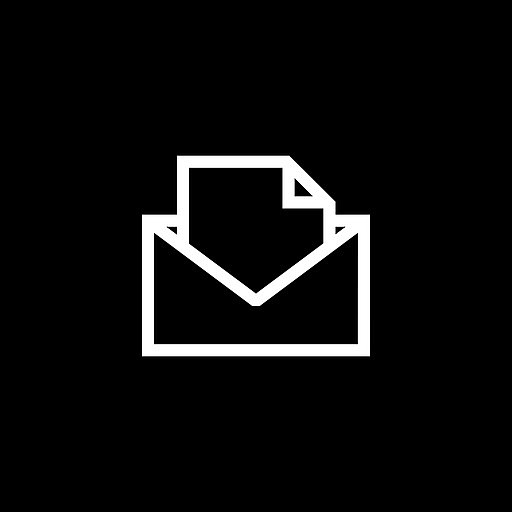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 호의 시와 음악과 회고와 < 질투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d96e75e16e3cb806a4c68e9eb1d57e801655474404)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스타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