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십대 초반의 일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대단할 것 없는 스무 살 대학생이 남들과 특별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인가 나는 패션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구제 헌 옷을 파는 구제옷집에 들락거리며 언제나 조금은 독특한 패션들을 고집했다. 구제를 즐겨 찾게 된 건 지갑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헌옷가게의 묘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누군가에게서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옷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곳이었다. 어쩌다 자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헌옷가게의 점원누나와 친해지고 나는 그곳을 자주 기웃거렸다. 스무살의 나는 한 쪽 눈썹에 피어싱을 하고 언젠가 한 번 버려진 낡은 티셔츠를 주워 입고, 때때로 옷가게 점원과 인센스를 피워두고 시시덕거리거나, 담배를 나눠 피우며 혹여나 그곳에 올지 모를 구원을 기다렸다. 나는 구원받고 싶었다. 가난과 부모님의 이혼과 수시로 찾아오는 자기연민들 따위들로부터. 지하에 위치한 그 가게 한 쪽 벽면에는 정말 말 그대로 온갖 색깔의 티셔츠들이 가득했다. 나도 그 옷들처럼 한 번쯤은 다시 구원받고 싶었다. 지금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당시의 나는 너무 어렸고, 나를 둘러싼 불행의 명확한 연유도 깨닫지 못한 채 매일이 절망스러웠다. 그 절망의 컬러는 가게를 가득 채운 티셔츠들의 색깔들보다 훨씬 다채로웠다. 적어도 당시의 내겐 그렇게 보였다.
가게 한 쪽에는 앞서 말한 색색의 티셔츠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다른 한 쪽엔 온갖 가죽 제품들과 악세사리들 그리고 다른 한 켠엔 모두들 눈빛을 반짝이며 들춰보지만 구매해 입어볼 용기는 나지 않는 커다란 점프슈트들과 여러 일본적인 문양과 자수로 가득한 스카잔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곳에 수시로 들러 가게의 커다란 스피커로 뮤즈와 더 후, 그린데이 따위를 듣거나 몇 번 입고 다시 내다버릴 티셔츠를 사고, 점원 누나와 우스갯소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나가거나 했다. 온통 무채색인 세상에서 그 옷가게만큼은 언제나 형형색색의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나의 절망은 구체적인 색깔을 가졌다. 물론 색깔을 띠는 것 말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같은 무게의 절망일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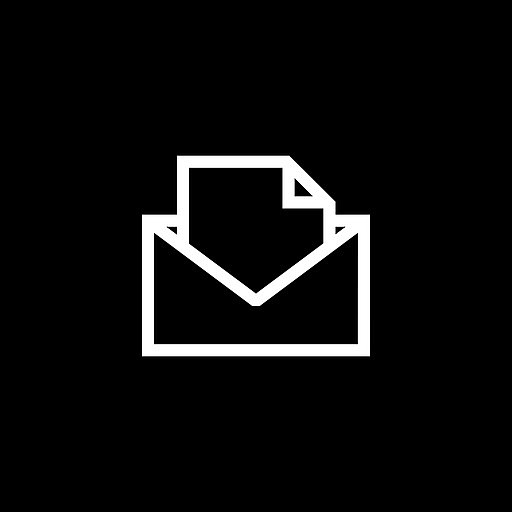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스타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