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살면서 질투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스쳐지나가는 질투 비슷한 감정들은 그래도 있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몇 번 없긴 하지만 질투라는 감정을 강력하게 실감한 순간은 있다. 호주에 머무를 때의 일이다. 나는 당시 어쩌다 연이 되어 멜버른 중심가와 한 시간 쯤 떨어진 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의 한 이탈리안 계 호주인 가정의 식객이 되었다. (식객이라곤 하지만 당연히 주마다 렌트 비용을 지불했다. 주당 120불로 기억한다. 작지 않은 방을 사용했으며 원하면 뭐든 꺼내 먹을 수 있고, 매끼 식사가 포함된 가격이었으므로, 호주 물가를 생각해보면 꽤나 저렴한 가격이었다.) 집은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가톨릭 캠프에 딸려 있는 단독주택으로, 도로 쪽으론 주차장 겸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도 널찍하게 있었을 뿐 아니라 커다란 가톨릭 캠프(전 세계 가톨릭 신도들이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 이곳에서 한 겨울의 여름캠프를 보낸다.)가 딸려있어 잔디밭 운동장도 있었고 행사를 위한 부대시설도 딸려 있었다. 집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빛으로,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2층 창문에 달려있는 강렬한 빨간색 블라인드가 집의 포인트라면 포인트였다.
<제 5 도살장>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커트 보네거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따위 사회에 살기엔 인간은 너무 훌륭하다.’라고. 맞는 비유인진 모르겠지만 ‘나 따위 인간이 살기엔 그 집은 너무 훌륭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에서 50미터 쯤 떨어진 그 집은 현관을 열고 1층을 들어서서 오른편으로 가면, 보통 그 집의 외동아들 션이 머물고 있는 작은 응접실이 나온다. 흰 색 회칠이 되어있는 둥글고 커다란 벽은 온통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커다란 선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그 집에 가 놀랐던 건 그 선반의 두 개 층을 빈틈없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진 앨범들이었다. 그 앨범 속에는 단란한 한 호주인 가정의 역사가 내밀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아들 션의 탄생부터 스무 살 무렵의 당시까지 그리고 존과 메리안의 처음부터 당시까지, 한 가족인 동시에 세 명의 다른 인간인 그들의 삶이 거기에 어울려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의 아름다움보다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그들의 환경과, 여유와 그들의 마음과, 그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 강렬한 질투를 느꼈다. 그것은 분명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종류의 것이었다. 참으로 다행히도 나는 그 질투의 감정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소모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다만 그 질투의 감정을 그 목표를 위한 연료처럼 사용했다. 물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럴 듯 해보일 뿐, 그 이후로 수번의 사소한 악행과 실수와 고뇌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어떻게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도 하고.
이번 주는 글을 쓰는 것보다 어떤 내용의 뉴스를 소개할지가 더 어려웠다. 검색을 아무리 해보아도 결혼생활의 질투나 연애, 치정으로 인한 살인 등의 무겁거나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의 질투에 대처하는 5가지 요령>이나 <관계에서 회고적인 질투 극복하기> 같은 정신분석적인 기사를 싣는 것도 내키지 않으니 이번 주의 뉴스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이런 시시한 글이나 쓰며 너무 쉽게 원고 글을 쓴다고 나를 질투해도 소용은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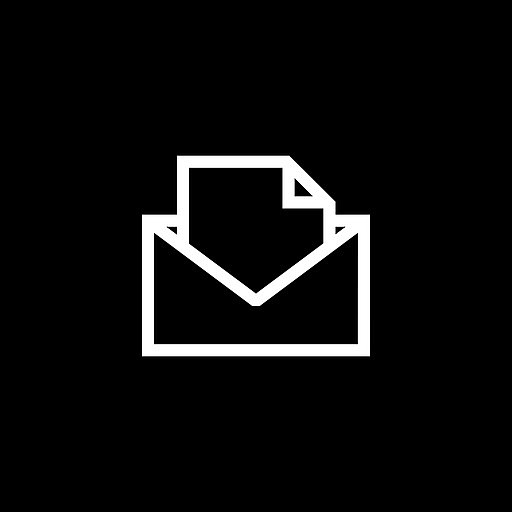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