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뭐든 자랑하는 걸 좋아했다. 뭐든 쉽게 자랑하고 으스대고 그랬다. 조금 재수 없는 타입 이었던 것 같다. 정정한다. 재수 없는 타입이었다. 여기에 대해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뭐,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고 할까. 도통 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할까. 언젠가 법정 스님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 대담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법정 스님 왈, “‘존재’는 그저 있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왜 사느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사느냐 해서 방법을 알면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왜 사느냐,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종착은 ‘자살’이다.” 맞는 말씀이다. 격하게 공감한다. 그러나 어쩌랴. 그때도 지금도 존재에 대한 생각을 도통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도 그때도 존재에 대한 생각을 지속한다는 점은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십대 초반엔 자랑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삶의 이유랄까. 이유를 찾았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자랑’이라도 하려고 살았다. 왜 살아야 되는 지 잘 몰랐거든. 물론 그렇다고 뭐 자랑할 만한 꺼리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원체 매사에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편이기도 하고 해서(엄마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냥 사소한 것부터 뭐든 자랑했다. 즉석복권에 당첨됐다든가, 같은 게임하는 친구에게 나는 운 좋게 좋은 아이템이 나왔다 뭐 이런 자랑부터, 또 그걸 넘어서서 아는 척, 잘난 척도 많이 일삼았다. 그게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며 자존감을 채우는 것보단 낫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사실 그저 비판인 척 하며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도 잦았다. 지금이야 보통 그런 대화를 하지 않지만 나의 ‘그 시절’을 잘 모르는 이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여하튼 자랑을 넘어서 심지어 잘난 척, 운 좋은 척, 온갖 척이란 척도 많이 하며 살았다. 그럼에도 다행히 주위에 친구들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날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싫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았던 게 의아할 정도다. 지금 생각해보면 날 싫어하지 않고 놀아주다니, 심성이 고운 애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인내심이 많은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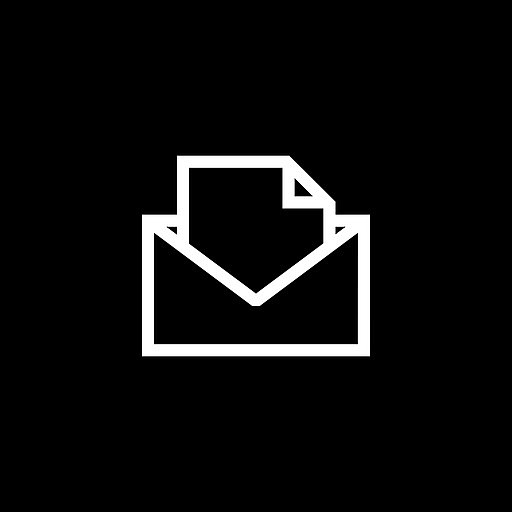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