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과 회고와 < 흔적 >
-

2022.02
내내 집에 있었다. 몸이 안 좋아 진통제를 먹는 날이면 건조함을 못 이겨 온몸에 오일을 발라야 한다. 어제는 드립 백 커피를 텀블러로 두잔 마셨더니 꼬박 아침 7시가 돼서야 잠들었다. 갈수록 몸은 낡고 어려워진다. 부모님은 내가 찬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어느 순간 유산균과 멀티비타민, 홍삼농축액, 눈에 좋은 약, 간에 좋은 약, 면역약,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같은 것들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대체로 그것들을 먹기 위해 끼니를 챙기는 날들을 살고있다.( 아침 빈속에 멀티비타민을 먹었다가 위경련이 크게 와서 하늘이 새하얘졌던 적 이후로 모든 약은 꼭 식후에 먹게 되었다. )
온종일 맥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필히 밖에 나가 운동을 하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외출 자체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밖엔 뭐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기 싫은 것도 봐야 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피하고 싶다. 공연을 본다거나,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외출이 제법 수월하겠지만, 전처럼 책이나 커피를 즐기기 위해 집 밖을 나가는 일이라면 질색이다. 보고 싶은 이도 있고 보고 싶다는 이도 있지만 미안하게도 가능한 대부분의 사람이 실내에 있는 평일 오후 3시쯤에 외출하고 싶다. 날이 좀 더 따뜻해진다면 이 기분들도 나아지려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고 쓰는 일에는 제법 익숙해져서 단지 책상에 앉을 용기만 내면 곧잘 마감을 맞추게 되었다. 그래서 회가 거듭할수록 근황을 빙자한 TMI를 길게 늘어놓게된다. 구독자님을 매주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몇몇 친구는 뉴스레터를 통해 내 근황을 확인하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이 글이 나에겐 안부 문자 비슷한 것이겠다.

이사 준비로 책장 정리를 하다가 수학의 정석 사이에서 예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팔랑- 하고 떨어졌다.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잠깐 누구였는지 고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십 년도 더 된, 학창 시절에 만났던 아이였으니까.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며 뒷산의 그늘진 벤치에 앉아 바람에 따라 파도 소리를 내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한여름을 보냈다. 그때 마주 잡은 손의 축축함과 비 오는 날 그 친구가 신은 쪼리 신발, 함께 갔던 카페의 번 굽는 냄새 같은 것들이 그제야 떠올랐다. 우리가 하루씩 돌아가며 쓰던 교환일기를 나에게 건네주는 날이면 노트에 자신의 향수를 뿌려 돌려주고, 수련회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잘 나왔다며 구겨지지 않게 내 책 사이에 껴주던 일처럼 걔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었다.
오늘의 주제는 < 흔적 >이다. 문득 흔적과 기억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고민했다. 아마도 ‘흔적’이란 실체가 있는 자국이고, 기억이란 ‘마음에 남는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억을 흔적을 통해 되짚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그것은 우연히 먼지 쌓인 구석에서 찾고 있던 귀걸이 한 짝을 발견한 것만 같다. 만약 안 좋은 것이 떠오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기회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앞으로 좋았던 기억만을 흔적으로 남기겠다 약속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으로 덮어둔 흔적들에 온기가 쌓여 그전만큼 차갑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젠가 준일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작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공연은 시작되고 이내 객석에서 들려오는 촬영음 소리가 본인과 관객들에게까지 방해되었을 테지. 곡을 마친 그는 정중히 부탁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단지 감상에 집중해 보셨으면 한다고. 어떤 기억은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오래 살아남는다고 했다. 설령 그것이 한 달, 일주일 심지어 공연장을 벗어나는 순간 잊히게 되더라도 그것대로 제 몫을 다 한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그 후 내 기억을 시험해 보는 마음으로 흔적 없는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이 분명 좋았다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아직 9년 전 아르떼홀에서 그가 나무 단상을 저벅저벅 걸어 나와 의자에 앉던 소리를 기억한다. 내내 고개 숙여 노래하다 처음 얼굴을 들었을 때 핀 조명에 비치던 눈물자국을 기억한다.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들었던 ‘기억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보다 좀 더 오래된 11년 전의 이야기다.

-
이영주
🎧 Ennio Morricone - Piano Solo
아마도 우리는 흔적을 남기겠다는 핑계로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는 무관한 것들을 자꾸만 쓸어 담는* 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병에담고 싶은 싶은 문장에 밑줄을 긋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마음 안에서 오래 살아남을 테고, 흔적이란 그 따뜻했던 밤으로 조금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걸. 그리고 흔적을 담을 병의 입구를 열고 닫는 일은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영주, 병 속의 편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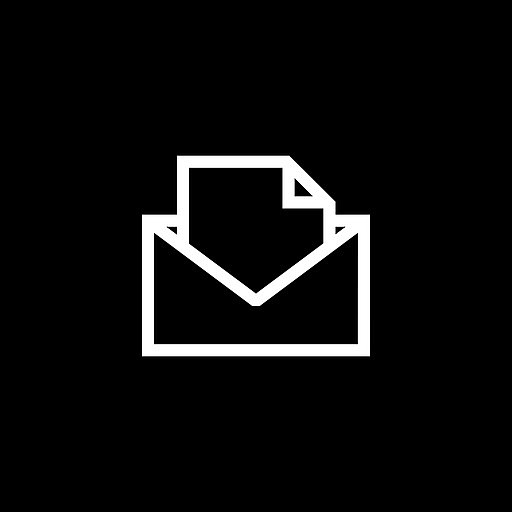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