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과 회고와 < 허기 >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부럽다. 맛집을 찾고, 최적의 루트를 짜고, 소위 ‘냉면은 어떤 젓가락을 써야 하고, 콩국수는 어떻게 먹어야 하고, 냉동 삼겹살은 어디가 근본이고, 이 음식엔 이 주류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인지’ 꿰고 있는 소신있는 먹잘알들의 열정 말이다. 식욕은 넘치나 입이 짧은 나는 항상 몇 입 못 먹고 수저를 내려놓기 때문에 사실상 먹는 것에 크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는 타입이라, 매 끼니 정직한 식사를 할 수는 없고 자주 배고파지기 때문에 매일 주전부리를 달고 산다.
어른이 되면 김치를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잘게 썰어 먹는다. 아버지는 종종 나에게 깨작거리지 말고 팍팍 먹으라고 한다. 나도 복스럽게 많이씩 잘 먹고 싶은데, 입안에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얼마 안가 질린단 말이야.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이 좋다.
X와 헤어지고 나서, 마주 앉아 밥을 맛있게 못 먹어준 일이 가장 미안했다. 관계에 있어서 함께 하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밥을 먹는 일’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비단 연인만이 아니라, 같이 점심을 먹는 직장 동료에게도 그렇고 모처럼 시간 내 맛집에서 모인 친구들에게도 계속 그렇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의 것이라’ 누가 말했다는데, 나에겐 좀 억울한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 닭발, 옥수수, 봉구스밥버거 더블치즈제육에 야채추가, 컵라면인데 사실 이게 몸에 좋은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몸이 자꾸 아픈거 같긴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의 나는 마라탕을 사먹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잔소리 해도 계속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 김므즈 - 맛집을 믿지 않아요 (미발표곡)
아ㅡ 맛집을 믿지 않아요
그대와 함께 요리를 할래요
함께 식탁에 마주 앉으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겠어요
서러웠던 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잠들지 않을 수 있는 건
사은 그가 먹는 바의 것이라
누가 했던가
나는 네가 너는 내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네
아침 밥상 사랑
점심 밥상 사랑
저녁 밥상 사랑
먹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지 않아서 나에게 식사는 영양분 섭취를 위한 ‘끼니 때움’의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항상 영상을 틀어놓거나 누군가 앞에 같이 앉아있어줬으면 하는 꽤 귀찮은 버릇이 있다.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카페에 가 책을 읽곤 했다. 만약 친구를 만났는데 밥을 이미 먹었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밥 먹는 거 구경해라!’고 할 정도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유독 외롭게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며칠 전 예상보다 빠른 퇴근에 맥주 한 잔이 고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사람은 이미 일산이고, 한 사람은 제주도에 학회를 가있었으며, 한 사람은 대학원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다. 세 명의 친구에게 퇴짜를 맞고, 다른 친구들에게 ‘퇴근 후 맥주 한잔할 사람이 없다’ 하소연하니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답 들었다. 같이 밥이든 술이든 먹어줄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은 배우자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결론인 거다. 나는 문득 최승자 시인의 「 어느 날 나는 」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이 시에 대해 시인 유진목은 이런 말 했다. “어느 날 죽게 되면 내가 먹은 그 밥이 마지막 밥이었다는 것을 죽게 되는 순간에만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끼니를 먹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받아들이고 싶게 한 시였어요.”
만약 내 삶의 마지막 식사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컵 누들로 대충 때운 끼니였다면? 너무 쓸쓸할 것 같다. 유진목 시인의 말처럼 최선을 다해 끼니를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다. 매 식사를 최후의 만찬처럼 여기면 밥 먹는 일이 숭고해진다. 비로소 그간 식탁에 마주 앉아준 이가 고맙고 그립다. 그리고 문득 어느 날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궁금해진다.
오늘 구독자 님은 누구와 저녁을 먹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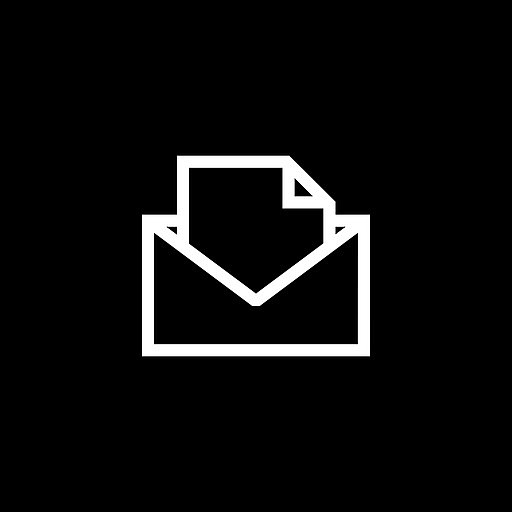
![[금요시음회] 호의 시와 음악과 회고와 < 휴가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207/1659181930996809.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