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님은 언제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시나요? 빨갛게 노랗게 물든 낙엽을 볼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찌뿌둥해 괜히 기지개를 한 번 더 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이것'을 볼 때면 겨울을 실감하는데요. 바로 '붕어빵'이에요.
빨간 천막 아래서 뭉게뭉게 솟아나는 붕어빵의 기름진 냄새를 맡으면 올해도 어김없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구독자 님과 주간영화가 함께 한지도 어느덧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올해 함께한 주간영화, 어떠셨나요?


세 번째 연출작 (현재 가제는 ‘어텀’이다)의 촬영이 어제 끝났다. 이번 작품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싶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촬영 전 준비 (다른 말로는 프리 프로덕션)를 어떻게 했는지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배우들의 연기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다. 대부분의 단편 영화들은 촬영 전 준비 단계를 테이블 리딩 한 번으로 마치고, 바로 촬영에 들어간다. 리딩장에서 오가는 디렉션도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등, 상당히 간단하다. 부족한 점은 촬영 때 디렉션을 또 주면서 맞춰 나간다.
하지만 열악한 내 현장에서는 연출자인 내가 촬영, 조명 등등을 혼자서 담당하느라 여유가 없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촬영을 들어가기 전 리허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연기를 잡은 뒤 본 촬영에선 촬영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촬영 전 한 달 동안 배우들과 정말 자주 만나서, 강남 쪽에 연습실을 네 시간씩 잡고 연습했다. 연기 연출을 논할 때 하나같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절대 감정에 대한 말을 하지 마라‘이다. 예를 들면 ‘이번엔 좀 더 화난 것처럼 가능할까요?’ ‘’조금 더 슬프게 가능할까요?‘ 이런 말들이다. 그러면 연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인 연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나중에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있다. 내 생각엔 감정의 정도가 아닌, 감정의 '방향'을 논하는 것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같은 씬이라 하더라도 연출자와 배우는 다른 톤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을 통일하는 것은 영화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연출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작품과 캐릭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캐릭터들의 과거 이야기, 캐릭터들이 원하는 것 등) 시나리오도 다듬어 가던 중, 촬영 이틀 전 ‘이 정도면 찍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카메라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카메라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야 단편 영화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인 '영화제'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제작비가 정말 많으면 상업 영화 카메라 (레드 또는 알렉사)도 쓸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항상 턱없이 부족한 저예산 단편에서는 꿈도 못 꾼다. 저예산 영화용으론 이미 시중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지만, 내가 추천하는 모델은 두 가지다. 바로 소니 A7S3, 그리고 파나소닉 GH6이다.
필자는 둘 중에서 개인적으로 파나소닉의 색감을 더 좋아한다. 10bit 촬영이 가능해서 색감이 정말 예쁘다. 대신 야간 촬영이 많다면 A7S3를 추천한다. 전에 모든 장면이 밤인 영화를 찍을 때 전 모델인 A7S2로 따로 조명을 치지 않고 촬영했는데도 꽤 만족스럽게 나왔다. 실제로 나름 메이저 할리우드 영화인 <The Possession of Hannah Grace>도 A7S2로 찍어서 꽤 화제가 됐다.
이렇게 상업 영화 현장과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지만, 단편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다음 이야기에는 준비 후 이틀간의 촬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영화와 게임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24살 너드.
취미로 가끔씩 영화도 만든다.
🍿 이번 주 볼거리

‘모든 예측이 무너질것’ 이번 주에 소개할 영화인 ‘캐빈인더 우즈’의 광고 카피다. 이 영화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한다.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하다. 다섯 명의 친구가 모인 한 별장에서 한 명, 한 명씩 죽어 나가는, 언뜻 보면 전형적인 슬래셔 영화 같지만 영화 오프닝부터 바로 낚시를 하고 (감독 인터뷰 왈 일부러 관객이 영화관을 잘못 들어왔나 착각하게 만들도록 연출했다고 하다.) 영화 중간중간 정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이야기를 비트는 매력이 넘치는 스릴러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세계관이 마음에 들었다. 호러 영화들의 다양한 클리셰를 가져와서 기발하게 바꾸고, 심지어 악인들의 행동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흥미로웠다.
또한 유명 호러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들도 주요 볼거리 중 하나다. <핼레이저>, <큐브>, <더 스트레인져스> 등 숱한 호러 영화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들을 독톡하게 활용한다. 한 씬에서는 유니콘을 활용해 인상 깊은 고어 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호러 영화를 많이 봐왔고, 이 장르를 좋아하면서도 신선한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다만 100% 호러보다는 호러 50, 블랙코미디 50의 영화임을 어느 정도 인지해 둬야 한다.

영화와 게임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24살 너드.
취미로 가끔씩 영화도 만든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피자헛에서는 생일을 맞은 손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고, 사실 그 축하송 보다는 선물로 함께 줬던 한 영화의 DVD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인터넷도, TV도 없던 그 옛날 우리 집에서는 영화 DVD를 빌려 노트북으로 온 가족이 영화를 보는 것이 일종의 가족 전통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어딘가 귀여우면서도 조금은 거친 금속의 재질이 느껴지는, 귀여움과 거부감이 혼재하는 캐릭터들의 외모다. 10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얼굴이 생생할 정도로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그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로봇이라는 제목에 맞게 영화에 등장하는 작은 설정 하나하나가 모두 디테일했다는 점이었다.
당연히 로봇은 임신을 할 수 없기에, 아기 로봇을 배송받아 키우는가 하면 탈것부터 도시의 풍경까지 블루스카이 스튜디오만의 기발한 상상력이 듬뿍 묻어 난다. 게다가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유치하거나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스토리까지. 블루스카이 스튜디오의 비운의 수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다.
주말 아침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서프라이즈>의 나레이션에 눈을 뜨곤 했던 한때의 여유로운 날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나에게는 추억 그 자체인 작품이기도하다. 이 영화를 만든 블루스카이 스튜디오는 아쉽게도 작년 문을 닫았다. 후속작인 <로봇2>를 다시는 볼 수 없겠지만, 혹시나 이 영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열린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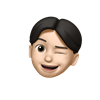
글로 이것저것 해보는 콘텐츠 에디터.
구독하는 OTT 서비스만 5개.
최근에 거금을 들여 닌텐도 스위치를 장만해
남 부럽지 않은 게임중독자의 삶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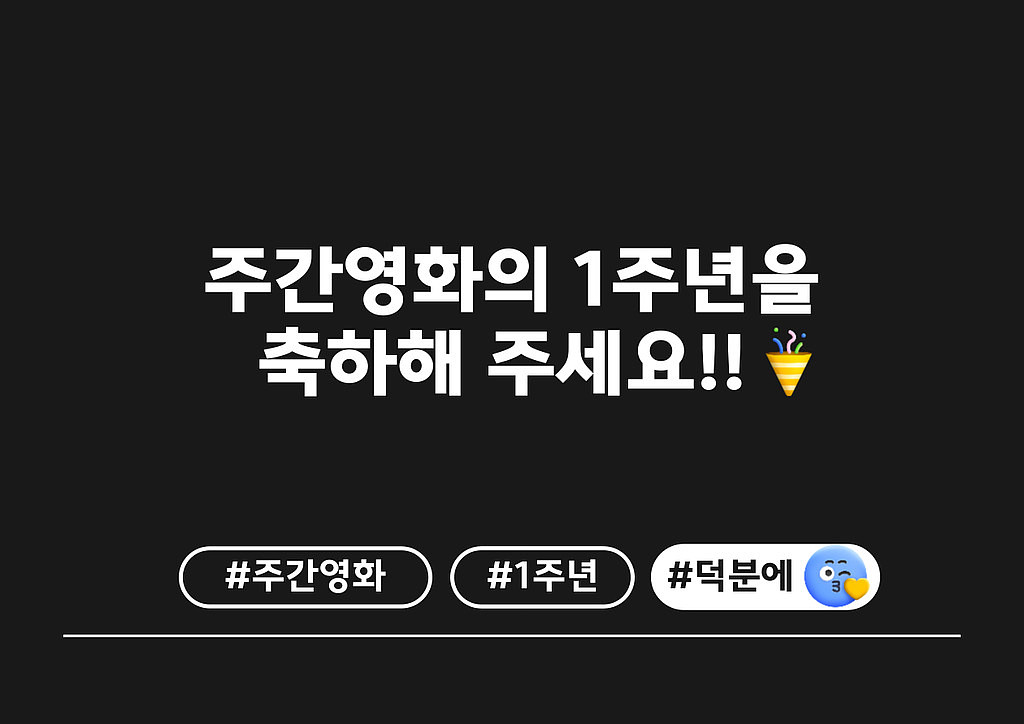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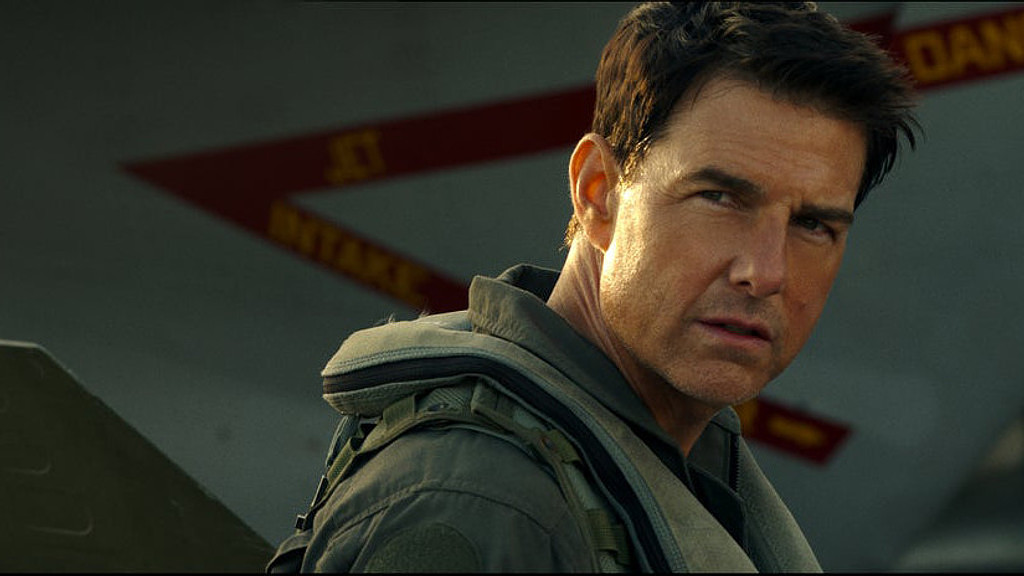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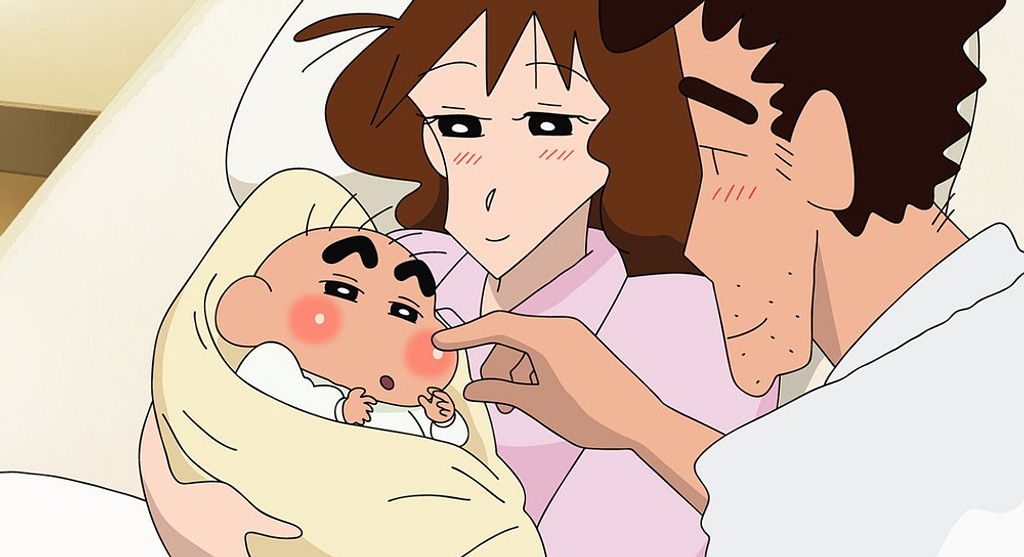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